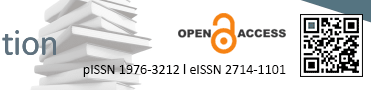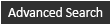|
 |
- Search
| Korean J General Edu > Volume 16(3); 2022 > Article |
|
Abstract
Abstract
Notes
1) 여기서 음악은 청소년기와 20대에 두 번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기에는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20대에는 음악에 관한 수학적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고중세의 음악 학습은 오늘날과 같은 연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음정에 대응하는 수의 비율을 다루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2) 바로의 9개 과목 중에서 의학은 교양교육이 아닌 전문직교육의 대상이 되었고, 건축은 아트가 자유학예와 기계적 학예(mechanical arts)로 분화되면서 자유학예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학예는 정신적인 활동을 강조했던 반면, 기계적 학예는 반복적인 숙달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3) 카롤링거 르네상스가 과연 르네상스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카롤링거 왕조의 르네상스란 수적으로 극히 제한된 일부 엘리트계층만을 위한 르네상스로 교회와 손잡은 카롤링거 군주제에 행정가들과 정치가들을 위한 작은 묘판을 제공하는 구실밖에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자크 르 고프, 1999: 38-39).
4) 중세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대해서는 Gimpel(1976); 자크 르 고프(2008)를 참조.
5)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의 수용에 대해서는 박승찬(2001)을 참조. 이와 관련하여 이정우는 ‘아리스토텔레스 혁명’이란 개념을 사용하면서 “12세기에 이루어진 방대한 번역 사업은 서구 학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성(巨星)을 등장시켰고, 이 변화는 엄청난 지적 지진을 일으켰다.”고 평가한 바 있다(이정우, 2011: 711).
6) <철학의 여왕과 자유칠과>의 주요 내용에 관한 해설은 Tidbury(2020)를, 교육적 의미에 대한 분석은 한수영(2020a)을 참조. <철학의 여왕과 자유칠과>에서는 윤리학, 논리학, 자연학이 철학으로, 문법, 수사, 변증법, 음악, 산수, 기하, 천문학이 자유칠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유칠과의 범위가 시공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7) 볼로냐 대학, 파리 대학, 옥스퍼드 대학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이광주(1997: 63-166); 이석우(1998: 99-257)를 참조.
8) ‘faculty of arts’는 교양학부, 인문학부, 문학부, 철학부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자유학예의 전통을 감안하여 ‘학예학부’로 표기했다. 또한 신학부, 법학부, 의학부를 포괄하는 ‘higher faculties’는 전공학부, 전문학부, 고급학부 등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higher의 사전적 의미를 따라 ‘상위학부’란 역어를 선택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에 ≪대학이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요시미 순야(吉見俊哉)에 따르면, “19세기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법학부나 의학부, 신학부와 병존하는 또 하나의 학부에 붙여진 명칭은 학예학부에서 철학부(faculty of philosophy)로, 이어서 문학부(faculty of letters)와 이학부(faculty of science)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문학’이 아니라 ‘인문학(humanities)’이 대학의 학부 명칭으로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이다”(요시미 순야, 2014: 119). 학예학부, 철학부, 문학부, 인문학부 등의 용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9) 중세 대학의 네 학부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는 볼프강 베버(2020: 45-77); Ridder-Symoens ed.(1992: 307-441)를 참조.
10) 데이비드 린드버그(2005: 340)에 따르면, 학예학부에서 석사를 마친 사람이 상위학부의 학위를 받는 데는 의학 5-6년, 법학 7-8년, 신학 8-16년과 같은 “참으로 긴 세월의 인내”가 요구되었다.
11) 이러한 점은 데이비드 린드버그(2005: 341); 김영식(2009: 75-76)에도 언급되어 있다.
12) 이와 관련하여 1254년 파리 대학에서 학예학부의 학위를 위해 제시한 필수도서목록은 다음과 같다(Norton, 1909: 136-137). (1) 구(舊)논리학: 포르퓌리오스의 ≪이사고게≫, 아리스토델레스의 ≪범주론≫과 ≪해석론≫, 보에티우스의 ≪분할론≫과 ≪변증론≫, (2) 신(新)논리학: 아리스토델레스의 ≪분석론 전후편≫, ≪소피스트 논박≫, ≪토피카≫, (3) 도덕철학: 아리스토델레스의 ≪윤리학≫, (4) 자연철학: 아리스토델레스의 ≪자연학≫, ≪천체에 관하여≫, ≪기상학≫, ≪동물에 관하여≫, ≪영혼에 관하여≫, ≪생성과 소멸에 관하여≫, ≪감각과 감각대상에 관하여≫, ≪수면과 걷기에 관하여≫, ≪기억과 회상에 관하여≫, ≪삶과 죽음에 관하여≫, ≪식물에 관하여≫, (5) 형이상학: 아리스토델레스의 ≪형이상학≫, (6) 기타 도서: 길베르투스 포레타누스의 ≪6원리의 서≫, 도나투스의 ≪대문법≫, 프리시아누스의 ≪문법강요≫, 코스타 벤 루까의 ≪원인론≫, ≪원인론≫의 다른 번역서인 ≪정신과 영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