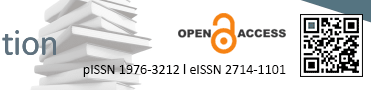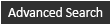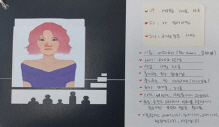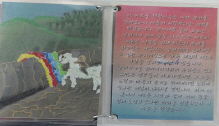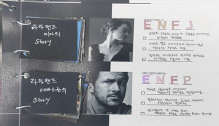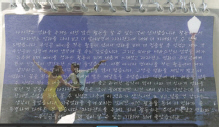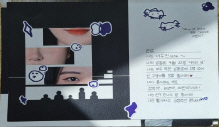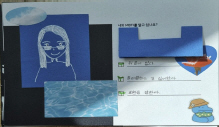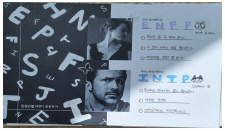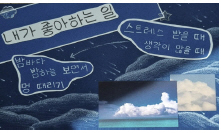|
 |
- Search
| Korean J General Edu > Volume 16(5); 2022 > Article |
|
Abstract
ļ│Ė ņŚ░ĻĄ¼ļŖö ļīĆĒĢÖņāØļōżņØś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ņśłņłĀ Ļ▓ĮĒŚśņØä ĒåĄĒĢ┤ ĻĄÉņ£ĪĒĢÖņĀü ņØśļ»ĖņÖĆ ņĀüņÜ®ņØä ņ£äĒĢ£ ņŗ£ņé¼ņĀÉņØä ņé┤ĒÄ┤ļ│┤ļŖö Ļ▓āņØä ļ¬®ņĀüņ£╝ļĪ£ ĒĢśņśĆļŗż. ņŚ░ĻĄ¼ ļīĆņāüņØĆ <ņ£ĀņĢä ņ░ĮņØśņä▒ ĻĄÉņ£Ī>ņØä ņłśĻ░ĢĒĢ£ 5ļ¬ģņØś ņŚ¼ĒĢÖņāØļōżņØ┤ļŗż. <ņ£ĀņĢä ņ░ĮņØśņä▒ ĻĄÉņ£Ī>ņØĆ ĒĢÖņāØļōżņØ┤ ļŗżņ¢æĒĢ£ ņé¼Ļ│Āļź╝ ĒĢśĻ│Ā, Ļ░äĒĢÖļ¼ĖņĀüņØĖ ĒĢÖļ¼ĖņØś ņ£ĄĒĢ®ņØä ĒåĄĒĢ┤ ņłśņŚģņØä ņØ┤ļüīņ¢┤Ļ░äļŗżļŖö ņĀÉņŚÉņä£ ĻĄÉņ¢æĻĄÉņ£ĪņØś ņØśļ»Ėļź╝ ņ¦Ćļŗīļŗż. ņŚ░ĻĄ¼ ļ░®ļ▓ĢņØĆ ļ®┤ļŗ┤Ļ│╝ Ēżņ╗żņŖż ĻĘĖļŻ╣ ņØĖĒä░ļĘ░ļź╝ ĒåĄĒĢ£ ņ¦łņĀü ņŚ░ĻĄ¼ļź╝ ņ¦äĒ¢ēĒĢśņśĆļŗż. ņŚ░ĻĄ¼ Ļ▓░Ļ│╝ ņ▓½ņ¦Ė, ĒĢÖņāØļōżņØś ļ¬©ļ”äĻ│╝ ņĢÄņØś Ļ│äņåŹņĀüņØĖ ņāüĒśĖņ×æņÜ®ņØ┤ ņØ╝ņ¢┤ļé¼ņ£╝ļ®░, ļæśņ¦Ė, ņØ┤ņä▒Ļ│╝ Ļ░Éņä▒ņØś ĒåĄĒĢ®ļÉ£ ņ¦ĆņŗØĻ│╝ ņāüļīĆņĀüņØĖ ņ¦ĆņŗØņØä ņĢīņĢäĻ░ĆļŖö ņ┤Øņ▓┤ņĀüņØĖ ņ¦ĆņŗØņØś ņŖĄļōØņØ┤ ņ׳ņŚłņ£╝ļ®░, ņģŗņ¦Ė, ņ×ÉĻĖ░ ņ×ÉņŗĀņŚÉ ļīĆĒĢ£ ņØ┤ĒĢ┤ļĀźņØ┤ Ē¢źņāüļÉśĻ│Ā ņ¦Ćņ¦Ćļź╝ ĒĢśĻ▓ī ļÉśņŚłņ£╝ļ®░, ļäĘņ¦Ė, ņéČņŚÉ ļīĆĒĢ£ ņØ┤ĒĢ┤ņÖĆ ņ░ĮņĪ░ņä▒ņØś ļ░£ĒśäņØ┤ ļéśĒāĆļé¼ļŗż.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ņØś ĻĄÉņ£ĪĒĢÖņĀü ņŗ£ņé¼ņĀÉņØĆ ĒĢÖņāØļōżņØ┤ ņ×ÉĻĖ░ ņ×ÉņŗĀņØś ņĀĢņ▓┤ņä▒ņØä ņ░ŠĻ│Ā ĒāĆņØĖĻ│╝ņØś ņØśņé¼ņåīĒåĄĻ│╝ Ēæ£ĒśäņØś ļ░®ļ▓ĢņØä ņØĄĒ×É ņłś ņ׳ņŚłļŗżļŖö Ļ▓āņØ┤ļŗż. ļśÉĒĢ£ ņØ╝ņāüņĀüņØĖ ņ░ĮņØśņä▒ņŚÉ ļīĆĒĢ┤ ņØ┤ĒĢ┤ĒĢśĻ│Ā ņ×ÉņŗĀņØś ļ░░ņøĆĻ│╝ ņéČņŚÉ ņĀüņÜ®ĒĢĀ ņłś ņ׳ļÅäļĪØ ļÅäņøĆņØä ņŻ╝ņŚłļŗżļŖöļŹ░ ņ׳ļŗż.
ļīĆĒĢÖņāØļōżņØä ļīĆņāüņ£╝ļĪ£ ĒĢ£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ņśłņłĀ Ļ▓ĮĒŚśņØĆ ĒśĢņŗØņĀüņØĖ ņłśņŚģņØś ņśüņŚŁņØä ļäśņ¢┤ ĒĢÖņāØļōżņØś ņłśņŚģņØś Ļ│╝ņĀĢņØä ļ░░ņøĆņØś ņśłņłĀļĪ£ ņŖ╣ĒÖöĒĢśņśĆļŗżļŖöļŹ░ ĻĘĖ ņØśņØśĻ░Ć ņ׳ļŗż. ņØ┤ļŖö ņŖżņŖżļĪ£ņØś ļ░░ņøĆņŚÉ ļīĆĒĢ£ ļæÉļĀżņøĆĻ│╝ ņ¢┤ļĀżņøĆņØä ĻĘ╣ļ│ĄĒĢśņśĆņ£╝ļ®░, ņóģĒĢ®ņĀüņØĖ ņé¼Ļ│Āļź╝ ĒĢĀ ņłś ņ׳ļŖö Ļ▓ĮĒŚśĻ│╝ Ļ░ĆļŖźņä▒ņØä ņ░ŠņĢśņ£╝ļ®░, ņ×ÉņŗĀņŚÉ ļīĆĒĢ£ ļČłņŗĀĻ│╝ ļČĆņĀĢņĀüņØĖ Ļ┤ĆņĀÉņ£╝ļĪ£ļČĆĒä░ņØś ļ│ĆĒÖöļź╝ Ļ░ĆņĀĖņÖöņ£╝ļ®░, ņ¦ĆņåŹņĀüņØĖ ņé¼Ļ│ĀņÖĆ ļģĖļĀźņØä ĒåĄĒĢ┤ ņ░ĮņØśņĀü ĒĢÖņŖĄņØ┤ Ļ░ĆļŖźĒĢśļÅäļĪØ ĒĢśņśĆļŗż. Ļ▓░Ļ│╝ņĀüņ£╝ļĪ£ ņŖżņŖżļĪ£ņØś ļé┤ļ®┤ņØś ļ│ĆĒÖöļź╝ ĒåĄĒĢ┤ ĻĄÉĻ│╝ņÖĆ ņéČĻ│╝ņØś ņŚ░Ļ▓░ ņåŹņŚÉņä£ ņ×ÉņŗĀņØä Ēæ£ĒśäĒĢśĻ│Ā ņŗ£Ļ░üĒÖöĒĢśļŖö ļ░®ļ▓ĢņØä Ēä░ļōØĒĢśĻ│Ā ņ׳ņŚłņØīņØä ņĢī ņłś ņ׳ļŗ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meaning and application through the art experience of ŌĆśself-expression visualizationŌĆÖ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five female students who took <Child Creativity Development>. <Child Creativity Development> has the meaning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at students think various ways and lead classes through the convergence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As for the research method,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and focus group interview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students continued to interact with both ignorance and knowledge, second, they acquired integrated knowledge regarding reason and sensibility. Third, they improved and supported themselves. Finally, they showed understanding and creativity in life. The educational implication of ŌĆśself-expression visualizationŌĆÖ is that students were able to find their own identity and learn how to communicate and express with others. It also helped students understand ordinary creativity and apply it to their learning and life.
The art experience of ŌĆśself-expression visualizationŌĆÖ for college students is meaningful in that students sublimated many things into the art of learning beyond the realm of formal instruction. They overcame their fear and difficulties in learning, found experiences and possibilities to think comprehensively, brought about positive changes concerning the distrustful and negative perspectives they held about themselves, and enabled creative learning through continuous thinking and effort. Thus, we can see that they were learning how to express and visualize themselves in regards to the connection between themselves as subjects and life itself through their inner changes.
ņÜ░ļ”¼ļŖö Ēæ£ĒśäņØś ņŗ£ļīĆļź╝ ņé┤ņĢäĻ░ĆĻ│Ā ņ׳ļŗż. ņÜ░ļ”¼ļŖö ņ×ÉĻĖ░ ņ×ÉņŗĀņØ┤ ņ¢┤ļ¢ĀĒĢ£ ņé¼ļ×īņØĖņ¦Ć, ņ¢┤ļ¢ĀĒĢ£ Ļ▓āņŚÉ Ļ┤Ćņŗ¼ņØ┤ ņ׳ļŖöņ¦Ć, ņ¢┤ļ¢ĀĒĢ£ Ļ▓āņØä ņŗżņ▓£ĒĢśĻ│Ā ņ׳ļŖöņ¦Ć ļō▒ņØä ĒāĆņØĖĻ│╝ ņäĖņāüņŚÉ Ēæ£ĒśäĒĢśļ®░ ņé┤ņĢäĻ░äļŗż. ļśÉĒĢ£ ņÜ░ļ”¼ļŖö ņ¢┤ļ¢ĀĒĢ£ ļ░®ņŗØņ£╝ļĪ£ ņÜ░ļ”¼ ņ×ÉņŗĀņØä Ēæ£ĒśäĒĢ┤ņĢ╝ ĒĢĀ Ļ▓āņØĖņ¦ĆņŚÉ ļīĆĒĢ┤ņä£ļÅä Ļ│Āļ»╝ĒĢ£ļŗż. ĻĘĖļĀćĻĖ░ ļĢīļ¼ĖņŚÉ ņÜ░ļ”¼ļŖö ņ×ÉĻĖ░ ņ×ÉņŗĀņŚÉ ļīĆĒĢ┤ ņĢīĻ│Ā ņØ┤ļź╝ Ēæ£ĒśäĒĢśĻĖ░ ņ£äĒĢ£ Ļ╣ŖņØĆ Ļ│Āļ»╝Ļ│╝ Ē¢ēļÅÖ, ļģĖļĀźņØä ņ¦ĆņåŹĒĢśĻ│Ā ņ׳ļŗż. ņÜ░ļ”¼ņØś ņ×ÉĻĖ░Ēæ£Ēśä ļ░®ņŗØņØĆ ņé¼ļ×īĻ│╝ ņé¼ļ×īņØ┤ ļ¦īļéśņä£ ņé¼ņÜ®ĒĢśļŖö ņ¢Ėņ¢┤, ĻĖĆņō░ĻĖ░ ļō▒ņØä ļäśņ¢┤ ļŗżņ¢æĒĢ£ ļ¦żņ▓┤ ņ”ē ņé¼ņ¦äņØ┤ļéś ņØ┤ļ»Ėņ¦Ć, ļÅÖņśüņāü ļō▒ņØä ĒåĄĒĢ┤ņä£ ļŗżņ¢æĒĢśĻ▓ī ņØ┤ļŻ©ņ¢┤ņ¦ĆĻ│Ā ņ׳ņ£╝ļ®░, ņØ┤ļ¤¼ĒĢ£ Ļ│╝ņĀĢņØä ŌĆśņ×ÉĻĖ░ ņ×ÉņŗĀņØś Ēæ£ĒśäņŚÉ ļīĆĒĢ£ ņŗ£Ļ░üĒÖöņØś Ļ│╝ņĀĢŌĆÖņØ┤ļØ╝Ļ│Ā ņ╣ŁĒĢ£ļŗż. ņØ┤ Ļ│╝ņĀĢņØĆ ņ×ÉĻĖ░ ņ×ÉņŗĀņØ┤ ņ¢┤ļ¢ĀĒĢ£ ņé¼ļ×īņØĖņ¦ĆņŚÉ ļīĆĒĢ£ ņĢäņØ┤ļööņ¢┤ļź╝ ļ©Ėļ”┐ņåŹņŚÉņä£ Ļ║╝ļé┤ņ¢┤ ņ×ÉņŗĀĻ│╝ ĒāĆņØĖņØ┤ ņØ┤ĒĢ┤ĒĢĀ ņłś ņ׳ļŖö ļ░®ņŗØņ£╝ļĪ£ ļéśĒāĆļé┤ļŖö Ļ▓āņØä ļ£╗ĒĢ£ļŗż. ŌĆśņ×ÉĻĖ░Ēæ£ĒśäņØś ņŗ£Ļ░üĒÖöŌĆÖļŖö Ļ▓░ĻĄŁ ņé¼ļ×īļōżĻ│╝ ņåīĒåĄņØś Ļ│╝ņĀĢņØ┤ļ®░, Ļ▓░ĻĄŁ ņä£ļĪ£ļź╝ ņĢīņĢäĻ░ĆļŖö ņżæņÜöĒĢ£ ļ░®ļ▓ĢņØ┤ļŗż. ņØ┤ļŖö ļéśņĢäĻ░Ć ļ¦łņØīĻ│╝ ļ¦łņØīņØś Ļ│ĄĻ░ÉĻ│╝ ņŚ░Ļ▓░ņØä ņØ┤ļŻ©ņ¢┤ņżä Ļ▓āņØ┤ļŗż.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ņØś Ļ│╝ņĀĢņØĆ Ļ│¦ ņśłņłĀ Ļ▓ĮĒŚśņØ┤ļŗż. ļ│Ė ņŚ░ĻĄ¼ņŚÉņä£ ņśłņłĀņØä ņĢäļ”äļŗżņøĆņØś Ēæ£Ēśä ļ░®ņŗØņ£╝ļĪ£ļ¦ī ļ£╗ĒĢśļŖö Ļ▓āņØĆ ņĢäļŗłļŗż. ļ│Ė ņŚ░ĻĄ¼ņŚÉņä£ņØś ņŗ£Ļ░üĒÖö Ļ│╝ņĀĢņØĆ ļ»ĖņĀüņØĖ Ēæ£ĒśäņØä ĒżĒĢ©ĒĢśņŚ¼ ĻĘĖ Ēæ£Ēśä ļ░®ņŗØņØ┤ ĒĢÖņāØĻ│╝ ĻĘĖļōżņØś ņ¦Ćņä▒ ĻĘĖļ”¼Ļ│Ā ņéČĻ│╝ ņŚ░Ļ┤Ćņä▒ ņåŹņŚÉņä£ ļéśĒāĆļéśļŖö ņĢäļ”äļŗżņøĆņØś Ēæ£ĒśäņØä ĒżĒĢ©ĒĢśļŖö ļäōņØĆ Ļ░£ļģÉņØ┤ļØ╝Ļ│Ā ņāØĻ░üĒĢĀ ņłś ņ׳ļŗż. ņØ╝ņāüņŚÉņä£ņØś Ļ▓ĮĒŚśņØä ĒżĒĢ©ĒĢśļŖö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ņØś Ļ│╝ņĀĢņØĆ Ļ░Éņä▒, ņĀĢņä£ņØś Ēæ£ĒśäņØä ĒåĄĒĢ┤(ņĄ£ņ¦ä, Ļ│ĮļŹĢņŻ╝, 2015: 121) Ļ╣ŖņØ┤ ņ׳ļŖö ļéśļź╝ ņĢīņĢäĻ░ł ņłś ņ׳ļÅäļĪØ ļÅäņÖĆņŻ╝ļ®░, ļéśņØś ļ¬©ņŖĄņØä ĒāĆņØĖĻ│╝ņØś ļ¦īļé©, ņØ┤ĒĢ┤ļź╝ ĒåĄĒĢ┤ ņä£ļĪ£ ļéśļłī ņłś ņ׳ļÅäļĪØ ĒĢ┤ ņżĆļŗż. ĒāĆņØĖĻ│╝ ņäĖņāüņØä ņĢīņĢäĻ░ĆļŖö Ļ│╝ņĀĢņØ┤ļØ╝ ĒĢĀ ņłś ņ׳ļŗż. ņØ┤ļŖö ņ¦äņĀĢĒĢ£ ņśłņłĀņØä ļ¦īļéśļŖö Ļ▓ĮĒŚśņØ┤ļØ╝ ĒĢĀ ņłś ņ׳ļŗż(ņĄ£ņ¦ä, Ļ│ĮļŹĢņŻ╝, 2015: 119). ļśÉĒĢ£ ļ│Ė ņŚ░ĻĄ¼ņŚÉņä£ņØś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Ļ│╝ņĀĢņØĆ Ļ▓░Ļ│╝ļ¼╝ņØś ņÖäņä▒ņŚÉļ¦ī ņ¦æņżæĒĢśļŖö ĒśĢņŗØņĀüņØĖ ĻĄÉņ£Īņ£╝ļĪ£ņä£Ļ░Ć ņĢäļŗłļØ╝, ĻĘĖļ¤¼ĒĢ£ ņśłņłĀņØä Ļ░ÉņāüĒĢśĻ│Ā, ņä£ļĪ£ ĻĘĖ ņśłņłĀ ņ×æĒÆłņŚÉ ļīĆĒĢ┤ņä£ ļīĆĒÖöĒĢśļŖö Ļ│╝ņĀĢņŚÉņä£ ņĀäļŗ¼ļÉśļŖö ņĢäļ”äļŗżņøĆņØä ĒżĒĢ©ĒĢ£ Ļ░£ļģÉņØ┤ļŗż. ļ░ĢņŻ╝Ēؼ(2016: 152) ļśÉĒĢ£ ņØ┤ļ¤¼ĒĢ£ ņśłņłĀĻĄÉņ£ĪņØä ĻĄÉĻ│╝ Ļ│╝ļ¬®ņ£╝ļĪ£ļ¦ī ņĪ┤ņ×¼ĒĢśļŖö ĻĄÉņ£ĪņØ┤ ņĢäļŗłļØ╝, ņśłņłĀ Ļ░Éņāü, ņ░ĮņĪ░ņØś Ēæ£ĒśäņØä ļ¬©ļæÉ ĒżĻ┤äĒĢśļŖö Ļ▓āņØ┤ļØ╝Ļ│Ā ĒĢśņśĆļŗż. ņśłņłĀņØ┤ ņśłņłĀ ņ×Éņ▓┤ļĪ£ļ¦ī ņĪ┤ņ×¼ĒĢśļŖö Ļ▓āņØ┤ ņĢäļŗłļØ╝, Ļ░ÉņāüĒĢśĻ│Ā ĻĘĖļź╝ ĒåĄĒĢ┤ ļŹö ļäōņØĆ ņ░ĮņĪ░ņØś ĻĖĖļĪ£ ļéśņĢäĻ░ĆļŖö Ļ▓āņØä ĒżĒĢ©ĒĢśņŚ¼ ļ│┤ļŗż ļéśņØĆ ņäĖĻ│äļź╝ ņÖäņä▒ĒĢ┤ ļéśĻ░ĆļŖö Ļ▓āņØ┤ļŗż.
ņØ┤ļĀćļō» ņśłņłĀ Ļ▓ĮĒŚśņØĆ Ļ▓░Ļ│╝ņĀüņ£╝ļĪ£ ņ░ĮņĪ░(ÕēĄķĆĀ)ļĪ£ņä£ņØś ņ┤Øņ▓┤ņĀüņØĖ Ļ▓ĮĒŚśņ£╝ļĪ£ ĻĘĖ ņØśļ»Ėļź╝ ņĀäļŗ¼ĒĢ£ļŗż. ņ░ĮņĪ░ļĪ£ņä£ņØś ņśłņłĀņØĆ ĻĄÉņ£ĪņĀüņ£╝ļĪ£ Ēü░ ņØśļ»Ėļź╝ Ļ░Ćņ¦äļŗż. ĻĄÉņ£ĪņŚÉņä£ ņ░ĮņØś(ÕēĄµäÅ), ņ░ĮņĪ░(ÕēĄķĆĀ)ļØ╝ļŖö ņØśļ»ĖļŖö ņ¦äņĀĢĒĢ£ ņ×ÉĻĖ░ ņ×ÉņŗĀņØ┤ ļÉśĻĖ░ ņ£äĒĢ┤ ļģĖļĀźĒĢśļŖö ņēĮņ¦Ć ņĢŖņØĆ Ļ│╝ņĀĢņØ┤ļŗż. ļ░Ģņ¦äĒؼ ņÖĖ(2022: 1657-1660)ļŖö RogersĻ░Ć ņ¦äņĀĢĒĢ£ ņ×ÉņŗĀņØś ļ¬©ņŖĄņØ┤ ļÉśņ¢┤Ļ░ĆļŖö Ļ│╝ņĀĢņŚÉņä£ ņ░ĮņØśņĀüņØĖ ņé░ļ¼╝ņØä ļ¦īļōżņ¢┤ ļé╝ ņłś ņ׳ļŗżĻ│Ā Ē¢łņØīņØä ļ░ØĒśöļŗż. RogersļŖö ņØ┤ ņ░ĮņĪ░ņØś Ļ│╝ņĀĢņØĆ ļ░░ņøĆņØä ņŻ╝ļÅäĒĢśļŖö ņŻ╝ņ▓┤ņ×ÉļōżņØś ņ×ÉņŗĀņŚÉ ļīĆĒĢ£ ņłśņÜ®, ĒāĆņØĖņŚÉ ļīĆĒĢ£ ņØ┤ĒĢ┤, ļüŖņ×äņŚåļŖö ļģĖļĀźĻ│╝ ņä▒ņןņŚÉ ņØśĒĢ┤ņä£ ļ¦īļōżņ¢┤ņ¦äļŗżĻ│Ā ĒĢśņśĆļŹś Ļ▓āņØ┤ļŗż. ņĄ£Ēś£ņ¦ä(2016: 46)ļÅä ņØ┤ņÖĆ Ļ░ÖņØĆ ņśłņłĀ Ļ▓ĮĒŚśņŚÉ ņØśĒĢ£ ĻĄÉņ£ĪņŚÉ ņ¦Ćņ¦Ćļź╝ Ēæ£ĒĢśņśĆļŗż. 21ņäĖĻĖ░ Ēśüļ¬ģņØĆ Ļ░ÉĻ░üĻ│╝ ņØ┤ļ»Ėņ¦ĆĻ░Ć ņżæņÜöĒĢ£ ņŗ£ļīĆņØ┤ĻĖ░ ļĢīļ¼ĖņŚÉ ļīĆĒĢÖņŚÉņä£ļÅä ņśłņłĀĻ│╝ Ļ░Éņä▒, ņØĖļ¼ĖĒĢÖ, ņØĖĻ░äļŗżņøĆ(ņĄ£Ēś£ņ¦ä, 2016: 46)ņØä ĻĖ░ļź╝ ņłś ņ׳ļŖö ĻĄÉņ£ĪņØ┤ ņØ┤ļŻ©ņ¢┤ņĀĖņĢ╝ĒĢ£ļŗżĻ│Ā ĒĢśņśĆļŗż. ņ”ē ņśłņłĀ Ļ▓ĮĒŚśĻ│╝ ĒĢÖņāØļōżņØś ļ░░ņøĆņØś ņŚ░Ļ┤Ćņä▒ņŚÉ ļīĆĒĢ┤ ņ¢ĖĻĖēĒĢ£ Ļ▓āņØ┤ļŗż.
ļö░ļØ╝ņä£ ĻĄÉņ£ĪņŚÉņä£ņØś ņśłņłĀ Ļ▓ĮĒŚśņØĆ ņ×ÉņŗĀĻ│╝ ĒāĆņØĖņØś ņåīĒåĄ Ļ│╝ņĀĢņØ┤ļ®░, ņ░ĮņØśņä▒ņØś Ēæ£ĒśäĻ│╝ņĀĢņ£╝ļĪ£ņä£ ņØ┤ĒĢ┤ĒĢĀ ņłś ņ׳ĻĖ░ņŚÉ ņØĖĻ░äņØś Ļ│Āņ£Āņä▒ņØä ļ░£ĒśäĒĢśļŖö ļ░░ņøĆņØś Ļ│╝ņĀĢņØ┤ļØ╝ ĒĢĀ ņłś ņ׳ļŗż. ĻĘĖļĀćĻĖ░ ļĢīļ¼ĖņŚÉ ņÜ░ļ”¼ļŖö ĻĄÉņ£ĪņŚÉņä£ņØś ņśłņłĀ Ļ▓ĮĒŚśņŚÉ ņŻ╝ļ¬®ĒĢśļ®░, ĻĘĖ ņżæņÜöņä▒ņŚÉ ļīĆĒĢ┤ņä£ ļŗżņŗ£ ĒĢ£ļ▓ł ņāØĻ░üĒĢ┤ ļ│┤ņĢäņĢ╝ ĒĢĀ ĒĢäņÜöņä▒ņØä Ļ░Ćņ¦äļŗż. ĒĢśņ¦Ćļ¦ī ļīĆĒĢÖņØś ĻĄÉņ£ĪĻ│╝ņĀĢņŚÉņä£ ņ¦äņĀĢĒĢ£ ņśłņłĀ Ļ▓ĮĒŚśņØä ĒĢśļŖö Ļ▓āņØĆ ņēĮņ¦Ć ņĢŖļŗż. ņżæļō▒ĻĄÉņ£ĪņŚÉņä£ļÅä ņśłņłĀņØ┤ļØ╝ļŖö Ļ▓āņØĆ ņØīņĢģ, ļ»ĖņłĀ, ņŚ░ĻĘ╣, ļ¼┤ņÜ® ļō▒ņØś ĻĄÉĻ│╝ļź╝ ļ░░ņÜ░ļŖö Ļ▓āņŚÉ ĻĄŁĒĢ£ņŗ£ĒéżĻ│Ā(ņØ┤ņóģņøÉ, ņØ┤Ļ▓Įņ¦ä, 2016: 151), ņä▒ņĀü ņé░ņČ£ņØä ņ£äĒĢ┤ ņØ┤ļŻ©ņ¢┤ņ¦ä Ļ▓ĮņÜ░Ļ░Ć ļ¦ÄņĢä(ļ░ĢņŻ╝Ēؼ, 2016: 150) ņ¦äņĀĢņ£╝ļĪ£ ņ”ÉĻĖĖ ņłś ņŚåļŗż. ļśÉĒĢ£ ļīĆĒĢÖņŚÉņä£ļÅä ņśłņłĀ Ļ▓ĮĒŚśļ│┤ļŗżļŖö ņĀäĻ│ĄņŚÉ ņżæņŗ¼ņØä ļæÉĻ│Ā ņ¦ĆņŗØ ĻĄÉņ£ĪĻ│╝ ņĘ©ņŚģ ĻĄÉņ£ĪņŚÉ ņ┤łņĀÉņØä ļ¦×ņČöņ¢┤ ņłśņŚģņØ┤ ņ¦äĒ¢ēļÉśĻ│Ā ņ׳ļŗż.
ņØ┤ņ▓śļ¤╝ ņśłņłĀ Ļ▓ĮĒŚśņØś ņןņĀÉņŚÉļÅä ļČłĻĄ¼ĒĢśĻ│Ā ļīĆĒĢÖ ĻĄÉņ£ĪĻ│╝ņĀĢņØĆ ņŚ¼ņĀäĒ׳ Ļ│╝Ļ▒░ņØś ņé¼Ļ│ĀņÖĆ ļ│äļ░ś ļŗżļź┤ņ¦Ć ņĢŖļŗż. ļśÉĒĢ£ ņÜ░ļ”¼ ļéśļØ╝ņØś ņśłņłĀĻĄÉņ£ĪņØś ĒśäņŗżņŚÉ ļö░ļØ╝ ņśłņłĀ Ļ▓ĮĒŚśĻ│╝ Ļ┤ĆļĀ©ļÉ£ ņŚ░ĻĄ¼(Ļ╣ĆņŚ░Ēؼ, 2008; ļ░ĢņŻ╝Ēؼ, 2016; Ļ╣ĆņĀĢĒؼ, 2020; ņĀĢņśźĒؼ, 2019)ļōżņØĆ ļīĆņ▓┤ļĪ£ ņśłņłĀ Ļ▓ĮĒŚśĻ│╝ ņśłņłĀĻĄÉņ£ĪņØś Ļ░Ćņ╣śļź╝ ņØĖļ¼ĖĒĢÖņĀü, ĻĄÉņ£ĪņĀü, ņśłņłĀĻĄÉņ£ĪņĀü Ļ░Ćņ╣śļź╝ ĒāÉņāēĒĢśņśĆļŗżļŖöļŹ░ ĻĘĖ ņØśņØśĻ░Ć ņ׳ļŗż. ļööņ×ÉņØĖ ņöĮĒé╣ņØ┤ļéś ĻĄÉņ£ĪņŚÉņä£ņØś ņ░ĮņØśņĀüņØĖ Ļ▓ĮĒŚśĻ│╝ Ļ┤ĆļĀ©ļÉ£ ņäĀĒ¢ēņŚ░ĻĄ¼(ņÜ░ņśüņ¦ä, ņØ┤ņ×¼ĒśĖ, 2018; ļéśĻ▒┤, ņĀäņłśņĀĢ, 2015; ņĀĢņłśņŚ░, ņĀĢļÅäņä▒, 2014; ļéśĻ▒┤, ļ░ĢņżĆĒÖŹ, 2013)ļŖö ļööņ×ÉņØĖ ĻĄÉņ£ĪņŚÉ ņ׳ņ¢┤ņä£ņØś ņĢäņØ┤ļööņ¢┤ļź╝ ļ░£ņāüĻ│╝ Ēæ£Ēśä, ņĀłņ░©ņŚÉ Ļ┤Ćņŗ¼ņØä Ļ░Ćņ¦ĆĻ│Ā ņØ┤ņŚÉ ļīĆĒĢ£ ļ░®ļ▓ĢļōżņØä ļČäņäØĒĢśĻ│Ā, ļ╣äĻĄÉĒĢśļ®░ ņ¢┤ļ¢ĀĒĢ£ ņŗ£ņé¼ņĀÉņØ┤ ņ׳ļŖöņ¦Ć ļ░ØĒśöļŗżļŖöļŹ░ ņØśņØśļź╝ Ļ░Ćņ¦äļŗż. ļśÉĒĢ£ ņØ┤ļ¤¼ĒĢ£ ĻĄÉņ£ĪņØä ņ£äĒĢ£ ĒöäļĪ£ĻĘĖļשņØś Ļ░£ļ░£Ļ│╝ Ļ┤ĆļĀ©ļÉ£ ļģ╝ļ¼ĖļÅä ņĪ┤ņ×¼ĒĢ£ļŗż. ĒĢśņ¦Ćļ¦ī ņØ┤ļ¤¼ĒĢ£ ņŚ░ĻĄ¼ļōżņØĆ ĒśäļīĆņØś Ēæ£ĒśäņØś ņÜĢĻĄ¼ļź╝ Ļ░Ćņ¦ä ĒśäņŗżņØä ņŗżņĀ£ ĻĄÉņ£Ī ĒśäņŗżņŚÉņä£ ņĀüņÜ®ĒĢśņŚ¼ ĒĢÖņāØņØ┤ ņ×ÉĻĖ░ ņ×ÉņŗĀņØä Ēæ£ĒśäĒĢśļŖö ņŗ£Ļ░üĒÖöņØś ņśłņłĀ Ļ▓ĮĒŚśņØ┤ ņ¢┤ļ¢ĀĒĢśņśĆļŖöņ¦Ć ĻĘĖ ņØśļ»Ėļź╝ Ļ╣ŖņØ┤ ņ׳Ļ▓ī ņé┤ĒÄ┤ļ│┤ņ¦Ć ļ¬╗Ē¢łļŗżļŖö ĒĢ£Ļ│äņĀÉņØä Ļ░Ćņ¦äļŗż. ņØ╝ņāüņāØĒÖ£ņØś ņśłņłĀ Ļ▓ĮĒŚśņ£╝ļĪ£ņŹ©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ņśłņłĀ Ļ▓ĮĒŚśņØĆ ĒĢÖņāØļōżņŚÉĻ▓ī ņ¢┤ļ¢ĀĒĢ£ ļ│ĆĒÖöĻ░Ć ļ░£ņāØņŗ£ņ╝░ļŖöņ¦Ć, ņØ╝ņāüņØś ņØśļ»ĖļōżņØä ņ¢┤ļ¢╗Ļ▓ī ļ░øņĢäļōżņØ┤ļŖöņ¦Ćļź╝ ņāØĻ░üĒĢśļÅäļĪØ ĒĢśļŖöļŹ░ ĻĘĖ ņżæņÜöņä▒ņØ┤ ņ׳ņ£╝ļ®░, ņØ┤ļź╝ ĒåĄĒĢ┤ ļŹö Ļ╣ŖņØ┤ ņ׳ļŖö ĒöäļĪ£ĻĘĖļשņØä Ļ░£ļ░£ĒĢśĻ▒░ļéś ņØśļ»Ėļź╝ ņ░ĮņČ£ĒĢĀ ņłś ņ׳ļŗż.
ņØ┤ņ▓śļ¤╝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ņśłņłĀ Ļ▓ĮĒŚśņØä ĒåĄĒĢ┤ ĒĢÖņāØņØ┤ ļŖÉļéĆ ņŗżņĀ£ Ļ▓ĮĒŚśņŚÉ ļīĆĒĢ£ ņØśļ»Ėļź╝ ņ░ŠĻ│Ā ņØ┤ ļ░®ļ▓ĢņØś ĻĄÉņ£ĪĒĢÖņĀü Ļ░ĆļŖźņä▒ņØä ņ░ŠņĢä ĒĢÖņāØļōżņØ┤ ņ×ÉņŗĀņØä ļ│┤ļŗż ņל Ēæ£ĒśäĒĢśĻ│Ā, Ēæ£ĒśäĒĢśļŖö ļ░®ņŗØņØä ĒåĄĒĢ┤ ņåīĒåĄĒĢĀ ņłś ņ׳ļÅäļĪØ ĒĢśļŖö Ļ▓āņØĆ ļ¦żņÜ░ ņżæņÜöĒĢśļŗż. ĒŖ╣Ē׳, ļīĆĒĢÖņØś ĻĄÉņ¢æĻĄÉņ£Ī ņłśņŚģņØĆ ļīĆĒĢÖņāØļōżņØś ņóģĒĢ®ņĀüņØĖ ņé¼Ļ│Ā ļ░Å ņØ┤ĒĢ┤ Ļ│╝ņĀĢņØä ņżæņÜöĒĢśĻ▓ī ņāØĻ░üĒĢśĻ│Ā ņ׳ņ£╝ļ®░, ņéČĻ│╝ņØś ņŚ░Ļ▓░ņØä ĒåĄĒĢ┤ ļ│┤ļŗż Ļ╣ŖņØ┤ ņ׳ļŖö ņØśļ»ĖņØś ņ░ĮņČ£ņØä ņżæņÜöĒĢśĻ▓ī ņāØĻ░üĒĢśĻ│Ā ņ׳ĻĖ░ņŚÉ ĻĘĖ ņŗ£ņé¼ņĀÉņØä ņżä ņłś ņ׳ņØä Ļ▓āņØ┤ļØ╝ ņāØĻ░üĒĢ£ļŗż. ļö░ļØ╝ņä£ ļ│Ė ņŚ░ĻĄ¼ļŖö ņśłņłĀ Ļ▓ĮĒŚśņ£╝ļĪ£ņä£ņØś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ņØś Ļ│╝ņĀĢņØä ņé┤ĒÄ┤ļ│┤Ļ│Ā ĻĘĖ ņØśļ»Ė ļ░Å ĻĄÉņ£ĪĒĢÖņĀü Ļ░ĆļŖźņä▒ņØä ņ░ŠņĢäļ│┤ļŖö Ļ▓āņØä ļ¬®ņĀüņ£╝ļĪ£ ĒĢ£ļŗż. ņŚ░ĻĄ¼ ļ¼ĖņĀ£ļŖö ļŗżņØīĻ│╝ Ļ░Öļŗż.
ņŚ░ĻĄ¼ļīĆņāüņ×ÉļŖö ļČĆņé░ņ¦ĆņŚŁņØś T ļīĆĒĢÖĻĄÉņØś <ņ£ĀņĢä ņ░ĮņØśņä▒ ĻĄÉņ£Ī> ņłśņŚģņØä ņłśĻ░ĢĒĢ£ ĒĢÖņāØ 16ļ¬ģ ņżæ 5ļ¬ģņØ┤ļŗż. ņØĖĒä░ļĘ░ļŖö ņłśņŚģņØä ņłśĻ░ĢĒĢ£ ļ¬©ļōĀ ĒĢÖņāØļōżņŚÉĻ▓ī ņÜöņ▓ŁņØä ĒĢśņśĆļŗż. ņłśņŚģņŚÉņä£ņØś ĒÖ£ļÅÖņ¦Ć ņ”ē, ņŗ£Ļ░üĒÖö ĒÖ£ļÅÖņØä ņä▒ņŗżĒĢśĻ▓ī ņŗżĒ¢ēĒĢ£ ĒĢÖņāØļōż ļ░Å ļ¬©ļōĀ ĒĢÖņāØļōżņŚÉĻ▓ī ĻĖ░ļ│ĖņĀüņ£╝ļĪ£ ņØĖĒä░ļĘ░ņŚÉ ļīĆĒĢ£ ņØśņé¼ļź╝ ļ¼╝ņ¢┤ļ│┤ņĢśĻ│Ā ĻĘĖ ņżæ ņØĖĒä░ļĘ░ņŚÉ ņØæĒĢ┤ ņżĆ ĒĢÖņāØļōżņØä ļīĆņāüņ£╝ļĪ£ ļ®┤ļŗ┤Ļ│╝ FGIļź╝ ņŗ£ņ×æĒĢśņśĆ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2021ļģä 2ĒĢÖĻĖ░ņØś ņłśņŚģņŚÉņä£ ņŗ£ņ▓ŁĒĢ£ ņśüĒÖö <ļØ╝ļØ╝ļ×£ļō£>ļĪ£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Ļ│╝ņĀĢņØä Ļ▒░ņ│żĻ│Ā, ņŚ░ĻĄ¼ņ×ÉļōżņØĆ ņŗ£Ļ░üĒÖöņ¦Ćļź╝ Ļ░£ļ░£ĒĢśņśĆļŗż. 2021ļģä 2ĒĢÖĻĖ░ ņłśņŚģņØĆ ĻĖ░ļ│ĖņĀüņ£╝ļĪ£ ņĮöļĪ£ļéś19ļĪ£ ņØĖĒĢ┤ ļ╣äļīĆļ®┤ ņłśņŚģņØä ĒĢśņśĆņ£╝ļéś, ĒĢÖĻĖ░ ņżæ ļīĆļ®┤ ņłśņŚģņ£╝ļĪ£ ņĀäĒÖśļÉśļ®┤ņä£ ņŗ£Ļ░üĒÖöņ¦Ć ĒÖ£ļÅÖņØ┤ Ļ░ĆļŖźĒĢśĻ▓ī ļÉśņŚłļŗż.
<ņ£ĀņĢä ņ░ĮņØśņä▒ ĻĄÉņ£Ī> ņłśņŚģņØĆ Ļ░äĒĢÖļ¼ĖņĀü(interdisciplinary) ņ£ĄĒĢ®ņØä ĒåĄĒĢ┤ ļŗżņ¢æĒĢ£ ņśüĒÖöļź╝ ĒĢ┤ņäØĒĢśļŖö Ļ▓āņ£╝ļĪ£ ņ¦äĒ¢ēļÉśĻ│Ā ņ׳ņ£╝ļ®░, Ļ░äĒĢÖļ¼ĖņĀü ņ£ĄĒĢ®ņØĆ ņśüĒÖö ņåŹņŚÉņä£ ņ░ŠņØä ņłś ņ׳ļŖö Ļ░£ļģÉĻ│╝ ļ¼ĖĒÖöņśłņłĀ ĒÖ£ļÅÖņØś ņ£ĄĒĢ®ņØä ĒåĄĒĢ┤ ņØ┤ļŻ©ņ¢┤ņ¦ł ņłś ņ׳ļÅäļĪØ ĒĢśĻ│Ā ņ׳ļŗż. ļ│Ė ņŚ░ĻĄ¼ņØś ņśüĒÖö <ļØ╝ļØ╝ļ×£ļō£>ņŚÉņä£ļŖö Ļ┐łĻ│╝ ņé¼ļ×æņØä ņŻ╝ņĀ£ļĪ£ ņØ┤ļź╝ ņŗ¼ļ”¼ĒĢÖņØ┤ļéś ņ▓ĀĒĢÖņĀüņØĖ ĒĢÖļ¼ĖņØä ĒåĄĒĢ┤ ņäżļ¬ģĒĢśĻ│Ā ĒĢÖņāØļōżņØĆ ļŗżņ¢æĒĢ£ ļ¼ĖĒÖöņśłņłĀ ĒÖ£ļÅÖĻ│╝ņØś ņ£ĄĒĢ®ņØä ņØ┤ļŻ░ ņłś ņ׳Ļ▓ī ļÉ£ļŗż. ļö░ļØ╝ņä£ <ņ£ĀņĢä ņ░ĮņØśņä▒ ĻĄÉņ£Ī>ņØĆ ņĀäĻ│Ą ņłśņŚģņØ┤ĻĖ┤ ĒĢśņ¦Ćļ¦ī ņśüĒÖöļź╝ ņäĀņĀĢĒĢśņŚ¼ ĒĢÖņāØļōżņØś ņ░ĮņØśņä▒Ļ│╝ ņé¼Ļ│ĀļĀźņØä ĒéżņÜ░ļ®░ ļŗżņ¢æĒĢ£ Ļ▓ĮĒŚśņØä ĒĢĀ ņłś ņ׳ļÅäļĪØ ĒĢśļŖöļŹ░ ņ׳ņ¢┤ņä£ Ēü░ ņØśļ»ĖņŚÉņä£ ĻĄÉņ¢æĻĄÉņ£ĪņØś ļ¬®Ēæ£ņÖĆ Ēü¼Ļ▓ī ļŗ«ņĢä ņ׳ļŗżĻ│Ā ĒĢĀ ņłś ņ׳ļŗż.
<ņ£ĀņĢä ņ░ĮņØśņä▒ ĻĄÉņ£Ī> ņłśņŚģņŚÉņä£ ņśüĒÖö <ļØ╝ļØ╝ļ×£ļō£> ĒÖ£ļÅÖņØś ņŻ╝ļ¬®ņĀüņØĆ ņČöņāüņĀüņØĖ ņ×ÉņĢäņĀĢņ▓┤Ļ░ÉņØä ĒÖĢļ”ĮĒĢśĻĖ░ ņ£äĒĢ£ ĻĄ¼ņ▓┤ņĀüņØĖ ĒāÉņāēņØä ĒåĄĒĢ┤ ņ×ÉņĢäļź╝ ņØ┤ĒĢ┤ĒĢśĻ│Āņ×É ĒĢśļŖö Ļ▓āņØ┤ļŗż. ņŗ¼ļ”¼ĒĢÖņ×É EricksonņØś ņ×ÉņĢäļØ╝ļŖö Ļ▓āņØĆ ņŗĀņ▓┤, ņä▒Ļ▓®, Ļ░Ćņ╣śĻ┤Ć, ņé¼ĒÜīņĀü ņŗĀļČä ļ░Å ņŚŁĒĢĀ ļō▒ņØä ĒżĒĢ©ĒĢśņŚ¼ ļé┤Ļ░Ć ļłäĻĄ¼ņØĖņ¦Ć Ļ╣©ļŗ¼ņĢäļéśĻ░ĆļŖö Ļ▓āņØä ĒåĄĒĢ┤ ņŻ╝Ļ┤ĆņĀüņØĖ ļŖÉļéīņØä ņäżļ¬ģĒĢ£ļŗż. ņ×ÉņĢäņĀĢņ▓┤Ļ░ÉņØĆ ņØ┤ļ¤¼ĒĢ£ ņ×ÉņĢä Ļ░£ļģÉņØ┤ ņāłļĪ£ņÜ┤ ņāüĒÖ®ņŚÉ ņ¦üļ®┤ĒĢśĻ▓ī ļÉśļ®┤ņä£ ņ×ÉĻĖ░ ņ×ÉņŗĀņŚÉ ļīĆĒĢ£ ņé¼ņ£ĀņØś Ļ│╝ņĀĢņØ┤ Ēü░ ļ│ĆĒÖöļź╝ Ļ░Ćņ¦ĆļŖö ņŗ£ĻĖ░ļØ╝ ĒĢĀ ņłś ņ׳ļŗż(ņØ┤Ēśäļ”╝ ņÖĖ, 2015: 137-139). ļö░ļØ╝ņä£ ņ×ÉņĢäņĀĢņ▓┤Ļ░ÉņØĆ ņ▓ŁņåīļģäĻĖ░ņØś Ļ│╝ņŚģ ņ”ē, ņ×ÉņŗĀņŚÉ ļīĆĒĢ£ ņś¼ļ░öļźĖ ņØ┤ĒĢ┤ ļ░Å ņ£ĀļŖźĻ░ÉņØä ņĢīņĢäĻ░ĆļŖö Ļ▓āņØĆ ņĢ×ņ£╝ļĪ£ņØś ļīĆĒĢÖņāØļōżņØś ņĪ░ĒÖöļĪ£ņÜ┤ ņéČņØä ĒśĢņä▒ ĒĢśļŖöļŹ░ ļÅäņøĆņØ┤ ļÉśļŖö Ļ▓āņØ┤ļŗż. ļ│Ė ņŚ░ĻĄ¼ņŚÉņä£ļŖö ņśüĒÖö <ļØ╝ļØ╝ļ×£ļō£>ļź╝ ĒÖ£ņÜ®ĒĢ£ <ņ£ĀņĢä ņ░ĮņØśņä▒ ĻĄÉņ£Ī> ņłśņŚģņØä ĒåĄĒĢ┤ņä£ ļīĆĒĢÖņāØļōżņØś ņ×ÉņĢäņĀĢņ▓┤Ļ░É ĒÖĢļ”ĮĻ│╝ ĒāÉņāēņØä ĒĢ┤ļ│┤Ļ│Āņ×É ĒĢśņśĆļŗż.
ņśüĒÖöļź╝ ĒåĄĒĢ£ ņłśņŚģņØĆ ļŗżņØīĻ│╝ Ļ░ÖņØĆ ņןņĀÉņØ┤ ņ׳ļŗż. ņśüĒÖöļŖö ĒĢÖņāØļōżņŚÉĻ▓ī ņ▓½ņ¦Ė, ņłśļÅÖņĀüņØ┤ ņĢäļŗłļØ╝ ņĀüĻĘ╣ņĀüņØĖ ņäĀĒāØĻ│╝ Ēā£ļÅäļź╝ Ļ░Ćņ¦ĆĻ│Ā ĻĄÉņ£ĪņŚÉ ņ░ĖņŚ¼ĒĢśĻ▓ī ĒĢśļ®░, ļæśņ¦Ė, ļŗżņ¢æĒĢ£ ņé¼Ļ│Āļź╝ ĒĢĀ ņłś ņ׳ļÅäļĪØ ĒĢśļ®░, ņģŗņ¦Ė, ļŗżņ¢æĒĢ£ ņןņ╣śļōżņØä ņØ┤ņÜ®ĒĢśņŚ¼ ļ¬░ņ×ģĒĢĀ ņłś ņ׳ļÅäļĪØ ĒĢśĻ▓ī ĒĢ┤ ņżĆļŗżļŖö ņןņĀÉņØä Ļ░Ćņ¦ĆĻ│Ā(ņ£żņĀĢņ¦ä ņÖĖ, 2017: 154) ņ׳ĻĖ░ ļĢīļ¼ĖņØ┤ļŗż. ņØ┤ņŚÉ ņłśņŚģņŚÉņä£ļŖö ņśüĒÖö ņäĀņĀĢ Ļ│╝ņĀĢņØä Ļ▒░ņ│É, ĻĄÉņłśŌŗģĒĢÖņŖĄ ļ░®ļ▓ĢņØä ĻĄ¼ņ▓┤ĒÖöņŗ£ĒéżĻ│Ā ņØ┤ļź╝ ņĀüņÜ®ĒĢśĻ│Āņ×É ĒĢśņśĆļŗż. ļ©╝ņĀĆ ĒĢÖņāØļōżņØĆ ļ¬ģņןļ®┤Ōŗģļ¬ģļīĆņé¼ļź╝ ņ░ŠĻ│Ā, ņ░ĮņØśņĀüņØĖ ņ¦łļ¼ĖņØä ĒĢśļŖö ļō▒ņØś ņé¼ņĀä ĒÖ£ļÅÖ, Ļ░äĒĢÖļ¼ĖņĀü Ļ░ĢņØś ļ░Å ĒÖ£ļÅÖņØä Ļ░£ļ░£ĒĢśņŚ¼ ļ│Ėņŗ£ ĒÖ£ļÅÖņØä ņ¦äĒ¢ēĒĢśĻ│Ā ņ׳ņ£╝ļ®░, ņé¼Ēøä ĒÖ£ļÅÖņ£╝ļĪ£ ņśüĒÖöņØś ņØ┤ļ»Ėņ¦Ć Ļ░ĢņĀ£ Ļ▓░ĒĢ®, ĒżĒŖĖĒÅ┤ļ”¼ņśż ĻĄ¼ņä▒(Ļ╣Ćņä▒ņøÉ, ņ£żņĀĢņ¦ä, 2016: 463-464) ļō▒ņ£╝ļĪ£ ņłśņŚģņØä ņ¦äĒ¢ēĒĢ£ļŗż.
ļ│Ė ņŚ░ĻĄ¼ņŚÉņä£ļŖö ņśüĒÖö <ļØ╝ļØ╝ļ×£ļō£>ļź╝ ņäĀņĀĢĒĢśņśĆļŗż. ņśüĒÖö <ļØ╝ļØ╝ļ×£ļō£>ļŖö ļō▒ņןņØĖļ¼╝ļōżņØś ņé¼ļ×æĻ│╝ Ļ┐łņØä ņ░ŠņĢäĻ░ĆļŖö Ļ│╝ņĀĢņØä ĻĘĖļ”¼Ļ│Ā ņ׳ļŗż. ņŚ░ĻĄ¼ņ×ÉļōżņØĆ ņé¼ļ×æĻ│╝ Ļ┐łņØä ņ░ŠņĢäĻ░ĆļŖö Ļ│╝ņĀĢņØĆ ņéČņŚÉņä£ ļ¦żņÜ░ ņżæņÜöĒĢ£ ļČĆļČäņØä ņ░©ņ¦ĆĒĢśĻ│Ā ņ׳ļŖö Ļ│╝ņŚģņØ┤ņ×É ņŻ╝ņĀ£ņØ┤ļ®░ ņé¼ļ×æņØś ņŻ╝Ļ│Ā ļ░øņØī, Ļ┐łņØś ņä▒Ļ│ĄĻ│╝ ņŗżĒī©ņŚÉ ļīĆĒĢ£ Ļ╣ŖņØĆ Ļ│Āļ»╝Ļ│╝ ņä▒ņ░░ņØĆ ņ×ÉĻĖ░ ņ×ÉņŗĀņØś Ļ│╝Ļ▒░ļź╝ ļÅīņĢäļ│┤ļ®┤ņä£ ļśÉļŖö ļ»ĖļלļĪ£ ļéśņĢäĻ░Ćļ®┤ņä£ ņ×ÉĻĖ░ ņ×ÉņŗĀņŚÉ ļīĆĒĢ£ ĒåĄņ░░ņØä Ļ░ĆņĀĖņśżļŖö ņéČņØś Ļ│╝ņĀĢņØ┤ĻĖ░ņŚÉ ļīĆĒĢÖņāØļōżņŚÉĻ▓ī ĒĢäņÜöĒĢ£ Ļ│╝ņĀĢņØ┤ļØ╝Ļ│Ā ņāØĻ░üĒĢśņśĆļŗż. Ļ┐łĻ│╝ ņé¼ļ×æņØĆ ŌĆśļéśŌĆÖļØ╝ļŖö ņ×ÉņĢäņĀĢņ▓┤Ļ░ÉņØä ĻĄ¼ņ▓┤ĒÖöĒĢśĻ│Ā ņĢīņĢäĻ░ĆļŖöļŹ░ ņéČņŚÉņä£ ļ¦żņÜ░ ņżæņÜöĒĢ£ ņśüĒ¢źņØä ļ»Ėņ╣śļŖö ņÜöņåīņÖĆ Ļ░Öļŗż.
ņØ┤ļź╝ ĒåĀļīĆļĪ£ ļ©╝ņĀĆ ļīĆĒĢÖņāØļōżņØ┤ ņ×ÉĻĖ░ ņ×ÉņŗĀņŚÉ ļīĆĒĢ£ ņØ┤ņĢ╝ĻĖ░ļź╝ ņ¢┤ļ¢╗Ļ▓ī Ēæ£ĒśäĒĢśļŖöņ¦Ćļź╝ ņĢīĻĖ░ ņ£äĒĢ┤ ļīĆĒĢÖņāØļōżņØś ŌĆśņ×ÉĻĖ░Ēæ£ĒśäņØä ĒĢĀ ņłś ņ׳ļÅäļĪØ ĒĢśļŖö ņŗ£Ļ░üĒÖöņ¦Ćļź╝ Ļ░£ļ░£ĒĢśņśĆļŗż. ņŗ£Ļ░üĒÖöņ¦ĆļŖö ĒĢÖņāØļōżņØś ņé¼ņĀä, ļ│Ėņŗ£, ņé¼Ēøä ĒÖ£ļÅÖņØä ņ£äĒĢ┤ ĻĄ¼ņä▒ļÉśņŚłņ£╝ļ®░, ņśüĒÖö <ļØ╝ļØ╝ļ×£ļō£>ņØś ļé┤ņÜ®ņŚÉ ļ¦×ņČöņ¢┤ ĒĢÖņāØļōżņØ┤ ņ×ÉĻĖ░ ņ×ÉņŗĀņØä Ēæ£ĒśäĒĢśļÅäļĪØ ĻĄ¼ņĢłĒĢ£ Ļ▓āņØ┤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ņŗ£Ļ░üĒÖöņ¦Ćļź╝ ĒåĄĒĢ┤ ņ×ÉĻĖ░ ņ×ÉņŗĀņØä Ēæ£ĒśäĒĢśĻ│Āņ×É ĒĢśņśĆņ£╝ļ®░, ņŗ£Ļ░üĒÖöņ¦Ć ņØ┤ņāüņØś ņČ®ļČäĒĢ£ ņ×ÉņŗĀņØś ļ¬©ņŖĄņØ┤ Ēæ£ĒśäļÉĀ ņłś ņ׳ļÅäļĪØ ĒĢśņśĆļŗż. ņŚ░ĻĄ¼ņ×É 2ļ¬ģņØ┤ ņŗ£Ļ░üĒÖöņ¦ĆņØś ļé┤ņÜ®ņØä Ļ│ĀņĢłĒĢśĻ│Ā ņØ┤ļź╝ 3ĒÜī ņØ┤ņāü Ļ▓ĆĒåĀĒĢśņśĆņ£╝ļ®░, ņśüĒÖöļź╝ ĒåĄĒĢ£ ņ░ĮņØśņä▒ ĻĄÉņ£ĪņŚÉ ņĀäļ¼Ėņä▒ņØ┤ ņ׳ļŖö ļ░Ģņé¼ 1ņØĖņØ┤ ņČöĻ░Ć Ļ▓ĆĒåĀļź╝ ĒĢśņśĆļŗż. ņØ┤ļź╝ ĒåĄĒĢ┤ ņĄ£ņóģņĀüņ£╝ļĪ£ ļ¦īļōżņ¢┤ņ¦ä ņŗ£Ļ░üĒÖöņ¦ĆļŖö <Ēæ£ 1>Ļ│╝ Ļ░Öļŗż. <Ēæ£ 1>ņŚÉņä£ ļéśĒāĆļéśļŖö ņŗ£Ļ░üĒÖöņ¦ĆļŖö ņśłņŗ£ ļČĆļČäļ¦ī ļ░£ņĘīĒĢśņŚ¼ ļ│┤ņŚ¼ņŻ╝ļŖö Ļ▓āņ£╝ļĪ£ 4ņŻ╝Ļ░äņØś <ļØ╝ļØ╝ļ×£ļō£> ņłśņŚģņØä ņ£äĒĢ┤ ņé¼ņÜ®ļÉśņŚłļŗż. ņŗ£Ļ░üĒÖöņ¦ĆļĪ£ ļ¦īļōżņ¢┤ņ¦ä ņ×æĒÆłņØś ĒÅēĻ░Ć ņÜöņåīļŖö ņśüĒÖöņŚÉ ļīĆĒĢ£ ļÅģņ░Įņä▒, ņ£Āņ░Įņä▒, ļ»╝Ļ░Éņä▒Ļ│╝ ņŻ╝ņĀ£ņŚÉ ļīĆĒĢ£ ļ¬░ņ×ģļÅä, ņ░ĖņŚ¼ļÅäļĪ£ ĒÅēĻ░ĆĒĢśņśĆļŗż.
Ļ░£ļ░£ļÉ£ ņŗ£Ļ░üĒÖöņ¦Ć ņśłņŗ£
ņŗ£Ļ░üĒÖöņ¦Ćļź╝ ļ¦īļōĀ ņØ┤ļĪĀņĀü ļ░░Ļ▓ĮĻ│╝ ĻĘĖ ĻĘ╝Ļ▒░ļŖö ļŗżņØīĻ│╝ Ļ░Öļŗż. ļé©ĻĖ░ņøÉ(2011-Ļ│ĀņØĆĒؼ, 2020: 54ņŚÉņä£ ņ×¼ņØĖņÜ®)ņØĆ ņØĖĻ░äņØ┤ ņŗ£ņ¦ĆĻ░üņØä ĒåĄĒĢ┤ņä£ ņé¼ļ¼╝ņØ┤ļéś ĒÖśĻ▓ĮņØä ņ׳ļŖö ĻĘĖļīĆļĪ£ ĒīÉļŗ©ĒĢśļŖö Ļ▓āņØ┤ ņĢäļŗłļØ╝, ņäĀĒāØĒĢ£ ļīĆņāüņØä ņĀäņ▓┤ņØś ĻĄ¼ņĪ░ ņĢłņŚÉņä£ ļ©╝ņĀĆ ĒīīņĢģĒĢśĻ│Ā ņĪ░ņ¦üĒÖöņŗ£Ēé┤ņ£╝ļĪ£ņŹ© ņĢīņĢäĻ░äļŗżĻ│Ā ĒĢśņśĆļŗż. ļö░ļØ╝ņä£ ņŚ░ĻĄ¼ņ¦äņØĆ ĒĢÖņāØļōżņŚÉĻ▓ī ņĀäņ▓┤ņĀüņØĖ Ļ░ĆņØ┤ļō£ļØ╝ņØĖņØĆ ņŻ╝ņŚłņ¦Ćļ¦ī, ĒĢÖņāØļōż ņŖżņŖżļĪ£ ņāłļĪ£ņÜ┤ ņāØĻ░üņØä ņĪ░ņ¦üĒÖöĒĢĀ ņłś ņ׳ļÅäļĪØ ĒĢśņśĆļŗż. ņØ┤ļŖö ļśÉĒĢ£ ĻĄ¼ņä▒ņŻ╝ņØś ņ▓ĀĒĢÖņØä ļö░ļźĖ Ļ▓āņØ┤ļØ╝ ļ│╝ ņłś ņ׳ļŖöļŹ░, ņØ┤ ĻĄ¼ņä▒ņŻ╝ņØśņØś ņŗ£Ļ░üĒÖö Ļ│╝ņĀĢ ņ”ē, ņé¼Ļ│ĀĒĢśĻ│Ā Ļ▓ĮĒŚśĒĢśļŖö Ļ│╝ņĀĢņØä ĒåĄĒĢ┤ņä£ ĒĢÖņāØ ņŖżņŖżļĪ£ ņ×ÉņŗĀļōżņØś ļ░░ņøĆņØś ņśłņłĀņØä Ēæ£ĒśäĒĢśļŖö Ļ▓āĻ│╝ ņŚ░Ļ┤Ćņä▒ņØä Ļ░Ćņ¦äļŗżĻ│Ā ĒĢĀ ņłś ņ׳ļŗż. ļ│ĆņŚ░Ļ│ä(2021: 349- 351)ļŖö ĻĄ¼ņä▒ņŻ╝ņØśļź╝ ļīĆĒæ£ĒĢśļŖö PiagetņØś ņØ┤ļĪĀņØä ņäżļ¬ģĒĢśņśĆļŖöļŹ░ ĻĘĖļŖö ĒÅēĒśĢĒÖöļź╝ ļÅÖĒÖöņÖĆ ņĪ░ņĀłņØ┤ļØ╝ļŖö Ļ░£ļģÉņØä ĒåĄĒĢ┤ ņØĖĻ░äņØś ņØĖņ¦Ćļ░£ļŗ¼ņØ┤ ņ¢┤ļ¢╗Ļ▓ī ņØ┤ļŻ©ņ¢┤ņ¦ĆļŖöņ¦Ćļź╝ ņäżļ¬ģĒ¢łļŗż. ļÅÖĒÖöļŖö ņ×ÉĻĖ░ ņ×ÉņŗĀņØ┤ ņāüĒÖ®ņØ┤ļéś ņé¼ĒÜīņŚÉņä£ ņ¢╗ņØĆ ņ¦ĆņŗØĻ│╝ Ļ▓ĮĒŚś ņĪ░ņ¦üņØä ĒåĀļīĆļĪ£ ņäĖĻ│äļź╝ ņØ┤ĒĢ┤ĒĢśĻ│Āņ×É ĒĢśļŖö Ļ▓āņØ┤ļŗż. ņ”ē, ņ×ÉņŗĀ ņŖżņŖżļĪ£ ņ×Éņ£©ņĀüņØ┤Ļ│Ā ņ×Éņ£ĀļĪŁĻ▓ī ņäĀĒāØĒĢśĻ│Āņ×É ĒĢśļŖö ņŗ£ļÅäņØ╝ Ļ▓āņØ┤ļŗż. ļśÉĒĢ£ ņĪ░ņĀłņØĆ ņāłļĪ£ņÜ┤ Ļ▓ĮĒŚś ņāüĒā£ņŚÉ ļÅäļŗ¼ĒĢśņśĆņØä ļĢī Ēś╝ļ×ĆņØś ņāüĒā£ņŚÉ ņØ┤ļź┤Ļ▓ī ļÉśļ®┤ ļ░śņä▒ņĀüņØ┤Ļ│Ā ĒåĄĒĢ®ņĀüņØĖ Ē¢ēļÅÖņØä ĒåĄĒĢ┤ ņØĖņ¦ĆņĀüņØĖ ĒÅēĒśĢņä▒ņØä ņØ┤ļŻ©ĻĖ░ ņ£äĒĢ┤ ļģĖļĀźĒĢ£ļŗżļŖö Ļ▓āņØ┤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ņ×ÉņŗĀņØś ņ×æĒÆłņØä ļ¦īļōżņ¢┤ ļéśĻ░ĆĻĖ░ ņ£äĒĢ┤ņä£ ņ¦ĆņåŹņĀüņ£╝ļĪ£ ņāØĻ░üĒĢśĻ│Ā ņĢīņĢäĻ░Ćļ®┤ņä£ ļŗżņŗ£ ņłśņĀĢĒĢśĻ│Ā ļŗżņŗ£ ņāłļĪŁĻ▓ī ņ░ĮņĪ░(ÕēĄķĆĀ)ĒĢśļŖö Ļ│╝ņĀĢņØä ņ¦ĆņåŹņĀüņ£╝ļĪ£ Ļ▒░ņ╣śĻ│Ā ņ׳ņŚłļŗż. ņØ┤ ļ░░ņøĆņØĆ ĻĄÉņłśņ×ÉņÖĆ ĒĢÖņāØņØś ņåīļ¦ØĻ│╝ ļģĖļĀź, ņÜĢļ¦ØņØś ņłśļ¦ÄņØĆ ņØ┤ņä▒Ļ│╝ Ļ░Éņä▒ņØ┤ ņ¢┤ņÜ░ļ¤¼ņ¦ä Ļ▓āņ£╝ļĪ£ ņ░ĮņĪ░ņĀüņ£╝ļĪ£ ņāłļĪ£ņÜ┤ ņ×æĒÆłņŚÉ ļīĆĒĢ┤ ļüŖņ×äņŚåņØ┤ ņāØĻ░üĒĢśĻ▓ī ĒĢ┤ ņŻ╝ņŚłļŗż. ļö░ļØ╝ņä£ ļ░░ņøĆņØĆ ĒĢÖņāØļōżņØś ļŖźļÅÖņĀüņØĖ Ē¢ēļÅÖĻ│╝ ĒÖ£ĻĖ░ņ░¼ ļ¦łņØīņØś ĒåĄĒĢ®ņĀüņØĖ ļŖźļĀźņŚÉ ņ׳ļŗż. ļśÉĒĢ£ Ļ│ĀņØĆĒؼ(2020: 54-55)ļŖö ņŗ£Ļ░üņĀü ņé¼Ļ│ĀĻ░Ć ņāłļĪ£ņÜ┤ ņĢäņØ┤ļööņ¢┤ ļ░£ņāüĻ│╝ ņøÉĒÖ£ĒĢ£ ņ╗żļ«żļŗłņ╝ĆņØ┤ņģśņŚÉ ļÅäņøĆņØ┤ ļÉ£ļŗżĻ│Ā ĒĢśņśĆļŗż. ņŚ░ĻĄ¼ņ×ÉļōżņØĆ ļ©╝ņĀĆ ĒĢÖņāØļōżņØś ņŗ£Ļ░üņĀü ņé¼Ļ│ĀņŚÉ ņ×ÉĻĘ╣ņØä ņŻ╝ĻĖ░ ņ£äĒĢ┤ ņŗ£Ļ░üĒÖöņ¦Ćļź╝ ļ¦īļōżņŚłĻ│Ā ĻĘĖļōżņØ┤ ņ×ÉļŻīļź╝ ņ░ĖĻ│ĀļĪ£ ĒĢśņŚ¼ ņĢäņØ┤ļööņ¢┤ ļ░£ņāüĻ│╝ ņØśņé¼ņåīĒåĄņØ┤ ņ×Éņ£ĀļĪŁĻ▓ī ņØ┤ļŻ©ņ¢┤ņ¦ł ņłś ņ׳ļÅäļĪØ ĒĢśņśĆļŗż.
ĒĢÖņāØļōżņØ┤ ņŖżņŖżļĪ£ ĻĘĖļōżņØś Ļ░ÉĻ░üĻ│╝ Ļ░ÉņĀĢņŚÉ ļīĆĒĢ┤ņä£ ņל ņé┤Ēö╝Ļ▓ī ļÉśļ®┤ ĻĘĖļōżņØĆ ņŖżņŖżļĪ£ņŚÉ ļīĆĒĢ£ ņä▒ņןņØ┤ ņØ╝ņ¢┤ļéśĻ▓ī ļÉ£ļŗż(ļ░Ģņ¦äĒؼ ņÖĖ, 2022: 1659). ņ×ÉĻĖ░ ņ×ÉņŗĀņŚÉ ļīĆĒĢ£ ņĢäņØ┤ļööņ¢┤ļź╝ ņŗ£Ļ░üĒÖöņ¦ĆņŚÉ ļō£ļ¤¼ļé┤ļŖö Ļ▓āņØĆ ļŗżņŗ£ ĒĢ£ļ▓ł ļŹö ņ×ÉņŗĀņŚÉ ļīĆĒĢ┤ņä£ ņĢīņĢäĻ░ĆļŖö Ļ│╝ņĀĢņØ┤ ļÉ£ļŗż. ĻĘĖĻ▓āņØĆ ļŗ©ņ¦Ć ļīĆĒĢÖņāØ Ļ░£Ļ░£ņØĖ ļ┐Éļ¦ī ņĢäļŗłļØ╝, ĒāĆņØĖņŚÉ ļīĆĒĢ£ ņĢÄ(ļ░Ģņ¦äĒؼ ņÖĖ, 2022: 1657-1659)Ļ│╝ ĒÖśĻ▓ĮņØä ņĢīņĢäĻ░ĆļŖö ĻĘĖĻ▓āņØ┤ ņåīĒåĄņØ┤ ļÉśļŖö ņäĖĻ│äļź╝ ĒåĄĒĢ┤ ļŗżņŗ£ ĻĘĖļōżņØś ļäōņØĆ ņäĖĻ│äļĪ£ ļéśņĢäĻ░ĆĻ▓ī ĒĢ£ļŗż. ļ│┤ļŗż ņä▒ņłÖĒĢśĻ│Ā Ļ▒┤Ļ░ĢĒĢ£ ņ×ÉņĢäļź╝ ņäĀĒāØĒĢ┤ ļéśĻ░ĆļŖö Ļ▓āĻ│╝ Ļ░Öļŗż.
ņŗ£Ļ░üĒÖö ņśłņłĀ Ļ▓ĮĒŚś ĒÖ£ļÅÖņØä ĒĢ£ ĒĢÖņāØļōżļĪ£ļČĆĒä░ņØś ņ×ÉļŻī ņłśņ¦æņØĆ ļ®┤ļŗ┤Ļ│╝ Ēżņ╗żņŖż ĻĘĖļŻ╣ ņØĖĒä░ļĘ░(Focus Group Interview)ļĪ£ ņ¦äĒ¢ēļÉśņŚłļŗż. ļ®┤ļŗ┤ņØĆ ņŚ░ĻĄ¼ņ░ĖņŚ¼ņ×ÉņØĖ ĒĢÖņāØļōżĻ│╝ ĻĄ¼ņĪ░ĒÖöļÉśĻ▒░ļéś ļ░śĻĄ¼ņĪ░ĒÖöļÉ£ ņ¦łļ¼Ėņ¦Ćļź╝ Ļ░Ćņ¦ĆĻ│Ā ļīĆĒÖöļź╝ ļéśļłäļŖö Ļ▓āņ£╝ļĪ£ ņ¦äĒ¢ēļÉśņŚł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ņ×ÉņŗĀņØś ņØ┤ņĢ╝ĻĖ░ļź╝ ņ¦łļ¼ĖņŚÉ ļö░ļØ╝ ņ×Éņ£ĀļĪŁĻ▓ī ļīĆļŗĄĒĢśņśĆļŗż. FGIļŖö ņĀĢļ¤ēņĀü ņŚ░ĻĄ¼ ļ░®ļ▓ĢĻ│╝ļŖö ļŗ¼ļ”¼ ņŚ░ĻĄ¼ņ░ĖņŚ¼ņ×ÉņØś ņŗ¼ļ”¼ņĀüņØĖ ņ░©ņøÉņØä ņØ┤ĒĢ┤ĒĢĀ ņłś ņ׳Ļ│Ā, Ļ│ĄĒåĄļÉ£ Ļ▓ĮĒŚś ņŻ╝ņĀ£ņŚÉ ļīĆĒĢ┤ņä£ ņ×Éņ£ĀļĪŁĻ▓ī ļīĆĒÖöĒĢĀ ņłś ņ׳ĻĖ░ ļĢīļ¼ĖņŚÉ ņäĀĒāØĒĢśņśĆļŗż(Vaughn, et al., 1996 - ņĀĢņ¦äņøÉ ņÖĖ, 2013: 89ņŚÉņä£ ņ×¼ņØĖņÜ®). ņ×ÉļŻī ņłśņ¦æ Ļ│╝ņĀĢņŚÉņä£ļŖö ņŚ░ĻĄ¼ņ░ĖņŚ¼ņ×ÉļōżņØĖ ĒĢÖņāØļōżņŚÉĻ▓ī ņ¢┤ļ¢ĀĒĢ£ ņŚ░ĻĄ¼ņØś ļ¬®ņĀüņØä Ļ░Ćņ¦ĆĻ│Ā ņŚ░ĻĄ¼Ļ░Ć ņ¦äĒ¢ēņØ┤ ļÉśļŖöņ¦Ć, ĻĘĖļōżņØ┤ ņøÉĒĢĀ ņŗ£ņŚÉļŖö ņ¢ĖņĀ£ļōĀņ¦Ć ņŚ░ĻĄ¼ņ░ĖņŚ¼ļź╝ ņĘ©ņåīĒĢĀ ņłś ņ׳ļŗżļŖö ņäżļ¬ģņØä ĒĢśņśĆĻ│Ā ļÅÖņØśņä£ņŚÉ ņé¼ņØĖņØä ļ░øņĢśļŗż. ĒĢÖņāØļōżņØś ļ®┤ļŗ┤Ļ│╝ FGIņØś Ļ│╝ņĀĢņØĆ ļ¬©ļæÉ ļģ╣ņĘ©ļÉśņŚłņ£╝ļ®░, ņØ┤ļŖö ļ¬©ļæÉ ņĀäņé¼ļÉśņŚłļŗż. ņ×ÉļŻī ļČäņäØņØĆ ņØ┤ļź╝ ņĮöļö®ĒĢśĻ│Ā ĒĢ┤ņäØ, Ļ│Ąņ£ĀĒĢśĻĖ░ļź╝ ĒåĄĒĢ┤ ņØ┤ļŻ©ņ¢┤ņĪī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ņśłņłĀ Ļ▓ĮĒŚśņØä ņŗ£ņ×æĒĢśļŖö Ļ│╝ņĀĢņŚÉņä£ļČĆĒä░ ņ¢┤ļĀżņøĆņØä Ļ▓¬ņŚłļŗż. ņÖ£ļāÉĒĢśļ®┤ ņØ┤ļ¤¼ĒĢ£ ņ░ĮņØśņĀü ĒÖ£ļÅÖ ņłśņŚģņŚÉ ņØĄņłÖĒĢśņ¦Ć ņĢŖņĢśĻĖ░ ļĢīļ¼ĖņØ┤ļŗż. ļśÉĒĢ£ ņłśņŚģņØĆ ņŖżņŖżļĪ£ ĻĖ░ĒÜŹĒĢśĻ│Ā ņé¼Ļ│ĀĒĢśĻ│Ā ņÖäņä▒ĒĢśĻĖ░ ņ£äĒĢ┤ ņŗ£ļÅäĒĢśļŖö ņ×ÉĻĖ░ņŻ╝ļÅäņĀüņØĖ Ēā£ļÅäņÖĆ ņŚŁļ¤ēņØä ĒĢäņÜöļĪ£ ĒĢśņśĆĻ│Ā, ĒĢÖņāØļōżņŚÉĻ▓ī ļŖźļÅÖņĀüņ£╝ļĪ£ ņłśņŚģņŚÉ ņ×äĒĢ£ļŗżļŖö Ļ▓āņØĆ ņ¢┤ļĀĄĻ│Ā ĒלļōĀ Ļ│╝ņĀĢņØ┤ņŚłĻĖ░ ļĢīļ¼ĖņØ┤ļŗż. ļö░ļØ╝ņä£ ņ▓śņØīļČĆĒä░ ŌĆśņ¢┤ļ¢╗Ļ▓ī ņŗ£ņ×æĒĢ┤ņĢ╝ ĒĢĀņ¦Ć ļ¬©ļ”äŌĆÖĻ│╝ ŌĆśĒæ£ĒśäņØś ņ¢┤ļĀżņøĆŌĆÖņØä Ļ▓ĮĒŚśĒĢśĻ▓ī ļÉśņŚłļŗż. ĒŖ╣Ē׳, A ĒĢÖņāØņØĆ ŌĆ£ļ¬░ļØ╝ņä£ ņĢäļ¼┤ ņāØĻ░üņØ┤ ņŚåņŚłņ¢┤ņÜöŌĆØļØ╝Ļ│Ā ļ¦ÉĒ¢łļŗż. ĒāĆ ņłśņŚģņŚÉņä£ ŌĆśĻ░ÉņĀĢņØä ĻĖ░ļĪØĒĢśļŖö Ļ▓āŌĆÖ, ŌĆśĒāĆņØĖņØä ņØ┤ĒĢ┤ņŗ£ĒéżļŖö ļ░®ļ▓ĢŌĆÖņŚÉ ļīĆĒĢ┤ņä£ļÅä ĒĢÖņāØļōżņØĆ ĒĢ┤ ļ│Ė ņĀüņØ┤ ņŚåļŗżĻ│Ā ĒĢśņśĆļŗż. ņÜ░ļ”¼ļŖö ĒĢŁņāü ļ¬©ļ”äņŚÉ ļīĆĒĢ£ ļæÉļĀżņøĆņØä Ļ░Ćņ¦ĆĻ│Ā ņ׳ļŗż. ļśÉĒĢ£ ņŗ£ļÅäĒĢ┤ ļ│┤ņ¦Ć ņĢŖņØĆ Ļ▓āņØä ņŗ£ņ×æĒĢĀ ļĢī ļæÉļĀżņøĆĻ│╝ ņ¢┤ļĀżņøĆņØä ļŖÉļü╝ĻĖ░ļÅä ĒĢ£ļŗż.
ļ¬░ļØ╝ņä£ ņĢäļ¼┤ ņāØĻ░üņØ┤ ņŚåņŚłņ¢┤ņÜö. ĻĘĖļĢī. ĻĘ╝ļŹ░ Ļ│äņåŹ ņØ┤ļĀćĻ▓ī ņāØĻ░üĒĢśļŗż ļ│┤ļŗłĻ╣ī ņśżļ×£ ņŗ£Ļ░ä ĒĢśļ®┤ņä£ Ļ┤£ņ░«ņØĆ ņĀÉļÅä ļ¦ÄņĢśļŖöļŹ░ ņØ╝ļŗ© ņ×æņŚģĒĢśļŖö Ļ│╝ņĀĢņŚÉņä£ ņŗ£Ļ░äņØ┤ ļäłļ¼┤ ņśżļל Ļ▒Ėļ”¼ļŗłĻ╣ī ĻĘĖĻ▓āļÅä ĒלļōżņŚłĻ│Ā ņØ┤ļĀćĻ▓ī ĒĢśļŖö Ļ▓ī ļ¦×ļéś ņŗČņ¢┤ņä£ ņóĆ ļ¦ÄņØ┤ Ļ│Āļ»╝ņØä ļ¦ÄņØ┤ Ē¢łļŹś Ļ▒░ Ļ░ÖņĢäņÜö. (A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ĻĄÉņłśļŗśņØ┤ ĻĘĖ ĻŠĖļ░Ć ļĢī ņĢĮĻ░ä ņ×ÉĻĖ░ļź╝ ņל Ēæ£ĒśäĒĢśļØ╝Ļ│Ā ļ¦ÉņöĆĒĢśņģö Ļ░Ćņ¦ĆĻ│Ā ļé┤Ļ░Ć ņóŗņĢäĒĢśļŖö Ļ▓āļōżņŚÉ ļīĆĒĢ┤ ņāØĻ░üĒĢ┤ ļ│┤ļŖö ņŗ£Ļ░äņØä Ļ░ĆņĪīņŚłļŖöļŹ░ ļé┤Ļ░Ć ņóŗņĢäĒĢśļŖö Ļ▓āļōż ņżæņŚÉ ļ¼┤ņŚćņØä ņØ┤ņÜ®ĒĢ┤ņä£ ņØ┤Ļ▒░ļź╝ ĻĄ¼ņä▒ĒĢĀņ¦Ć Ļ│Āļź┤ĻĖ░Ļ░Ć ņ¢┤ļĀżņøĀĻ│Ā, ĻĘĖ ņóŗņĢäĒĢśļŖö Ļ▒Ė Ļ│©ļ×ÉļŗżĻ│Ā ĒĢ┤ļÅä ņØ┤Ļ▒Ė ņ¢┤ļ¢╗Ļ▓ī ņé┤ļĀżņĢ╝ ļÉĀņ¦Ć ņ¢┤ļ¢╗Ļ▓ī ļ░░ņ╣śĒĢ┤ņĢ╝ ņĢäņØ┤ļōżņØ┤ ņĢĮĻ░ä ņóĆ ļŹö ņל ļ│╝ ņłś ņ׳ņØäņ¦Ć ņóĆ ĒĢ£ļÅÖņĢł ņóĆ Ļ░łĒīĪņ¦łĒīĪĒĢśņśĆņŖĄļŗłļŗż. (B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Ø╝ļŗ© ĒÅēņåīņŚÉ ņśüĒÖöņŚÉ ļīĆĒĢ£ Ļ░ÉņĀĢņØä ņśżļל ņāØĻ░üĒĢśņ¦ĆļÅä ņĢŖĻ│Ā ĻĖ░ļĪØņØä ļé©Ļ▓©ļæÉļŖö Ļ▓āļÅä ņĢäļŗłņ¢┤ņä£ ĻĘĖ ņśüĒÖöņŚÉ ļīĆĒĢ┤ ļé┤Ļ░Ć ļŖÉĻ╝łļŹś Ļ░ÉņĀĢņØä ņØ┤ņĀ£ ĻĘĖļ”╝Ļ│╝ ĻĖĆļĪ£ Ēæ£ĒśäņØä ĒĢśļŖö Ļ▓ī ņĪ░ĻĖł ņĀĆĒĢ£Ēģī ņ▓śņØīņŚÉļŖö ļČĆļŗ┤ņŖżļ¤ĮĻ│Ā ņ¢┤ļĀĄĻ▓ī ļŗżĻ░ĆņÖöļŹś Ļ▓ā Ļ░ÖņĢäņÜö. (C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ĒĢÖņāØļōżņØĆ ļ¬©ļ”äņŚÉ ļīĆĒĢ£ ļČłĒÄĖĒĢ©ņØ┤ ņ׳ņŚłņ¦Ćļ¦ī, ņĢÄņØä ņ£äĒĢ┤ ņŗ£ņ×æļÉ£ Ļ░ÉņĀĢņØ┤ņŚłļŗż. ļśÉĒĢ£ ņĀÉņĀÉ ļŖźļÅÖņĀüņ£╝ļĪ£ ņøĆņ¦üņØ┤ĻĖ░ ņŗ£ņ×æĒĢśņśĆ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ņ¢┤ļ¢╗Ļ▓ī Ēæ£ĒśäĒĢ┤ņĢ╝ ĒĢĀņ¦Ć ļ¬©ļź┤ļŖö ņāüĒÖ®ņØä ĻĘ╣ļ│ĄĒĢśĻĖ░ ņ£äĒĢ┤ ņśüĒÖöļź╝ ļŗżņŗ£ ļ│┤Ļ│Ā, ņ╣£ĻĄ¼ļōżņŚÉĻ▓ī ņ×ÉņŗĀņØ┤ ņ¢┤ļ¢ĀĒĢ£ ņé¼ļ×īņØĖņ¦Ćļź╝ ļ¼╝ņ¢┤ļ│┤ĻĖ░ļÅä ĒĢśņśĆļŗż. ņ×ÉņŗĀņØś ņŗ£Ļ░üĒÖö ņ×ÉļŻīļź╝ ļ¦īļōżĻĖ░ ņ£äĒĢ┤ ĻĘĖ ļé┤ņÜ®ņŚÉ ļīĆĒĢ┤ Ļ╣ŖĻ▓ī ņāØĻ░üĒĢĀ ļ┐Éļ¦ī ņĢäļŗłļØ╝, ņśüĒÖöņØś ļé┤ņÜ®ļÅä ļŹö ņĀĢĒÖĢĒĢśĻ▓ī ļ│┤ĻĖ░ ņ£äĒĢ┤ ļģĖļĀźĒĢśņśĆ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ņ×ÉņŗĀļōżņØ┤ ņ¢┤ļ¢╗Ļ▓ī ĒĢĀ Ļ▓āņØĖņ¦Ćļź╝ ņ¦ĆņåŹņĀüņ£╝ļĪ£ ņŗ£ļÅäĒĢśĻ│Ā ļģĖļĀźĒĢ©ņ£╝ļĪ£ņŹ© ņĢÄņØś Ļ│╝ņĀĢņØä Ļ▒░ņ│żļŗż. ņ”ē ĒĢÖņāØļōżņØĆ ĒÖ£ļÅÖņØä ĒĢśļ®┤ņä£ ņל ļ¬░ļ×ÉļŹś ņé¼ņŗżņØä ņØ┤ĒĢ┤ĒĢ┤ ļéśĻ░ĆĻĖ░ ņ£äĒĢ┤ņä£ ĒāÉĻĄ¼ļź╝ ņ¦ĆņåŹĒĢ┤ ļéśĻ░Ćļ®┤ņä£ ļüŖņ×äņŚåņØ┤ ņ×ÉņŗĀņŚÉĻ▓ī ņ¦łļ¼ĖĒĢśņśĆĻ│Ā ņŗ£ļÅäĒĢśņśĆņ£╝ļ®░, ņØ┤ ļ¬©ļōĀ ĒÖ£ļÅÖņØĆ ņ×ÉņŗĀņØä ņāłļĪ£ņÜ┤ ņ░©ņøÉņ£╝ļĪ£ ļéśņĢäĻ░ł ņłś ņ׳ļÅäļĪØ ĒĢśļŖö ņŚ░Ļ▓░Ļ│Āļ”¼Ļ░Ć ļÉśņŚłļŗż(Ļ╣ĆņĀĢĒؼ, 2020: 72-73). ņĢÄņØĆ ļŗ©ņ¦Ć Ļ░ØĻ┤ĆņĀüņØĖ ņ¦ĆņŗØņ▓śļ¤╝ ļ░øņĢäļōżņŚ¼ņ¦ĆļŖö Ļ▓āņØ┤ ņĢäļŗłļØ╝, ņ×ÉņŗĀņØ┤ ļ¼┤ņŚćņØä ļ¬©ļź┤ļŖöņ¦Ćļź╝ ņĢīĻ│Ā ņØ┤ļź╝ ļ¼ĖņĀ£ļĪ£ ĻĘ£ņĀĢĒĢĀ ņłś ņ׳ņ£╝ļ®░, ĻĘĖ ļ¼ĖņĀ£ņŚÉ ļīĆĒĢ£ ļüŖņ×äņŚåļŖö ņ¦łļ¼ĖĻ│╝ ļÅäņĀäņØä ĒåĄĒĢ┤ ņ¢╗ņ¢┤ņ¦ĆļŖö Ļ▓āņØ┤ņŚłļŗż.
ĻĘĖ ņ▓śņØī ņśüĒÖöļź╝ ļ┤żņØä ļĢīļŖö ļ»ĖņĢäņÖĆ ņäĖļ░öņŖżņ░¼ ņé¼ļ×æ ņ¢śĻĖ░ļ¦ī ļ│┤ņśĆņŚłļŖöļŹ░ ĻĘĖĻ▒░ļź╝ ņŗ£Ļ░üĒÖö ĒĢśĻ▓ī ļÉśļŖö Ļ│╝ņĀĢņØä ļ│┤ļ®┤ņä£ ĒĢ£ ļ▓ł ļŹö ļ┤żļŖöļŹ░ ĻĘĖļĢīļŖö Ļ┐łņŚÉ Ļ┤ĆĒĢ£ ļé┤ņÜ® ņŚ┤ņĀĢņŚÉ Ļ┤ĆĒĢ£ ļé┤ņÜ®ņØ┤ ļ│┤ņØ┤ĻĖ░ ņŗ£ņ×æĒĢśļ®┤ņä£ ļé┤ Ļ┐łņØä ņāØĻ░üĒĢśĻ│Ā. (E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Ø╝ļŗ© ņĀĆļŖö ņĀ£Ļ░Ć ņ╣£ĻĄ¼ļōżņØ┤ ņāØĻ░üņØä Ē¢łņØä ļĢī ņĀ£Ļ░Ć ņ╣£ĻĄ¼ļōżĒĢ£Ēģī ļÉśĻ▓ī ņĀĆņŚÉ ļīĆĒĢ┤ņä£ ļ¦ÄņØĆ ņ¦łļ¼ĖņØä Ē¢łņŚłņ¢┤ņÜö. (ņżæļץ) (C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ĀĆļŖö ņŗ£Ļ░üĒÖöļź╝ ĒĢśļ®┤ņä£ ļŗżņ¢æĒĢ£ ļ░®ļ▓ĢņØä ĒåĄĒĢ┤ņä£ ņŗ£ļÅäĒĢ┤ ļ│┤ļĀżĻ│Ā Ē¢łņŚłļŖöļŹ░ ņ¢┤ļ¢╗Ļ▓ī ĒĢśļ®┤ ņØ┤Ļ▓ī ļŹö ņל ļłłņŚÉ ļōżņ¢┤ņśżĻ│Ā ļ│┤ĻĖ░ ĒÄĖĒĢ£ņ¦ĆņŚÉ ļīĆĒĢ┤ņä£ Ļ│Āļ»╝ņØä ļ¦ÄņØ┤ ĒĢ┤ņä£ŌĆ” (D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ĒĢÖņāØļōżņØś ļ¬©ļ”äĻ│╝ ņĢÄņØś ņ×æņÜ®ņØĆ ņłśņŚģ ņŗ£Ļ░äļ┐Éļ¦ī ņĢäļŗłļØ╝ ņØ╝ņāüņāØĒÖ£ ņåŹņŚÉņä£ļÅä ņØ╝ņ¢┤ļé¼Ļ│Ā, ļ¬©ļźĖļŗżļŖö Ļ▓āņØä ņĢīĻĖ░Ļ╣īņ¦Ć ļüŖņ×äņŚåļŖö ņØĖļé┤ņØś Ļ│╝ņĀĢņØä Ļ▒░ņ│żļŗż. ĻĘĖĻ▓āņØĆ Ļ│¦ ĻĘĖļōżņØś ņśłņłĀņØä ļ¦īļōżņ¢┤ļé┤ļŖö Ļ│╝ņĀĢņØ┤ņŚłļŗż. ņØ┤ļŖö ļ¬©ļ”äĻ│╝ ņĢÄņØś ņ¦ĆņåŹņĀüņØĖ ņāüĒśĖņ×æņÜ®ņØä ĒåĄĒĢ┤ ĒĢÖņāØļōż ļé┤ļ®┤ņØś ņ¦ĆņŗØņØä ĒśĢņä▒ĒĢśĻ│Ā ņŚ┤ņĀĢņØä ļŖÉļü╝Ļ│Ā ņĀüņØæĒĢ┤ ļéśĻ░ĆļŖö Ļ│╝ņĀĢņØ┤ņŚłļŗż. ņØ┤ļ¤¼ĒĢ£ ņāüĒśĖņ×æņÜ®ņØĆ ĻĘĖļōżņØś ļ¬©ļ”äĻ│╝ ņĢÄņŚÉ ļīĆĒĢ£ Ēā£ļÅä ļ│ĆĒÖöļĪ£ Ļ▓░ĻĄŁ ĒśäņŗżņŚÉņä£ņØś ņ×ÉņŗĀņŚÉ ļīĆĒĢ┤ ņØ┤ĒĢ┤ĒĢśĻ│Ā ņ░ŠņĢäĻ░ĆļŖö Ļ│╝ņĀĢņØś ņØ╝ĒÖśņØ┤ņŚłļŗż. ĒĢÖņāØņØĆ ŌĆśņ×ÉņŗĀņØś Ļ┐łņØä ņ░ŠĻ│Ā ņŗČļŗżŌĆÖĻ│Ā ĒĢśņśĆļŖöļŹ░ ņØ┤ļŖö ļ¦łņØīņŚÉņä£ņØś ņŚ┤ņĀĢņĀüņØĖ ņØśļ»ĖĒÖö Ļ│╝ņĀĢņ£╝ļĪ£ ļéśĒāĆļé¼ļŗż. ņ¦äņĀĢĒĢ£ ļ░░ņøĆĻ│╝ ņĢÄņØś Ļ│╝ņĀĢņØĆ ļüŖņ×äņŚåļŖö ņØśļ»ĖĒÖöņØś Ļ│╝ņĀĢņŚÉņä£ ļéśĒāĆļé£ļŗż. ņØśļ»ĖĒÖöļŖö ņ¦ĆņŗØņŚÉ ļīĆĒĢ£ ļ░░ņøĆņØ┤ ņל ņØ┤ļŻ©ņ¢┤ņĪīņØä ļĢī, ņØ╝ņ¢┤ļé£ļŗż. ļśÉĒĢ£ ņØĖĻ░äņØś ņéČņØĆ ņŖżņŖżļĪ£ ļ¦īļōżņ¢┤Ļ░ĆļŖö ņØśļ»ĖņŚÉ ļīĆĒĢ£ ņ▒ģņ×äĻ│╝ ņØśņ¦ĆņØś Ļ│╝ņĀĢņØ┤ļŗż. ņØ┤ļ¤¼ĒĢ£ ņØśļ»ĖĒÖöņØś Ļ│╝ņĀĢņØĆ Ļ░£ņØĖņŚÉĻ▓ī ļŗżņ¢æĒĢ£ ņäĀĒāØņØä ĒĢśĻ│Ā ņØśņ¦Ćļź╝ ĒåĄĒĢ┤ ļéśņĢäĻ░ł ņłś ņ׳ļÅäļĪØ ĒĢśņśĆņ£╝ļ®░, ĻĘĖ ņäĀĒāØĻ│╝ ļéśņĢäĻ░ÉņØĆ ļśÉĒĢ£ ņØśļ»Ėļź╝ ļŹöņÜ▒ Ļ░ĢĒÖöĒĢśņśĆ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ņŖżņŖżļĪ£ ņØśļ»ĖĒÖöļź╝ ņØ┤ĒĢ┤ĒĢśņśĆņ£╝ļ®░, ņ×ÉņŗĀņØś ļ¦łņØī ņåŹņŚÉņä£ņØś ņ▒ģņ×äĻ│╝ ņØśņ¦Ćļź╝ Ēæ£ĒśäĒĢśĻ│Ā ņ׳ņŚłļŗż.
ņĀ£Ļ░Ć ņØ┤ļ▓ł ĒÖ£ļÅÖņØä ĒĢśļ®┤ņä£ ņóŗņĢśļŹś ņĀÉņØĆ ņśüĒÖö ļØ╝ļØ╝ļ×£ļō£ļź╝ ļ│┤Ļ│Ā ņŚ¼ļ¤¼ Ļ░Ćņ¦Ć ņ╣┤ļō£ņŚÉ ņ׳ļŖö ņŻ╝ņĀ£ņÖĆ ņ╣┤ļō£ņŚÉ ļŖÉļéīņŚÉņä£ ļŗżņ¢æĒĢśĻ▓ī ļéśļź╝ Ēæ£ĒśäĒĢśĻ│Ā ļŖÉĻ╝łļŹś Ļ▓āļōżņØä Ēæ£ĒśäĒĢ┤ ļ│╝ ņłś ņ׳ņ¢┤ņä£ ņóŗņĢśņ¢┤ņÜö. (D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ĢäĻ╣īļÅä ļ¦ÉĒ¢łļŖöļŹ░ ĻĘĖļĢīĻ╣īņ¦Ć ļŗż ļ¼┤ĻĖ░ļĀźĒĢśĻ▓ī Ē¢łļŖöļŹ░ ņŗ£Ļ░üĒÖöĒĢśļŖö Ļ│╝ņĀĢņŚÉņä£ ļ¦ÄņØĆ ļģĖļĀźņØä ĒĢ┤ņä£ ņĀĆļÅä ņŚ┤ņĀĢņĀüņØĖ ņé¼ļ×īņ×äņØä Ļ╣©ļŗ½Ļ▓ī ļÉÉĻ│Ā ĻĘĖļ”¼Ļ│Ā ļ»ĖņĢäņÖĆ ņäĖļ░öņŖżņ░¼ņØä ļ│┤ļ®┤ņä£ Ļ┐łņØä ņ░ŠĻ│Ā ņŗČļŗżļŖö ņāØĻ░üņØä Ē¢łĻ│Ā.ŃĆĆ(E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Ļ┐łņŚÉ ļīĆĒĢ┤ņä£ļŖö ņØ┤ļĢīļŖö 1ĒĢÖļģäņØ┤Ļ│Ā ĒĢ┤ņä£ ļö▒Ē׳ Ļ┐łņŚÉ ļīĆĒĢ┤ņä£ ņŚ┤ņĀĢņĀüņ£╝ļĪ£ ņāØĻ░üĒĢśņ¦ä ņĢŖņĢśļŖöļŹ░ ļØ╝ļØ╝ļØ╝ļ×£ļō£ ļ│┤ļ®┤ņä£ ņØ┤ņĀ£ ņ¦äņ¦£ Ļ│äĒÜŹ ņóĆ Ļ│äĒÜŹļÅä ĒĢśĻ│Ā ņ£ĀņĢä ĻĄÉņé¼Ļ░Ć ļÉśĻĖ░ ņ£äĒĢ┤ņä£ ņŚ┤ņŗ¼Ē׳ ņé┤ņĢäņĢ╝Ļ▓ĀļŗżļØ╝ļŖö ņāØĻ░üņØä Ē¢łņŖĄļŗłļŗż. (A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ĒĢÖņāØļōżņØĆ ņŗ£Ļ░üĒÖö ņśłņłĀ Ļ▓ĮĒŚśņØ┤ ņØ┤ņä▒(ńÉåµĆ¦), Ļ░ØĻ┤Ćņä▒, ĒĢ®ļ”¼ņä▒ņØä ņżæņÜöĒĢśĻ▓ī ņāØĻ░üĒĢśļŖö ĻĖ░ņĪ┤ņØś ņ¦ĆņŗØļ│┤ļŗż Ļ░ÉņĀĢņØä Ēæ£ĒśäĒĢśĻ│Ā ņØ┤ĒĢ┤ĒĢśļŖö ļŹ░ ļÅäņøĆņØ┤ ļÉśņŚłļŗżĻ│Ā ĒĢśņśĆļŗż. ĻĘ╝ļīĆņŚÉļŖö ņØ┤ņä▒Ļ│╝ Ļ░Éņä▒, ņĀĢņŗĀĻ│╝ ļ¬ĖņØ┤ļØ╝ļŖö ļŹ░ņ╣┤ļź┤ĒŖĖņØś ņØ┤ļČäļ▓ĢņĀüņØĖ ņé¼Ļ│Ā ļ░®ņŗØņØä ĒåĄĒĢ┤(ņØ┤ņóģņøÉ, ņØ┤Ļ▓Įņ¦ä, 2016: 150) ņé¼Ļ│Ā, ņØ┤ņä▒, ņĀĢņŗĀ ļō▒ņØä ņÜ░ņäĀņŗ£ĒĢśļ®┤ņä£ ņĀĢņä£ņÖĆ ņśżĻ░ÉņØä ļŖÉļü╝Ļ│Ā Ēæ£ĒśäĒĢśļŖö Ļ▓āņØĆ ļČłĒĢäņÜöĒĢśļŗżĻ│Ā ņāØĻ░üĒĢśņśĆļŗż. A ĒĢÖņāØņØĆ ŌĆśļŗżļźĖ ņłśņŚģņØĆ ĻĘĖļāź ņ▒ģļ¦ī ļ│┤ļŖöļŹ░ ļ░śĒĢ┤, ņŗ£Ļ░üĒÖö Ļ│╝ņĀĢņØĆ ņé¼ņ£Āļ┐Éļ¦ī ņĢäļŗłļØ╝ ĒÖ£ļÅÖņĀüņØĖ Ļ▓ĮĒŚśņØä ĒĢĀ ņłś ņ׳ņ¢┤ņä£ ņóŗņĢśļŗżŌĆÖĻ│Ā ļŗĄĒ¢łļŗż. ņØ┤ļ¤¼ĒĢ£ ņłśņŚģņØĆ ņØĄņłÖĒĢśņ¦Ć ņĢŖļŖö ņłśņŚģņØ┤ļØ╝ļŖö A ĒĢÖņāØņØś ļ¦Éņ▓śļ¤╝ ņÜ░ļ”¼ļŖö ņśłņłĀņØä Ļ▓ĮĒŚśĒĢśļŖö ņłśņŚģņŚÉņä£ ļ░░ņÜ░ļŖö ņ¦ĆņŗØņØś ļ▓öņ£äļź╝ ļŗ©ņ¦Ć ņśżĻ░É, ņĀĢņä£ļĪ£ ĒĢ£ņĀĢĒĢ┤ ņÖöļŗż.
ĻĘĖļ¤¼ļéś ļ░Ģņ▓ĀĒÖŹ(2011: 82-95)ņØĆ ļōĆņØ┤ņØś ŃĆÄĻ▓ĮĒŚśņ£╝ļĪ£ņä£ņØś ņśłņłĀŃĆÅņŚÉ ļīĆĒĢ£ ņØ┤ĒĢ┤ļź╝ ĒåĀļīĆļĪ£ ļ»Ė(ńŠÄ)ļ│┤ļŗż ļŹö ļäōņØĆ ņØśļ»ĖļĪ£ ņśłņłĀņØś ņŚŁĒĢĀņØä ņäżļ¬ģĒĢśļ®┤ņä£ ļ│Ė ņłśņŚģņŚÉ ņŗ£ņé¼ņĀÉņØä ņĀäĒĢ┤ņŻ╝Ļ│Ā ņ׳ļŗż. ļōĆņØ┤ņØś ŃĆÄĻ▓ĮĒŚśņ£╝ļĪ£ņä£ņØś ņśłņłĀŃĆÅņŚÉņä£ ŌĆśĻ▓ĮĒŚśŌĆÖņØĆ ŌĆśĒĢśļéśņØś Ļ▓ĮĒŚśŌĆÖņ£╝ļĪ£ ņäżļ¬ģĒĢĀ ņłś ņ׳ļŗż. Ļ▓ĮĒŚśņØĆ ĒĢśļéśņØś ņāüĒÖ®ņØ┤ļØ╝ Ēæ£ĒśäĒĢĀ ņłś ņ׳ņ£╝ļ®░, ņØ┤ ļĢī ŌĆ£ņ¦łņä▒ņĀü ņé¼Ļ│ĀŌĆØĻ░Ć ļ░£ņāØĒĢ£ļŗż. ŌĆ£ņ¦łņä▒ņĀü ņé¼Ļ│ĀŌĆØļŖö Ļ░ÉĻ░üņĀü ņÜöņåīņŚÉ ņØśĒĢ┤ ņ¦ĆĻ░ü(perception)ĒĢśļŖö ŌĆśĻ░ÉŌĆÖ, ŌĆśļŖÉļéīŌĆÖņØ┤ļŗż. ŌĆ£ņ¦łņä▒ņĀü ņé¼Ļ│ĀŌĆØļŖö ņ¦ĆņĀü ņé¼Ļ│ĀņØś ĒåĄĒĢ®ņØä ĒåĄĒĢ┤ ņÖäĻ▓░ņĀüņØĖ ņ¦ĆņŗØņØä ļ░£ņāØņŗ£Ēéżļ®░, ņØ┤ņä▒Ļ│╝ Ļ░Éņä▒ņØ┤ ĒĢ©Ļ╗ś ņĪ┤ņ×¼ĒĢ©ņØä ņäżļ¬ģĒĢśņśĆļŗż. ņØĖĻ░äņØ┤ Ļ░ÉĻ░üņØä ļ░øņĢäļōżņØ┤ļ®┤ņä£ ņØĖņ¦ĆļÉśļŖö ņ¦ĆĻ░üņØĆ Ļ│╝Ļ▒░ņØś ņŗĀļģÉņ▓śļ¤╝ ļćīņØś ņ×æņÜ®ņŚÉ Ēś╝ļ×ĆņØä ņØ╝ņ£╝ĒéżļŖö Ļ▓āņØ┤ ņĢäļŗłļØ╝, ņ¦ĆņĀü ņé¼Ļ│ĀņÖĆ ĒĢ©Ļ╗ś ņØśļ»Ė ņ׳ļŖö ņé¼Ļ│ĀņØś Ļ│╝ņĀĢņØä ĒśĢņä▒ĒĢ£ļŗż. ņØ┤ļĀćļō» ļ│Ė ņłśņŚģņØĆ ļōĆņØ┤Ļ░Ć ļ¦ÉĒĢśļŖö ŃĆÄĻ▓ĮĒŚśņ£╝ļĪ£ņä£ņØś ņśłņłĀŃĆÅĻ│╝ Ļ░ÖņØ┤ ņóģĒĢ®ņĀüņØ┤Ļ│Ā ņ┤Øņ▓┤ņĀüņØĖ ņ¦ĆņŗØņØś ņØśļ»Ėļź╝ Ļ░Ćņ¦ĆĻ│Ā ņ׳ļŗż. ņ”ē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ņśłņłĀ Ļ▓ĮĒŚśņØä ĒĢśļ®┤ņä£ ĒĢÖņāØļōżņØĆ ņØ┤ņä▒Ļ│╝ Ļ░Éņä▒ņØś ĒåĄĒĢ®ņØä Ļ▓ĮĒŚśĒĢśņśĆļŗż. Ļ│¦ ņóģĒĢ®ņĀüņØĖ ņ¦ĆņŗØņØä ļ░øņĢäļōżņØĖ ĒĢÖņāØļōżņØĆ ņØĖĻ░ä ļé┤ļ®┤ņØś ņä▒ņןņ£╝ļĪ£ ņØ┤ņ¢┤ņ¦Ćļ®░ ņØĖĻ░äņØś Ļ░Ćņ╣śļź╝ ņāüņŖ╣ņŗ£ņ╝£ ļéśĻ░ĆĻ│Ā ņ׳ņŚłļŗż.
ļŗżļźĖ ņłśņŚģņØĆ ņØ┤ņĀ£ ĻĘĖļāź ņ▒ģ ļ│┤ļ®┤ņä£ Ļ│ĄļČĆĒĢśļŖö ĻĘĖļ¤░ ņłśņŚģņØ┤ ļīĆļČĆļČäņØĖļŹ░ ņÜöņ”śņØĆ ņØ┤ļĀćĻ▓ī ļ¦īļōżļ®┤ņä£ ĒĢśļŗłĻ╣ī ļŹö ĒÖ£ļÅÖņĀüņØ┤ņ¢┤ņä£ ņóŗņĢśĻ│Ā ņāØĻ░üņØä ņóĆ ļ¦ÄņØ┤ ĒĢĀ ņłś ņ׳ņ¢┤ņä£ ņóŗņĢśļŹś Ļ▓ā Ļ░ÖņĢäņÜö. (A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żæļץ) ņØ┤ ņŗ£Ļ░üĒÖö ņ×ÉļŻīļź╝ ļ¦īļōżļ®┤ņä£ ĻĘĖļלņä£ ņĢĮĻ░ä ņ╣£ĻĄ¼ļōżņØ┤ ļ│┤ļŖö ņĀĆņØś ņä▒Ļ▓®ņØ┤ļéś ņןņĀÉņØ┤ļéś ņØ┤ņĀ£ ņĀ£Ļ░Ć ņāØĻ░üĒĢśļŖö ņĀ£Ļ░Ć ņé┤ņĢäĻ░Ćļ®┤ņä£ ņżæņÜöĒĢśĻ▓ī ņāØĻ░üĒĢśļŖö Ļ░ÉņĀĢņØ┤ļéś ĻĘĖļ¤░ Ļ░ÉņĀĢļōż Ļ░ÖņØĆ Ļ▒░ ņ£äņŻ╝ļĪ£ Ēæ£ĒśäņØä Ē¢łļŹś Ļ▓ā Ļ░ÖņĢäņÜö. (C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Ā£Ļ░Ć ņØ┤ļ▓ł ĒÖ£ļÅÖņØä ĒĢśļ®┤ņä£ ņóŗņĢśļŹś ņĀÉņØĆ ņśüĒÖö ļØ╝ļØ╝ļ×£ļō£ļź╝ ļ│┤Ļ│Ā ņŚ¼ļ¤¼ Ļ░Ćņ¦Ć ņ╣┤ļō£ņŚÉ ņ׳ļŖö ņŻ╝ņĀ£ņÖĆ ņ╣┤ļō£ņŚÉ ļŖÉļéīņŚÉņä£ ļŗżņ¢æĒĢśĻ▓ī ļéśļź╝ Ēæ£ĒśäĒĢśĻ│Ā ļŖÉĻ╝łļŹś Ļ▓āļōżņØä Ēæ£ĒśäĒĢ┤ ļ│╝ ņłś ņ׳ņ¢┤ņä£ ņóŗņĢśļŹś Ļ▓ā Ļ░ÖņŖĄļŗłļŗż. (D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ļśÉĒĢ£ ĒĢÖņāØļōżņØĆ ņāüļīĆņĀüņØĖ ņ¦ĆņŗØņŚÉ ļīĆĒĢ┤ ņāØĻ░üĒĢśņśĆļŗż. ņĀÉņ░© ļīĆļ®┤ ņłśņŚģņ£╝ļĪ£ ņĀäĒÖśļÉśļ®┤ņä£ ĒĢÖņāØļōżņØĆ ļÅÖļŻīļōżĻ│╝ ļ¦īļéśĻĖ░ļÅä ĒĢśĻ│Ā ņ×æĒÆłņŚÉ ļīĆĒĢ┤ņä£ ņØśļģ╝ĒĢśļ®┤ņä£ ņä£ļĪ£ņŚÉ ļīĆĒĢ┤ ņĢīņĢäĻ░ĆļŖö Ļ│╝ņĀĢņØä Ļ▒░ņ│ż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ņä£ļĪ£ ņØĖĻ░äņĀüņ£╝ļĪ£ ņ╣£ĒĢ┤ņ¦ĆĻ│Ā ņ׳ņŚłĻ│Ā, ņØśĻ▓¼ņØä ļōżņ£╝ļ®┤ņä£ ņä£ļĪ£ņØś ņ×æĒÆłņŚÉ ņśüĒ¢źņØä ņŻ╝Ļ│Ā ņ׳ņŚłļŗż. ļÅÖļŻīļōżĻ│╝ņØś ņāüĒśĖņ×æņÜ®ņØĆ ļ╣äĻĄÉļź╝ ĒåĄĒĢ£ Ļ▓Įņ¤ü Ļ┤ĆĻ│äĻ░Ć ņĢäļŗłņŚłļŗż. ĻĘĖĻ▓āņØĆ ļéśņÖĆ ĒāĆņØĖņØś ņāØĻ░üņØ┤ ļŗżļź╝ ņłś ņ׳Ļ│Ā, ņØ┤ļź╝ Ēæ£ĒśäĒĢśļŖö ļ░®ļ▓Ģ ļśÉĒĢ£ ļŗżļ”äņØä ņĢīņĢäĻ░ĆļŖö Ļ│╝ņĀĢņŚÉ ņ׳ņŚłļŗż. ĻĘĖļōżņØĆ ĻĘĖ Ļ▓ĮĒŚś ņåŹņŚÉņä£ ļÅģņ░ĮņĀüņØ┤Ļ│Ā Ļ░£ņØĖņĀüņ£╝ļĪ£ ļ¦īļōżņ¢┤ņ¦ä ņ¦ĆņŗØļ┐Éļ¦ī ņĢäļŗłļØ╝, ļÅÖļŻīļōżņØ┤ Ļ│ĀņĢłĒĢ£ ņāüļīĆņĀüņØĖ ņ¦ĆņŗØĻ│╝ ņ×æĒÆłņØä Ļ╣©ļŗ½Ļ│Ā ņä£ļĪ£ņŚÉĻ▓ī Ēæ£ĒśäĒĢĀ ņłś ņ׳ņŚłļŗż. ņāüļīĆņĀüņØĖ ņ¦ĆņŗØņØ┤ļ×Ć ņĀłļīĆņä▒ņŚÉ Ļ░Ćņ╣śļź╝ ļæö ņ¦ĆņŗØņØ┤ ņĢäļŗłļØ╝, ļŗżņ¢æĒĢ£ ļÅÖļŻīļōżņØś Ļ┤ĆņĀÉņØä ĒåĄĒĢ£ ĒĢ┤ņäØĻ│╝ ļÅģņ░Įņä▒ņØä ļ¬©ļæÉ Ēæ£ĒśäĒĢśĻ│Ā ļ░øņĢäļōżņŚ¼ņ¦ĆĻĖ░ ļĢīļ¼ĖņŚÉ ĒÆŹļČĆĒĢ£ ņ¦Ćņä▒ņØś ĒÖĢņןņØä ļ│┤ņŚ¼ņŻ╝ļŖö ņ¦ĆņŗØņØ┤ļŗż(ņØ┤ņóģņøÉ, ņØ┤Ļ▓Įņ¦ä, 2016: 157).
ĒĢÖņāØļōż ņä£ļĪ£ņØś ņ×æĒÆłņŚÉ ļīĆĒĢ£ Ļ░£ļ░®ņä▒ņØ┤ ļ│┤ņŚ¼ņŻ╝ļŖö ņ£ĀņŚ░ĒĢ©ņØĆ ĒÖĢņןņĀü ņé¼Ļ│ĀņÖĆ ņłśļĀ┤ņĀü ņé¼Ļ│Āļź╝ ņ¦ĆņåŹņĀüņ£╝ļĪ£ ĒĢĀ ņłś ņ׳ļÅäļĪØ ļÅäņÖĆņŻ╝ņŚłļŗż. ņØ┤ ņ¦ĆņŗØņØĆ ĒāĆņØĖĻ│╝ ĒĢ©Ļ╗ś ĒĢśĻĖ░ ļĢīļ¼ĖņŚÉ ĒĢ£Ļ░Ćņ¦ĆļĪ£ Ļ│ĀņĀĢļÉśņ¢┤ ņ׳ļŖö ņØśļ»Ėļź╝ ņāØĻ░üĒĢśņ¦Ć ņĢŖņĢśļŗż(ņØ┤ņóģņøÉ, ņØ┤Ļ▓Įņ¦ä, 2016: 157-158). ņØ┤ņ▓śļ¤╝ ĒĢÖņāØļōżņØś ļÅÖļŻīņÖĆņØś ņåīĒåĄņØś Ļ│╝ņĀĢ, ņ”ē ļīĆĒÖöņØś Ļ│╝ņĀĢņØĆ ļŗżņ¢æņä▒ņØä ņĢīņĢäņ░©ļ”¼Ļ│Ā ļŗżļź┤ļŗżļŖö Ļ▓ā(difference)ņŚÉ ļīĆĒĢ┤ņä£ ņāØĻ░üĒĢśļÅäļĪØ ĒĢ£ļŗż. ņ£żņ×¼ĒÖŹ(2000: 178)ņØĆ ļŗżļź┤ļŗżļŖö Ļ▓āņØĆ Ļ┤ĆĻ│äļź╝ ņØĖņĀĢĒĢśļŖö Ļ▓ā ņ”ē, ļŗżļźĖ ņØ┤ļōżĻ│╝ņØś Ļ┤ĆĻ│ä ņé¼ņØ┤ņŚÉņä£ ĻĘĖļōżņØś ņĀĢņ▓┤ņä▒(identity)ļź╝ ņāüņĀĢĒĢśĻ│Ā ņ׳ļŖö Ļ░£ļģÉņØ┤ļØ╝Ļ│Ā ĒĢśņśĆļŗż. ļÅÖļŻīļōżĻ│╝ņØś Ļ┤ĆĻ│ä ņåŹņŚÉņä£ ņä£ļĪ£ņØś ņĀĢņ▓┤ņä▒(identity)ļź╝ ņĢīņĢäĻ░äļŗżļŖö Ļ▓āņØĆ ņä£ļĪ£ņŚÉĻ▓ī ļīĆĒÖöļĪ£ņØś ņĀäĒÖśņØä Ļ░ĆņĀĖņś¼ ņłś ņ׳ņØīņØä ņĀäņĀ£ĒĢ£ļŗż. ļŗżļ”äņØä ļīĆĒÖöĒĢ£ļŗżļŖö Ļ▓āņØĆ ņ×ÉņŗĀņØś Ļ▓āņØ┤ļéś ĒāĆņØĖņØś Ļ▓āņØä ņś©ņĀäĒ׳ ņĢīņĢäĻ░ĆĻĖ░ ņ£äĒĢ©ņØ┤ļØ╝Ļ│Ā ĒĢśņśĆļŗż. ņ£żņ×¼ĒÖŹņØś ņØśĻ▓¼ņ▓śļ¤╝ ĒĢÖņāØļōżņØĆ ņä£ļĪ£ ņ×ÉņŗĀņŚÉ ļīĆĒĢ┤, ņ×ÉņŗĀņØś ņ×æĒÆłņŚÉ ļīĆĒĢ┤ ņØ┤ņĢ╝ĻĖ░ ĒĢśļ®┤ņä£ ļŗżļ”äņØä ņāØĻ░üĒĢśĻ│Ā ņ׳ņŚłļŗż.
ņĢäļ¼┤ļלļÅä ĻĘĖ ņŗ£Ļ░üĒÖöĒĢśļŖö Ļ│╝ņĀĢņØ┤ ļØ╝ļØ╝ļ×£ļō£ņØś ļé┤ņÜ®ņØä ņō░ļŖö Ļ▓āļÅä ņ׳ņ¦Ćļ¦ī ņĀ£ ņ×ÉņŗĀņØä Ēæ£ĒśäĒĢśļŖö ļé┤ņÜ®ļÅä ņ׳Ļ│Ā ņĀ£ ņ╣£ĻĄ¼ļź╝ Ēæ£ĒśäņØä ĒĢśļŖö ļé┤ņÜ®ļÅä ņ׳ņ¢┤ņä£ ņ╣£ĻĄ¼ļōżĻ│╝ ļ¦ÄņØĆ ņŚ░ļØĮņØä Ē¢łļŹś Ļ▓ā Ļ░ÖņĢäņÜö. ņØ┤ Ļ│╝ņĀ£ļź╝ ĒĢśļ®┤ņä£ ĻĘĖļלņä£ ņØ┤ņĀ£ ņ╣£ĻĄ¼ļōżĻ│╝ ļŹö ļ¦ÄņØĆ ņŗ£Ļ░äņØä ļ│┤ļé╝ ņłś ņ׳Ļ│Ā ņĀ£ ņ×ÉņŗĀņŚÉ ļīĆĒĢ┤ ļ¦ÄņØ┤ ņāØĻ░üĒĢĀ ņłś ņ׳ļŖö ņŗ£Ļ░äņØ┤ ļÉśņ¢┤ņä£ ļÉśĻ▓ī ņåīņżæĒĢ£ ņŗ£Ļ░äņØ┤ļØ╝Ļ│Ā ņāØĻ░üņØä ĒĢ┤ņÜö. (C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ĻĄ¼ļōżļ¦łļŗż ļŗż Ļ░üņ×Éļ¦łļŗż ņāØĻ░üņØ┤ ņ׳Ļ│Ā ļŗż ļŗżļź┤Ļ▓ī Ēæ£ĒśäņØä ĒĢ┤ņä£ ņØ┤Ļ▒Ė ņØ┤ļĀćĻ▓ī ļéśĒāĆļé╝ ņłśļÅä ņ׳ĻĄ¼ļéś Ļ░ÉĒāäĒĢśļ®┤ņä£ ļ¦ÄņØ┤ ļ┤żĻ│Ā ļÉśĻ▓ī ņŗĀĻĖ░Ē¢łņ¢┤ņÜö. ĻĘĖ ņ╣£ĻĄ¼ļōż Ļ░üņ×ÉĻ░Ć Ļ░¢Ļ│Ā ņ׳ļŖö ņāØĻ░üņØä ņóĆ ļ│╝ ņłś ņ׳ņ¢┤ņä£ ĻĘĖĻ▓ī ņóŗņĢśņ¢┤ņÜö. (A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ĀĆļŖö ĻĄÉņłśļŗśņØ┤ ļéśļłĀņŻ╝ņŗĀ ĻĘĖ ņĄ£ņåīĒĢ£ņØś ņ╣┤ļō£ ņ¢æņŗØņŚÉļŗżĻ░Ć ļé┤Ļ░Ć ņ¦üņĀæ ņŗ£Ļ░üĒÖöĒĢĀ ņłś ņ׳ņŚłļŹś ņĀÉņØ┤ ņóŗņĢśĻ│Ā ļŗżļźĖ ņĢĀļōżņØ┤ ņŗ£Ļ░üĒÖöĒĢ£ ņ×æĒÆłņØä ļ│┤ļ®┤ņä£ ļé┤ Ļ▓āĻ│╝ ļ╣äĻĄÉĒ¢łļŹś Ļ▓ĮĒŚśņØ┤ ņóŗņĢśņ¢┤ņÜö. (B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ĀĆļŖö ņŗ£Ļ░üĒÖöĒĢśĻ│Ā ņ╣£ĻĄ¼ļōżĻ│╝ ņØ┤ļĀćĻ▓ī ņ×ÉĻĖ░Ļ░Ć ļ¦īļōĀ Ļ▓āļÅä ļ│┤ņŚ¼ņŻ╝Ļ│Ā ļé┤Ļ░Ć ļ¦īļōĀ Ļ▓āļÅä ļ│┤ņŚ¼ņŻ╝ļ®┤ņä£ ņāüĒśĖņ×æņÜ®ņØä Ē¢łņŚłļŖöļŹ░ņÜö. ņĀĆļŖö ņĀ£Ļ░Ć ļ¦īļōż ļĢīļŖö ļéś Ēś╝ņ×É ņāØĻ░üĒĢśĻ│Ā ļé┤Ļ░Ć ņ¦üņĀæ ļ¦īļōĀ Ļ▒░ņŚ¼ņä£ ņØ┤Ļ▓ī ņØ┤ ņŗ£Ļ░üĒÖöĒĢśļŖö Ļ▒░ņŚÉ ļéśļ¦ī ņóĆ ļŗ┤Ļ▓© ņ׳ļŗżĻ│Ā ņāØĻ░üĒ¢łņŚłļŖöļŹ░ ņāØĻ░ü ļüØļéśĻ│Ā ņāØĻ░üĒĢ┤ ļ│┤ļ®┤ ļ│┤ļŗłĻ╣ī ņ╣£ĻĄ¼ļōżĻ│╝ ņżæĻ░äņżæĻ░äņŚÉ ņ¢śĻĖ░ļÅä ĒĢśĻ│Ā ĒĢ£ Ļ▓āļōżļÅä ļ│┤ļ®┤ņä£ ļé┤ Ļ▒░ņŚÉļÅä ņśüĒ¢źņØä ļ»Ėņ│żļŗżļŖö Ļ▒Ė Ļ╣©ļŗ½Ļ│Ā ļéśļź╝ ļé┤ Ļ▓āņØä ļ¦īļō£ļŖö ļŹ░ļÅä ņĀĆļ▓łņŚÉļÅä Ēü░ ņśüĒ¢źņØä ļ░øļŖöļŗżļŖö Ļ▒Ė Ļ╣©ļŗ¼ņØĆ ļŹ░ ņØśļ»Ėļź╝ ļ░øņØĆ Ļ▓ā Ļ░ÖņŖĄļŗłļŗż. (B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ĒĢÖņāØļōżņØĆ ņ×ÉĻĖ░ ņ×ÉņŗĀņŚÉ ļīĆĒĢ£ ņØ┤ĒĢ┤Ļ░Ć Ē¢źņāüļÉśņŚłĻ│Ā ļśÉĒĢ£ ņ×ÉĻĖ░ ņ×ÉņŗĀņŚÉ ļīĆĒĢ£ ņĪ┤ņżæņØä ĒĢśĻ▓ī ļÉśļŖö ļ│ĆĒÖöļź╝ Ļ▓¬ņŚłļŗż. ņØ┤ ņśłņłĀ Ļ▓ĮĒŚśņØä ĒåĄĒĢ┤ ĒĢÖņāØļōżņØĆ ņŖżņŖżļĪ£ņÖĆ Ļ╣ŖĻ▓ī ļ¦īļéĀ ņłś ņ׳ņŚł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ņ×ÉņŗĀļōżņØś ņØ┤ĒĢ┤ļź╝ ĒÖĢņןņŗ£ĒéżĻ│Ā, ĒāĆņØĖĻ│╝ ņäĖņāüņ£╝ļĪ£ ļéśņĢäĻ░ł ņłś ņ׳ļŖö ĒלņØä ĻĖ░ļź┤ļ®░(ņĄ£ņ¦ä, Ļ│ĮļŹĢņŻ╝, 2015: 132- 133) ņŖżņŖżļĪ£ ņ×ÉĻĖ░ ņ×ÉņŗĀņØä ņ¦Ćņ¦ĆĒĢśĻ│Ā ņ׳ņŚł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ŌĆśņśøļéĀņŚÉļŖö ļö▒Ē׳ ļ¼┤ņŚćņØä Ē¢łļŖöņ¦Ćļź╝ ņāØĻ░üĒĢ£ ņĀüļÅä ņŚåņØ┤ ņ¦ĆļéĖ ņĀüņØ┤ ļ¦ÄņØ┤ ņ׳ņŚłņ¦Ćļ¦īŌĆÖņØ┤ļØ╝ļŖö ļ¦ÉņØä ĒĢśņśĆļŗż. ņ¢┤ļ¢ż ĒĢÖņāØļōżņØĆ ņ×ÉņŗĀņØä ŌĆ£ļČĆņĀĢņĀüņØ┤Ļ▓ī ņāØĻ░üĒĢśļŖö ņé¼ļ×ī, ņÜöņ”ś ņĢĀļōżņŖżļ¤Įņ¦Ć ņĢŖĻ│Ā ņĢĮĻ░ä Ļ│ĀņĀĢņĀüņØĖ ņé¼ļ×īŌĆØņØ┤ļØ╝Ļ│Ā ņäżļ¬ģĒĢśĻĖ░ļÅä ĒĢśņśĆļŖöļŹ░, ņ×ÉņŗĀņŚÉ ļīĆĒĢ£ ļČĆņĀĢņĀüņØĖ ņāØĻ░üņØä ļ│ĆĒÖöĒĢ┤ ļéśĻ░ĆļŖö Ļ▓ĮĒŚśņØä ĒĢśĻ│Ā ņ׳ņŚłļŹś Ļ▓āņØ┤ļŗż. ņØ┤ļŖö ņ×ÉņŗĀņŚÉ ļīĆĒĢ£ ļČĆņĀĢņĀüņØĖ ņāØĻ░üņ£╝ļĪ£ļČĆĒä░ ĻĖŹņĀĢņĀüņØĖ ņāØĻ░üņ£╝ļĪ£ņØś ļ│ĆĒÖöļź╝ Ļ▓ĮĒŚśĒĢśņśĆņØä ļ┐Éļ¦ī ņĢäļŗłļØ╝, ņ×ÉņŗĀ ņŖżņŖżļĪ£ņŚÉ ļīĆĒĢ£ ņØ┤ĒĢ┤ļÅäĻ░Ć ļåÆņĢäņ¦ĆĻĖ░ ņŗ£ņ×æĒĢ£ Ļ▓āņØ┤ļŗż.
ņŗ£Ļ░üņĀüņ£╝ļĪ£ Ēæ£ĒśäņØä ĒĢśļ®┤ņä£ ņØ╝ļŗ© ņĀĆļŖö ņĀ£ ņ×ÉņŗĀņØ┤ ņØ╝ļŗ© ĒÖöļÅä ļÉśĻ▓ī ļ¦ÄļŗżĻ│Ā ņāØĻ░üņØä Ē¢łĻ│Ā ņĢĮĻ░ä ļ¬©ļōĀ ņ¢┤ļ¢ż ņØ╝ņŚÉ ļīĆĒĢ┤ņä£ ļŁöĻ░Ć ļČĆņĀĢņĀüņØ┤Ļ▓ī ņóĆ ņāØĻ░üĒĢśļŖö ņé¼ļ×īņØĖ ņżä ņĢīņĢśļŖöļŹ░ ņØ┤ņĀ£ ņ╣£ĻĄ¼ļōżņØ┤ ļ¦ÉĒĢśļŖö ņĀ£ ļ¬©ņŖĄņØĆ ņĀ£Ļ░Ć ņāØĻ░üĒĢśļŖö Ļ▓āļ│┤ļŗż ļÉśĻ▓ī ĻĖŹņĀĢņĀüņØ┤ņŚłĻ│Ā ĒÖöĻ░Ć ĻĘĖļĀćĻ▓ī ļ¦Äņ¦Ć ņĢŖļŗżļØ╝ļŖö Ļ▓āņØä ņĢīĻ▓ī ļÉÉļŹś Ļ▒░ Ļ░ÖņĢäņÜö.ŌĆ” ĻĘĖļāź ņĀ£Ļ░Ć ļé┤Ļ░Ć ļéśļź╝ ņāØĻ░üĒĢśļŖö Ļ▓āļ│┤ļŗż ņĢĮĻ░ä ļé©ļōżņŚÉĻ▓ī ņ¢┤ņ®īļ®┤ ņóŗņØĆ ņé¼ļ×īņØ╝ ņłśļÅä ņ׳Ļ▓ĀļŗżļØ╝ļŖö ņāØĻ░üņØä ĒĢśĻ▓ī ļÉÉļŹś Ļ▓ā Ļ░ÖņĢäņÜö. (C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Ø┤ ņŗ£Ļ░üĒÖöļź╝ ĒåĄĒĢ┤ņä£ ļé┤Ļ░Ć ņóŗņĢäĒĢśļŖö Ļ▓āļōżņØ┤ ņĪ░ĻĖł ņÜöņ”ś ņĢĀļōżņŖżļ¤Įņ¦Ć ņĢŖĻ│Ā ņĢĮĻ░ä Ļ│ĀņĀĢņĀüņØ┤ļŗż. ļØ╝ļŖö ņāØĻ░üņØ┤ ļōżĻ▓ī ļÉÉĻ│Ā ņØ┤Ļ▓ī ņ¢┤ļ”┤ ļĢīļČĆĒä░ ņŻĮ ņØ┤ņ¢┤ņĀĖņÖöļŹś ņāØĻ░üņØä ĒĢśļ®┤ņä£ ļéśļŖö ļé┤Ļ░Ć ņóŗņĢäĒĢśļŖö Ļ▓āņŚÉ ņĢĮĻ░ä ĻĄ¼ņŗØņØ┤ ņ׳ņØäņ¦ĆļÅä ļ¬©ļź┤Ļ▓ĀļŗżļŖö ņāØĻ░üņØä Ē¢łņŖĄļŗłļŗż. (B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Ģäļ¼┤ļלļÅä ņ╣£ĻĄ¼ļōżĒĢ£Ēģī ņĀ£ ņןņĀÉņØ┤ļ×æ ņĀ£ ņä▒Ļ▓®ņØä ļōŻļŗż ļ│┤ļŗłĻ╣ī ņ╣£ĻĄ¼ļōżņØ┤ ļéśļź╝ ņØ┤ļĀćĻ▓ī ņāØĻ░üĒĢśĻ│Ā ņ׳ņŚłĻĄ¼ļéś ļØ╝ļŖö Ļ▒Ė ņĢīĻ▓ī ļÉśļŖö Ļ▓ī ņ×¼ļ»ĖļÅä ņ׳ņŚłĻ│Ā ņØ┤ņĀ£ ĻĘĖ ņŗ£Ļ░üĒÖö ņ×ÉļŻīļź╝ ļ¦īļōżņ¢┤ņä£ ņĀ£Ļ░Ć ņøÉļל ļŁÉ ĻŠĖļ»ĖļŖö Ļ▒░ ņØ┤ļ¤░ Ļ▒░ņŚÉ ļÉśĻ▓ī Ļ┤Ćņŗ¼ņØ┤ ņŚåņŚłļŖöļŹ░ ņØ┤ļ▓łņŚÉ ņØ┤ ņŗ£Ļ░üĒÖö ņ×ÉļŻīļź╝ ļ¦īļōżļ®┤ņä£ ĻĖĖņØä Ļ▒ĘļŗżĻ░ĆļÅä ņ¢┤ļ¢ż Ļ▓ī ļ│┤ļ®┤ ņØ┤Ļ▒░ļŖö ņØ┤Ļ▒░ļź╝ ņ¢┤ļ¢╗Ļ▓ī ĒĢ┤ņä£ ļ¦īļōżņ¢┤ ļ│┤ļŖö Ļ▒┤ ņ¢┤ļ¢©Ļ╣ī ņØ┤ļ¤░ ņāØĻ░üļÅä ņ×ÉņŻ╝ ļéśļ®┤ņä£ ņĢĮĻ░ä ĻĘĖļ¤░ ĻŠĖļ»ĖļŖö ņ×¼ļ»Ėļź╝ ļŖÉĻ╝łļŹś Ļ▓ā Ļ░ÖņĢäņÜö. (C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ņśłņłĀ Ļ▓ĮĒŚśņØĆ ĒĢÖņāØļōż ņŖżņŖżļĪ£ļź╝ ņĢīņĢäĻ░ĆļŖö Ļ▓āņŚÉ ĻĘĖņ╣śņ¦Ć ņĢŖĻ│Ā ĒāĆņØĖņŚÉ ļīĆĒĢ£ ņØ┤ĒĢ┤, ĒÖśĻ▓ĮņŚÉ ļīĆĒĢ£ ņØ┤ĒĢ┤ļź╝ ņżæņŗ¼ņ£╝ļĪ£ ĒāÉĻĄ¼ĒĢśĻ│Ā Ēæ£ĒśäĒĢśņśĆļŖöļŹ░, ĻĘĖĻ▓āņØĆ Ļ│¦ ņéČņØś ļ¬©ņŖĄņØ┤ņŚłļŗż. ņ×æĒÆłņØ┤ ņÖäņä▒ļÉ£ ļ¬©ņŖĄņØä ļ│┤ņĢśņØä ļĢī, ĒĢÖņāØļōżņØĆ ņéČņØ┤ Ēś╝ņ×Éļ¦īņØś ņāØĻ░üņØ┤ļéś Ļ░ÉņĀĢļ¦īņ£╝ļĪ£ Ļ▓░ņĀĢļÉśņ¦Ć ņĢŖļŖöļŗżļŖö ņé¼ņŗżņØä ņĢīņĢśĻ│Ā, ĻĘĖļōżņØä ņé¼ļ×æĒĢśļŖö ņé¼ļ×īļōżĻ│╝ ĒÖśĻ▓Į ļō▒ņØś ņśüĒ¢źļōżļĪ£ ņĢäļ”äļŗĄĻ▓ī ņ×Éļ×ä ņłś ņ׳ņŚłļŗżļŖö ņé¼ņŗżņØä ņĢīņĢśļŗż. ĻĘĖļ”¼Ļ│Ā ņØ┤ ņłśņŚģņŚÉņä£ņØś ņśłņłĀ Ļ│╝ņĀĢņØ┤ ņéČņŚÉ ļ¦ÄņØĆ ņŚ░Ļ▓░Ļ│Āļ”¼ņÖĆ ļÅäņøĆņØ┤ ļÉ£ļŗżļŖö ņé¼ņŗżņØä ņĢīĻ│Ā ņ׳ņŚł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ŌĆśņéČņŚÉ ļÅäņøĆņØ┤ ļÉśņŚłļŗżŌĆÖļŖö ņØ┤ņĢ╝ĻĖ░ļź╝ ĒĢśņśĆļŗż. ņØ┤ļŖö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Ļ│╝ņĀĢņØĆ ņåÉņ×¼ņŻ╝ļĪ£ņä£ņØś ņ×æĒÆł ļ¦īļōżĻĖ░Ļ░Ć ņĢäļŗłļØ╝, ĻĘĖļōżņØ┤ ņ¦ĆĻĖłĻ╣īņ¦Ć ļŖÉĻ╗┤ņś© ņ×ÉņŗĀļōżņØś ņéČņŚÉņä£ ņ░ŠņĢäņś© Ļ╣ŖņØĆ ĒåĄņ░░ņØ┤ Ēæ£ĒśäļÉ£ ĻĘĖ ņØśļ»Ė ņØ┤ņāüņØś ņśłņłĀņØ┤ņŚłļŗż. ņĢ×ņ£╝ļĪ£ ĒĢÖņāØļōżņØĆ ņśüĒÖöļź╝ ĒåĄĒĢ┤ Ļ╣©ļŗ¼ņØĆ ņĀÉļōżņØä ļ│┤ļŗż ņ×ÉņŗĀņØś ņéČņŚÉņä£ ņŗżņ▓£ĒĢśļ®░ ņé┤ļ®┤ņä£ ĻĘĖļōżņØś ņéČņØä ļ│ĆĒÖöņŗ£ņ╝£ļéśĻ░ł ņłś ņ׳ņØä Ļ▓āņØ┤ļØ╝ ņāØĻ░üĒĢśņśĆļŗż. ņØ┤ļ¤¼ĒĢ£ ņéČņŚÉ ļīĆĒĢ£ ĻĖŹņĀĢņĀüņØĖ ņāØĻ░üņØ┤ļéś Ēā£ļÅäļŖö ĻĘĖļōżņØ┤ ļéśņĢäĻ░ĆļŖö ļ»Ėļלļź╝ ļŹöņÜ▒ļŹö ļ╣øļéśĻ▓ī ĒĢśĻ│Ā ņ׳ņŚłļŗż.
ĻĘĖļāź ļ░░ņÜ░Ļ│Ā ļ¦Éļ®┤ ĻĘĖ Ļ▒░ļź╝ ļŗżļźĖļŹ░ ņé¼ņÜ®ĒĢĀ ņłś ņŚåļŗż ĒĢ┤ņĢ╝ ĒĢśļéś. (E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ļØ╝ļØ╝ļ×£ļō£ļŖö Ļ┐łĻ│╝ ņŚ┤ņĀĢņØä ņĢīļĀżņŻ╝ņŚłļŹś ņśüĒÖöļØ╝Ļ│Ā ņāØĻ░üņØä ĒĢśļŖöļŹ░ ĻĘĖ ņśüĒÖö ļé┤ņÜ®ņØ┤ Ļ┐łņŚÉ ļīĆĒĢ┤ ņóīņĀłĒĢśļŖö Ļ▓āļČĆĒä░ ņ×ÉņŗĀņØ┤ ņ×ÉņŗĀņØś Ļ┐łļ│┤ļŗż ļé©ļōżņØ┤ ņøÉĒĢśļŖö Ļ▓āņØä ĒĢśļ®┤ņä£ ņé┤ņĢäĻ░ĆļŖö Ļ▓ā ĻĘĖļ”¼Ļ│Ā ĒĢśĻ│Ā ņŗČņØĆ Ļ▓āņØä ĒĢśļ®░ ņä▒Ļ│ĄņØä ĒĢśļŖö Ļ▓āĻ╣īņ¦ĆņØś ļ¬©ņŖĄņØä ņל ļŗ┤ņĢäļé┤ ņŻ╝ņ¢┤ņä£ ļÅäņøĆņØä ņŻ╝ņŚłļŗżĻ│Ā ņāØĻ░üĒĢ®ļŗłļŗż. (E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ØĖņāØņØä ņé┤ņĢäĻ░Ćļ®┤ņä£ ņóĆ ļÅäņøĆņØ┤ ļÉÉņŚłļŹś Ļ▓ā Ļ░ÖņĢäņÜö. ņØ┤ļĀćĻ▓ī ĒĢśļéśĒĢśļéśņö® ļŗż ļČäņäØĒĢśļ®┤ņä£ ņØĖņāØņØä ņé┤ņĢäĻ░Ćļ®┤ņä£ ņĀ£ ņ×ÉņŗĀĒĢ£Ēģī ņóĆ ĒĢäņÜöĒĢ£ Ļ▓āļōżņØä ņĀ£Ļ░Ć ņĢī ņłś ņ׳Ļ▓ī ļÉ£ Ļ▓ā Ļ░ÖņĢäņÜö. (A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ļØ╝ļØ╝ļ×£ļō£ ņśüĒÖöĻ░Ć ņØ┤ņĀ£ Ļ┐łņØä Ē¢źĒĢ┤ņä£ ļéśņĢäĻ░ĆļŖö ĻĘĖļ¤░ ļé┤ņÜ®ņØ┤ļŗłĻ╣ī. ņĀĆļÅä ĻĘĖ ņśüĒÖöļź╝ ļ│┤ļ®┤ņä£ ļÉśĻ▓ī ņŻ╝ņØĖĻ│ĄļōżņØś Ļ░ÉņĀĢņŚÉ ņØ┤ņ×ģĒĢ┤ņä£ ĻĘĖļĀćĻ▓ī ļ│┤ļ®┤ņä£ ņØ┤ņĀ£ Ēśäņŗż ņĀĆĒĢ£ĒģīļÅä ņØ┤ļĀćĻ▓ī ĒĢ┤ņä£. ņØ┤ņĀ£ ņĀĆļÅä ņŻ╝ņØĖĻ│Ąļōżņ▓śļ¤╝ Ļ┐łņØä Ē¢źĒĢ┤ņä£ ņŚ┤ņŗ¼Ē׳ ļéśņĢäĻ░Ćņ×ÉļŖö ĻĘĖļ¤░ ļŗżņ¦ÉņØä ĒĢĀ ņłś ņ׳Ļ▓ī ļÉśņŚłņ¢┤ņÜö. (A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Ļ▓░ĻĄŁ ņśłņłĀ Ļ▓ĮĒŚśņØĆ ņäĖņāüĻ│╝ņØś ņāüĒśĖņ×æņÜ®ņØä ĒåĄĒĢ┤ ĒĢÖņāØņØ┤ļØ╝ļŖö ņŻ╝ņ▓┤ņØś ņ׳ļŖö ĻĘĖļīĆļĪ£ņØś Ēæ£Ēśäņ£╝ļĪ£ ļ¦łļ¼┤ļ”¼ ņ¦Ćņ¢┤ņĪīļŗż. ņĀĢļŗĄņØ┤ ņŚåĻ│Ā ĒŗĆņØ┤ ņŚåļŖö Ļ│╝ņĀĢņŚÉņä£ ĻĘĖļōżļ¦īņØś ņŗ£Ļ░üņØä ļ¦īļōżĻ│Ā ļÅÖļŻīļōżņŚÉĻ▓ī ĻĘĖ Ļ│╝ņĀĢņØä ļ│┤ņŚ¼ņŻ╝ļŖö ņŗ£Ļ░äņØĆ ĻĘĖņĀĆ ļ©Ėļ¼╝ļ¤¼ ņ׳ļŖö ņŗ£Ļ░äņØ┤ ņĢäļŗłņŚłļŗż. ļæÉļĀżņøĀļŹś ņ×ÉņŗĀņØś ņäĖĻ│äņŚÉņä£ļČĆĒä░ ļéśņĢäĻ░Ć ĒāĆņØĖĻ│╝ ĒĢ©Ļ╗śĒĢśļŖö ņäĖĻ│äņŚÉņä£ ļ░░ņÜ░Ļ│Ā ņØĄĒśöņ£╝ļ®░, ĻĄÉņłśņ×ÉņØś ņØśļÅäņŚÉ Ļ▓Įņ▓ŁĒĢśļ®┤ņä£ ņä£ļĪ£ņŚÉĻ▓ī ņØśļ»Ėļź╝ ņĀäļŗ¼ĒĢ┤ ņŻ╝ņŚłļŗż. ĻĘĖĻ▓āņØĆ ļśÉ ļŗżļźĖ ņāłļĪ£ņÜ┤ ņ░ĮņĪ░(ÕēĄķĆĀ)ņśĆļŗż. ĻĘĖ Ļ▓░Ļ│╝ļ¼╝ņØĆ ĻĘĖ ļ¼┤ņŚćļ│┤ļŗżļÅä ļÅģņ░ĮņĀüņØ┤Ļ│Ā ļÅÖļŻīļéś ņłśņŚģ ņŗ£Ļ░äņŚÉ ņśüĒ¢źņØä ļ»Ėņ╣śļŖö Ļ▓āņØ┤ ļÉśņŚł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ņŖżņŖżļĪ£ ņ×ÉĻĖ░ ņ×ÉņŗĀņØä ļ░░ņÜĖ ņłś ņ׳ļÅäļĪØ ĒĢśļ®░ Ļ░Ćļź┤ņ╣Ā ņłś ņ׳ļÅäļĪØ ĒĢśļŖö ņÜ®ĻĖ░ļź╝ ļ│┤ņŚ¼ņŻ╝ņŚłļŗż(Ļ╣ĆņĀĢĒؼ, 2020: 71). ņāłļĪ£ņÜ┤ ņ░ĮņĪ░ļŖö ĒĢÖņāØļōżņØĆ ņ×æĒÆłņŚÉ ņØśļ»Ė ļČĆņŚ¼ļź╝ ĒĢśļ®┤ņä£ ĻĘĖļōżņØś ļ¦łņØī ņåŹņŚÉņä£ ņāØņä▒ļÉ£ ĒåĄĒĢ®ņĀüņØĖ ņéČņØś ļ¬©ņŖĄ, ĻĘĖļ”¼Ļ│Ā ĻĘĖļōżņØś ņśłņłĀņä▒ņØ┤ ļ│┤ņŚ¼ņŻ╝ļŖö ļÅģĒŖ╣ĒĢ©ņØä Ļ░ÖņØ┤ Ēæ£ĒśäĒĢśĻ│Ā ņ׳ņŚłļŗż. ņāłļĪ£ņøĆ ņ”ē, ņ░ĮņØśņä▒, ņ░ĮņĪ░ļŖö ņÜ░ļ”¼Ļ░Ć ņéČņØä ņé┤ņĢäĻ░Ćļ®┤ņä£ ņä▒ņĘ©ĒĢśĻ│Ā ņØ┤ļŻ©ņ¢┤ļé┤Ļ│ĀĒöł ņŗ£ļÅäņØ┤ļŗż. ĻĘĖļōżņØĆ ļÅäņĀäĒĢśĻ│Ā ņ׳ņŚłĻ│Ā ņ×ÉņŗĀņØś Ļ▒░ļōŁļéśļŖö ļ¬©ņŖĄņØä ļ¬Ėņåī Ļ▓ĮĒŚśĒĢśĻ│Ā ņ׳ņŚłļŗż.
ĻĘ╝ļŹ░ ņØ┤ļĀćĻ▓ī ĒĢśĻ▓ī ļÉśļ®┤ ņ░ĮņØśņä▒ļÅä ĻĖĖļ¤¼ņ¦ĆĻ│Ā ĻĘĖļāź ņĀĆņŚÉ ļīĆĒĢ┤ņä£ ĒĢ£ņĖĄ ļŹö ņāØĻ░üĒĢĀ ņłś ņ׳ļŖö ĻĖ░ĒÜīļź╝ Ļ░Ćņ¦ä Ļ▓ā Ļ░ÖņĢä Ļ░Ćņ¦ĆĻ│Ā ņóŗņĢśļŹś Ļ▒░ Ļ░ÖņĢäņÜö. (E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śüĒÖöņŚÉ ļīĆĒĢ┤ņä£ļ¦ī ņØ┤ņĢ╝ĻĖ░ļź╝ ĒĢśļŖö Ļ▓ī ņĢäļŗłļØ╝ ņØ╝ļŗ© ņĀĆņØś ņāØĻ░üņØä ļŗ┤ņĢäļé╝ ņłś ņ׳ļŖö Ļ▓░Ļ│╝ļ¼╝ņØ┤ ļéśņÖĆņä£ ļŹö ņóŗņĢśĻ│Ā ņ▓śņØīļČĆĒä░ ļüØĻ╣īņ¦Ć ņŻ╝ņĀ£ļŖö ņ¢┤ļŖÉ ņĀĢļÅä ņĀĢĒĢ┤ņĀĖ ņ׳ļŖöļŹ░ ņĀĢļŗĄņØ┤ ņŚåĻ│Ā ĒŗĆņØ┤ ņŚåņŚłĻ│Ā ĻĘĖļלņä£ ļ¬©ļæÉ ņĀ£Ļ░Ć ļŗż ņāØĻ░üĒĢśĻ│Ā Ļ│ĀņĢłĒĢ┤ļé┤Ļ│Ā ĒĢśļŖö Ļ▒░ļØ╝ņä£ ņ░ĮņØśņä▒ņØ┤ ņóĆ ņāØĻĖĖ ņłś ņ׳ņŚłļŹś Ļ▒░ Ļ░ÖļŗżĻ│Ā ņāØĻ░üņØä ĒĢśĻ│Ā ĻĘĖ ņŗ£Ļ░ä ļÅÖņĢłļ¦īņØ┤ļØ╝ļÅä ņĪ░ĻĖł ņŚ┤ņĀĢ ņ׳Ļ▓ī ņé┤ņĢäĻ░ä Ļ▒░ļØ╝ņä£ ņóŗņĢśļŹś Ļ▓ā Ļ░ÖņĢäņÜö. (E ĒĢÖņāØņØś ņØĖĒä░ļĘ░ ņżæ)
ņŗ£Ļ░üĒÖöņ¦Ćļź╝ ĒÖ£ņÜ®ĒĢ£ ņ░ĮņØśņĀü ņ×æĒÆłņØĆ ļŗżņØīĻ│╝ Ļ░Öļŗż. <Ēæ£ 2>, <Ēæ£ 3>ņØĆ ĒĢÖņāØļōżņØ┤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ļź╝ ņ¢┤ļ¢ĀĒĢ£ ņØśļ»Ėļź╝ Ļ░Ćņ¦ĆĻ│Ā ļ¦īļōżņŚłļŖöņ¦ĆĻ░Ć ņśłņŗ£ļĪ£ ļō£ļ¤¼ļéś ņ׳ļŗż. ĒĢÖņāØļōżņØ┤ Ēæ£ĒśäĒĢ£ ļ¬©ļōĀ ņŗ£Ļ░üĒÖöņ¦Ć ņśłņłĀ Ļ▓ĮĒŚśņØä ļ│┤ņŚ¼ņŻ╝ļŖö Ļ▓āņØ┤ ņĢäļŗłļØ╝, ņśłņŗ£ļĪ£ ļ│┤ņŚ¼ņŻ╝ņŚł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ņØ┤ ņłśņŚģņØä ĒåĄĒĢ┤ ĒāĆņØĖļōżņŚÉĻ▓īļŖö ņēĮĻ▓ī ļ│┤ņŚ¼ņŻ╝ņ¦Ć ņĢŖņĢśļŹś ņ×ÉņŗĀņØś ļ¬©ņŖĄņØä Ēæ£ĒśäĒĢśĻ│Āņ×É ĒĢśņśĆļŗż. ļśÉĒĢ£ ņ×ÉņŗĀņŚÉ ļīĆĒĢ£ Ēæ£ĒśäņØä ņĀ£ļīĆļĪ£ ĒĢśĻĖ░ ņ£äĒĢ┤ņä£ ļ¦ÄņØĆ ņāØĻ░üņØä ĒĢśņśĆņØīņØä ņĢī ņłś ņ׳ļŗż. ļ¦łņØīņŚÉņä£ņØś ņØśļ»ĖĒÖöĻ░Ć ņ¢┤ļ¢╗Ļ▓ī ņŗ£Ļ░üņĀüņ£╝ļĪ£ Ēæ£ĒśäļÉśņ¢┤ņ¦ĆļŖöņ¦Ćļź╝ ņĢī ņłś ņ׳ļŗż. ņØ┤ļ¤¼ĒĢ£ ņØśļ»ĖĒÖöņØś Ļ▓ĮĒŚśņØĆ ņ¦ĆĻĖłĻ╣īņ¦Ć ņ×ÉĻĖ░ļÅä ņל ļ¬░ļ×ÉļŹś ņ×ÉņŗĀĻ│╝ņØś ļīĆĒÖöņśĆļŗż. ņ×ÉņŗĀĻ│╝ņØś ļīĆĒÖöĻ░Ć ņ¢┤ļ¢╗Ļ▓ī ļŗżļźĖ ņé¼ļ×īļōżņŚÉĻ▓ī ņĀäļŗ¼ļÉśĻ▓ī ļÉśļŖöņ¦Ćļź╝ ņĢīņĢäĻ░ĆļŖö Ļ│╝ņĀĢņØ┤ņŚłļŗż. ņ×ÉņŗĀņØ┤ ļ¼┤ņŚćņØä ņóŗņĢäĒĢśĻ│Ā ņ×ÉņŗĀņØ┤ ņ¢┤ļ¢ĀĒĢ£ ņé¼ļ×īņØĖņ¦ĆņŚÉ ļīĆĒĢ£ ņĀĢņ▓┤ņä▒ņØä ņ░ŠĻ│Ā, ĒāĆņØĖņØś ļ¬©ņŖĄņØä ņĢīņĢäĻ░ĆļŖö Ļ│╝ņĀĢņ£╝ļĪ£ņä£ņØś ņ×æĒÆłļōżņØĆ ņ¦äņĀĢĒĢ£ ņśłņłĀ Ļ▓ĮĒŚśņ£╝ļĪ£ ļéśņĢäĻ░ĆĻ│Ā ņ׳ņŚłļŗż. ņØ┤ ņśłņłĀ ņ×æĒÆłņØĆ ĒĢÖņāØļōżņØś ņ░ĮņØśņä▒ņØä ļ│┤ņŚ¼ņŻ╝ļŖö Ļ▓āņØ┤ņŚłĻ│Ā, ĻĘĖļōżņØś ĒÖĢņןļÉśĻ│Ā ņłśļĀ┤ļÉ£ ņé¼Ļ│ĀĻ░Ć Ēæ£ĒśäļÉ£ ņ¦ĆņĀÉņØ┤ļØ╝Ļ│Ā ĒĢĀ ņłś ņ׳ņŚłļŗż. ņØ┤ ņØśļ»Ėļź╝ ņØĮņ£╝ļ®┤ ĒĢÖņāØļōżņØ┤ ņ¢╝ļ¦łļéś ņ×ÉņŗĀļōżņØä Ēæ£ĒśäĒĢśļŖöļŹ░ Ļ╣ŖņØĆ ņé¼Ļ│ĀņØś Ļ│╝ņĀĢĻ│╝ Ēæ£ĒśäņØś Ļ│╝ņĀĢņŚÉ ļīĆĒĢ£ ļģĖļĀźņØä ĒĢ┤ ņÖöļŖöņ¦Ćļź╝ ņĢī ņłś ņ׳ļŗż. ĻĘĖļōżņØ┤ ņāØĻ░üĒĢśĻ│Ā ņØ┤ĒĢ┤ĒĢśļŖö Ļ│╝ņĀĢņØĆ ļŗżņ¢æņä▒ņØä Ļ░Ćņ¦ĆĻ│Ā Ļ░ÉĻ░üņĀüņ£╝ļĪ£ ļŖÉļü╝ļŖö Ļ▓āļÅä ņ▓£ņ░©ļ¦īļ│äņØ┤ņ¦Ćļ¦ī, ņØ┤ļōżņØś Ļ░£ļ│äņĀüņØĖ Ēæ£Ēśä ņ¢Ėņ¢┤ļź╝ ļŖÉļéä ĒĢäņÜöĻ░Ć ņ׳ļŗżĻ│Ā ņāØĻ░ü ļÉ£ļŗż.
A ĒĢÖņāØ ņ×æĒÆłņØś ĻĄ¼ņ▓┤ņĀü ļé┤ņÜ®
C ĒĢÖņāØ ņ×æĒÆłņØś ĻĄ¼ņ▓┤ņĀü ļé┤ņÜ®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ņśłņłĀ Ļ▓ĮĒŚśņØś ĻĄÉņ£ĪĒĢÖņĀü ņŗ£ņé¼ņĀÉņØĆ ņ▓½ņ¦Ė, ĒĢÖņāØļōżņØ┤ ņ×ÉņŗĀļōżņØś ņĀĢņ▓┤ņä▒ņØä ņ░ŠņĢäĻ░ĆļŖö Ļ▓āņØ┤ļŗż. ņ”ē ĒĢÖņāØļōżņØ┤ ņ×ÉņŗĀņØś ļé┤ļ®┤ņØä ļÉśļÅīņĢä ļ┤äņ£╝ļĪ£ņŹ© Ļ░ÉņĀĢ, ņĀĢņä£, ĻĖ░ļČä, ļŖÉļéī, ņāØĻ░ü ļō▒ņØä Ēæ£ĒśäĒĢśĻ│Ā ņØ┤ļź╝ ĒåĄĒĢ┤ ņŗ¼ņŚ░ņØś ņ×ÉņŗĀĻ│╝ ļīĆļ®┤ĒĢśĻ│Ā ņ×ÉņŗĀņØś ņĀĢņ▓┤ņä▒ņØä ĒśĢņä▒ĒĢ┤ ļéśĻ░ĆļŖö ļŹ░ ņ׳ņŚłļŗż. ļ░öņü£ ņāØĒÖ£ņŚÉ ļö░ļźĖ ņŗ£Ļ░äņØś ĒØÉļ”äņØĆ ĒĢÖņāØļōżņØ┤ ņ×ÉņŗĀņØä ļÉśļÅīņĢäļ│┤ĻĖ░ ĒלļōżĻ│Ā ļ¦łņØīņØś ļ│æņØä ļ░£ņāØņŗ£ĒéżĻĖ░ļÅä ĒĢśļŖöļŹ░(ņØ┤ņāüļ▓ö, 2015: 44-45), ņØ┤ļ¤¼ĒĢ£ ļ░öņü£ ņŗ£ĻĖ░ņŚÉļÅä ņśłņłĀ Ļ▓ĮĒŚśņØä ĒåĄĒĢ┤ ņ¦ĆņŗØļ¦īņØä ņ¢╗ļŖö Ļ▓āņØ┤ ņĢäļŗłļØ╝ ņ×ÉņŗĀņØä ļÅīņĢäļ│┤Ļ│Ā ļ░śņä▒ĒĢśļ®░ ņäĖņāüĻ│╝ ņåīĒåĄĒĢśļŖö Ļ│╝ņĀĢņØä Ļ▒░ņ│żļŗż. ļśÉĒĢ£ ĒĢÖņāØļōżņØĆ ņ×ÉņŗĀņØä ņל ņĢīņĢäĻ░Ćļ®░ ļÅīļ│┤ļŖö Ļ▓āņØ┤ ĒāĆņØĖņØä ņל ņØ┤ĒĢ┤ĒĢĀ ņłś ņ׳ļŗżļŖö ļ¦ÉņØś ļŗżļźĖ Ēæ£ĒśäņØ┤ ņĢäļŗłļ®░, ĒāĆņØĖņØä Ļ│ĄĻ░ÉĒĢśĻ│Ā ņØ┤ĒĢ┤ĒĢ┤ ļéśĻ░ĆļŖö Ļ│╝ņĀĢņØ┤ ļÉĀ ņłś ņ׳ņØīņØä ņĢīņĢśļŗż. ņØ┤ļŖö ļéśņÖĆ ĒāĆņØĖ ņé¼ņØ┤ņŚÉņä£ņØś ņØśņé¼ņåīĒåĄņØä ņøÉĒÖ£ĒĢśĻ▓ī ĒĢĀ ņłś ņ׳ļÅäļĪØ ĒĢśļŖö Ļ│╝ņĀĢņØ┤ņŚłļŗż.
ņØ┤ļŖö ņĄ£ņłÖĻĖ░(2007: 219-232)ņØś ņŚ░ĻĄ¼ņÖĆļÅä ļ╣äņŖĘĒĢ£ Ļ▓░Ļ│╝ļź╝ ļ│┤ņŚ¼ņŻ╝ņŚłļŗż. ĻĘĖļŖö ņ×ÉĻĖ░ Ēæ£ĒśäņĀü ĻĖĆņō░ĻĖ░ ņŚ░ĻĄ¼Ļ░Ć Ļ░Ćņ¦ĆļŖö ĻĄÉņ£ĪņĀü ĒĢ©ņØśļź╝ ļ░ØĒśöļŖöļŹ░ ņØ┤ļŖö ņ×ÉĻĖ░Ēæ£ĒśäņØä ĒĢ┤ļéśĻ░ĆļŖö ļ░®ņŗØņØä ņØĄĒ×īļŗżļŖö Ļ▓āņØ┤ ņ¢╝ļ¦łļéś ņżæņÜöĒĢ£ņ¦ĆņŚÉ ļīĆĒĢ┤ņä£ ņāØĻ░üĒĢ┤ ļ│╝ ņłś ņ׳ļÅäļĪØ ĒĢ£ļŗż. ĻĘĖļŖö ņŚ░ĻĄ¼ļź╝ ĒåĄĒĢ┤ Ļ░£ļ░£ļÉ£ ĻĄÉņ£ĪĻ│╝ņĀĢņØś ņŗżņ▓£ņØä ĒåĄĒĢ┤ ĒĢÖņāØļōżņØś ņĀĢņØśņĀü ņśüņŚŁ ņ”ē, ĻĖŹņĀĢņĀüņØĖ ņĀĢņä£ļéś ņŻ╝ņ▓┤ņ×ÉļĪ£ņä£ņØś ņä▒ņן ļō▒ņŚÉ ņśüĒ¢źņØä ļ»Ėņ╣Ā ņłś ņ׳ņØīņØä ļ░ØĒśĆņŻ╝ņŚłļŗż. ņØ┤ļŖö ļ│Ė ņŚ░ĻĄ¼ņØś ņżæņŗ¼ ņŻ╝ņĀ£ņØĖ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ņśłņłĀ Ļ▓ĮĒŚśņØ┤ ĒĢÖņāØļōżņØ┤ ņ×ÉĻĖ░ ņ×ÉņŗĀ ļé┤ļ®┤ņØś ļ│ĆĒÖö ņ”ē, Ļ░ÉņĀĢņØś ļ│ĆĒÖöņŚÉ ļīĆĒĢ£ Ļ┤Ćņŗ¼Ļ│╝ Ēæ£Ēśä, ĒāĆņØĖĻ│╝ņØś ļīĆĒÖöņÖĆ Ļ│ĄĻ░ÉņŚÉ ĻĖ░ņŚ¼ĒĢ£ļŗżļŖö ļ╣äņŖĘĒĢ£ Ļ▓░Ļ│╝ļź╝ ļ│┤ņŚ¼ņŻ╝Ļ│Ā ņ׳ļŗż. ļśÉĒĢ£ ļŹö ļéśņĢäĻ░Ć ĒāĆņØĖĻ│╝ņØś ļīĆĒÖöļź╝ ĒåĄĒĢ£ ņ×ÉņŗĀņŚÉ ļīĆĒĢ£ ĻĖŹņĀĢĻ│╝ ĻĘ╣ļ│Ą ĻĘĖļ”¼Ļ│Ā ņä▒ņןņØ┤ļØ╝ļŖö ĒśäņāüņŚÉ ņØ┤ļź┤ĻĖ░Ļ╣īņ¦ĆņØś ļģĖļĀźņØä ņé┤ĒÄ┤ļ│╝ ņłś ņ׳ņŚłļŗż.
ļæśņ¦Ė,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ņØś ņśłņłĀ Ļ▓ĮĒŚśņØĆ ĒĢÖņāØļōżņØ┤ ņ░ĮņØśņä▒Ļ│╝ ņ░ĮņĪ░ņä▒ņØä ļ░£ĒśäĒĢśļŖöļŹ░ ļÅäņøĆņØä ņŻ╝Ļ│Ā ņ׳ņŚłļŗż.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Ļ│╝ņĀĢņØĆ ĒĢÖņāØļōżņØś ņĪ░ĒÖöļĪ£ņÜ┤ ĒåĄĒĢ®ņØś Ļ│╝ņĀĢņØä ĒåĄĒĢ£ Ļ░Éņä▒Ļ│╝ ņØ┤ņä▒ņØś ļ░£Ēśä, ļ¼ĖĒÖöņśłņłĀĻ│╝ ņ▓ĀĒĢÖņØś ņ£ĄĒĢ®ņØ┤ļØ╝ļŖö ņŻ╝ņĀ£ļź╝ ĒåĄĒĢ┤ ļŗżņ¢æĒĢ£ ļ░®ļ▓Ģņ£╝ļĪ£ ņ░ĮņØśņä▒ņØä Ēæ£ĒśäĒĢĀ ņłś ņ׳ļÅäļĪØ ĒĢśņśĆļŗż. ņØ┤ļ¤¼ĒĢ£ ņ¦ĆņŗØņØś ļ¦łņØīņŚÉņä£ņØś ņØ┤ĒĢ┤ņÖĆ ĒåĄĒĢ®ņØä ņ£äĒĢ┤ ĒĢÖņāØļōżņØ┤ Ļ│Āļ»╝ĒĢśļ®┤ņä£ ļŹö Ļ╣ŖĻ▓ī ņä▒ņןĒĢśĻ│Ā ņ׳ņŚłņ£╝ļ®░, ņ░ĮņØśņä▒ņØś ļ░£ĒśäņØ┤ņŚłļŗż.
ņĪ░ņŚ░ņł£(2012: 18-19)ļŖö ņ░ĮņØśņä▒ņŚÉ ļīĆĒĢ£ ņØ┤ĒĢ┤Ļ░Ć ņśżļ×£ ĻĖ░Ļ░ä ļÅÖņĢł ņŚ░ĻĄ¼ņŚÉ ņØśĒĢ┤ ļ¦ÄņØ┤ ļ│ĆĒÖöĒĢ┤ņÖöņØīņØä ļ░ØĒ׳Ļ│Ā ņ׳ļŗż. ļé┤ļ®┤ņØś ļ│ĆĒÖö ņ”ē ņāØĻ░ü ĻĄ¼ņĪ░ņØś ļ│ĆĒÖö Ļ│╝ņĀĢņØĆ Ļ│╝ņĀĢ ņżæņŗ¼ņØś ņ░ĮņØśņä▒ņŚÉ ļīĆĒĢ┤ ņāØĻ░üĒĢśļÅäļĪØ ĒĢ┤ ņŻ╝ņŚłļŗż. ņØ┤ņÖĆ Ļ░ÖņØ┤ ļ│Ė ņŚ░ĻĄ¼ņŚÉņä£ņØś ĒĢÖņāØļōżļÅä ņłśņŚģņŚÉņä£ņØś ņśłņłĀ Ļ▓ĮĒŚśņØä ĒĢśļ®┤ņä£, ņ£äņØś ņŚ░ĻĄ¼ņÖĆ ļ╣äņŖĘĒĢ£ Ļ▓░Ļ│╝ļź╝ ļ░ØĒśĆļé┤ņŚłļŗż. ĒĢÖņāØļōżņØĆ ņ×ÉņŗĀļōżņØś ņĀüĻĘ╣ņĀüņØĖ ņśłņłĀ Ļ▓ĮĒŚś Ļ│╝ņĀĢņØä ĒåĄĒĢ┤ņä£ ņ×ÉņŗĀ Ļ░£ņØĖņØś ņé¼Ļ│ĀĻ░Ć ļ│ĆĒÖöļÉśļŖö ņØ╝ņāüņĀüņØĖ Ļ▓ĮĒŚśņØä ĒĢśņśĆļŗż. ņ×ÉĻĖ░ ņ×ÉņŗĀņŚÉ ļīĆĒĢ£ ņāØĻ░üņØś ļ│ĆĒÖöļ┐Éļ¦ī ņĢäļŗłļØ╝, ņ×ÉņŗĀņØä ļæśļ¤¼ņŗĖĻ│Ā ņ׳ļŖö ņØ╝ņāüņØś ļ│ĆĒÖöņŚÉ ņØ┤ļź┤ĻĖ░Ļ╣īņ¦Ć ņ×ÉņŗĀļōżņØ┤ ņāØĻ░üĒĢśņ¦Ć ļ¬╗Ē¢łļŹś ņé¼Ļ│ĀņØś ļ│ĆĒÖöļź╝ Ļ▒░ņ╣śļ®┤ņä£ ņ×ÉņŗĀļōżļ¦īņØś ņ░ĮņØśņä▒ņØä ļ│┤ņŚ¼ņŻ╝Ļ│Ā ņ׳ņŚłļŗż. ņØ┤ļŖö ļŗżļźĖ ļłäĻĄ¼ņŚÉĻ▓īļÅä ņŚåļŖö ļÅģņ░ĮņĀüņØĖ ņ░ĮņØśņĀü Ļ▓░Ļ│╝ņśĆļŗż.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ņśłņłĀ Ļ▓ĮĒŚśņØĆ ĒĢÖņāØļōżļĪ£ ĒĢśņŚ¼ĻĖł ņ×ÉĻĖ░ ņ×ÉņŗĀņØ┤ ļłäĻĄ¼ņØĖņ¦Ćļź╝ ņĢīņĢäĻ░ĆļŖö Ļ│╝ņĀĢņØ┤ņŚłņ£╝ļ®░, ļśÉĒĢ£ ņ×ÉĻĖ░ ņ×ÉņŗĀņØä ņ░ĮņØśņĀüņ£╝ļĪ£ Ēæ£ĒśäĒĢśļŖö Ļ│╝ņĀĢņØ┤ņŚłļŗż. ņØ┤ļŖö ĒāĆņØĖĻ│╝ ņäĖņāüĻ│╝ņØś ņåīĒåĄņØä ĒåĄĒĢ┤ņä£ ņØ┤ļŻ©ņ¢┤ņĪīņØīņØä ņĢī ņłś ņ׳ļŗż. ļśÉĒĢ£ ņØ┤ Ļ│╝ņĀĢņŚÉņä£ļŖö ĒĢÖņāØļōżņØ┤ ļé┤ļ®┤ņØś ļ│ĆĒÖöļź╝ ĒåĄĒĢ┤ ņāłļĪ£ņÜ┤ Ļ▓āņØä ļ¦īļōżņ¢┤ ļé╝ ņłś ņ׳ņŚłņ£╝ļ®░, ņ░ĮņØśņä▒ņØ┤ļØ╝ļŖö Ļ▓āņØś Ļ░£ļģÉņØä ņŖżņŖżļĪ£ ņāłļĪŁĻ▓ī ļ░øņĢäļōżņØ╝ ņłś ņ׳ņŚłļŗż. ņØ┤ļŖö ĒĢÖņāØļōżņØ┤ ļäłļ¼┤ Ļ▒░ņ░ĮĒĢ£ Ļ▓āņØ┤ ņĢäļŗłļŹöļØ╝ļÅä ņ×æņØĆ Ļ▓āņŚÉņä£ļČĆĒä░ ņŗ£ņ×æĒĢ┤ņä£ ņ×ÉņŗĀļōżļÅä ņāłļĪ£ņÜ┤ Ļ▓░Ļ│╝ļ¼╝ņØä ļ¦īļōżņ¢┤ Ļ░ł ņłś ņ׳ņØīņØä ņĢīĻ│Ā, ļÅäņĀäĒĢ┤ ļéśĻ░ĆļŖö Ļ│╝ņĀĢņŚÉņä£ ņä▒ņĘ©Ļ░ÉņØ┤ļéś ļ¦īņĪ▒Ļ░ÉņØä ļåÆņØ╝ ņłś ņ׳ņ£╝ļ®░ ņØ┤ļź╝ ĒåĄĒĢ┤ ļŹö ļģĖļĀźĒĢśĻ│Ā ņ×ÉņŗĀĻ░ÉĻ│╝ ņ£ĀļŖźĻ░ÉņØä ņä▒ņĘ©ĒĢĀ ņłś ņ׳Ļ▓ī ĒĢĀ ņłś ņ׳ļŗżļŖöļŹ░ Ēü░ ņØśļ»Ėļź╝ Ļ░Ćņ¦ĆĻ│Ā ņ׳ņŚłļŗżĻ│Ā ĒĢĀ ņłś ņ׳ļŗż.
ļ│Ė ņŚ░ĻĄ¼ļŖö ļīĆĒĢÖņāØļōżņØś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ņśłņłĀ Ļ▓ĮĒŚśņØä ĒåĄĒĢ┤ ĻĄÉņ£ĪĒĢÖņĀü ņØśļ»ĖņÖĆ ņĀüņÜ®ņØä ņ£äĒĢ£ ņŗ£ņé¼ņĀÉņØä ņé┤ĒÄ┤ļ│┤ļŖö Ļ▓āņØä ļ¬®ņĀüņ£╝ļĪ£ ĒĢśņśĆļŗż. <ņ£ĀņĢä ņ░ĮņØśņä▒ ĻĄÉņ£Ī> ņłśņŚģņØä ņłśĻ░ĢĒĢ£ ĒĢÖņāØ ņżæņŚÉ ņØĖĒä░ļĘ░ņŚÉ ņØæĒĢ£ 5ļ¬ģņØś ĒĢÖņāØļōżņØä ļīĆņāüņ£╝ļĪ£ ņŚ░ĻĄ¼ļź╝ ņ¦äĒ¢ēĒĢśņśĆļŗż. ņŚ░ĻĄ¼ ļ░®ļ▓ĢņØĆ ļ®┤ļŗ┤Ļ│╝ Ēżņ╗żņŖż ĻĘĖļŻ╣ ņØĖĒä░ļĘ░ļź╝ ĒåĄĒĢ£ ņ¦łņĀü ņŚ░ĻĄ¼ļź╝ ņ¦äĒ¢ēĒĢśņśĆļŗż. ņŚ░ĻĄ¼ Ļ▓░Ļ│╝ ņ▓½ņ¦Ė, ĒĢÖņāØļōżņØś ļ¬©ļ”äĻ│╝ ņĢÄņØś Ļ│äņåŹņĀüņØĖ ņāüĒśĖņ×æņÜ®ņØ┤ ņØ╝ņ¢┤ļé¼ņ£╝ļ®░, ļæśņ¦Ė, ņØ┤ņä▒Ļ│╝ Ļ░Éņä▒ņØś ĒåĄĒĢ®ļÉ£ ņ¦ĆņŗØĻ│╝ ņāüļīĆņĀüņØĖ ņ¦ĆņŗØņØä ņĢīņĢäĻ░ĆļŖö ņ┤Øņ▓┤ņĀüņØĖ ņ¦ĆņŗØņØś ņŖĄļōØņØ┤ ņ׳ņŚłņ£╝ļ®░, ņģŗņ¦Ė, ņ×ÉĻĖ░ ņ×ÉņŗĀņŚÉ ļīĆĒĢ£ ņØ┤ĒĢ┤ļĀźņØ┤ Ē¢źņāüļÉśĻ│Ā ņ¦Ćņ¦Ćļź╝ ĒĢśĻ▓ī ļÉśņŚłņ£╝ļ®░, ļäĘņ¦Ė, ņéČņŚÉ ļīĆĒĢ£ ņØ┤ĒĢ┤ņÖĆ ņ░ĮņĪ░ņä▒ņØś ļ░£ĒśäņØä ļ│┤ņØ┤Ļ▓ī ļÉśņŚłļŗż. ļśÉĒĢ£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ņØś ĻĄÉņ£ĪĒĢÖņĀü ņŗ£ņé¼ņĀÉņØĆ ĒĢÖņāØļōżņØ┤ ņ×ÉĻĖ░ ņ×ÉņŗĀņØś ņĀĢņ▓┤ņä▒ņØä ņ░ŠĻ│Ā ĒāĆņØĖĻ│╝ņØś ņØśņé¼ņåīĒåĄĻ│╝ Ēæ£ĒśäņØś ļ░®ļ▓ĢņØä ņØĄĒ×É ņłś ņ׳ņŚłļŗżļŖö Ļ▓āņØ┤ļŗż. ļśÉĒĢ£ ņØ╝ņāüņĀüņØĖ ņ░ĮņØśņä▒ņŚÉ ļīĆĒĢ┤ ņØ┤ĒĢ┤ĒĢśĻ│Ā ņ×ÉņŗĀņØś ļ░░ņøĆĻ│╝ ņéČņŚÉ ņĀüņÜ®ĒĢĀ ņłś ņ׳ļÅäļĪØ ļÅäņøĆņØä ņŻ╝ņŚłļŗżļŖöļŹ░ ņ׳ļŗż.
ļīĆĒĢÖņāØļōżņØä ļīĆņāüņ£╝ļĪ£ ĒĢ£ ŌĆśņ×ÉĻĖ░Ēæ£Ēśä ņŗ£Ļ░üĒÖöŌĆÖ ņśłņłĀ Ļ▓ĮĒŚśņØĆ ĒśĢņŗØņĀüņØĖ ņłśņŚģņØś ņśüņŚŁņØä ļäśņ¢┤ ĒĢÖņāØļōżņØś ņłśņŚģņØś Ļ│╝ņĀĢņØä ļ░░ņøĆņØś ņśłņłĀļĪ£ ņŖ╣ĒÖöĒĢśņśĆļŗżļŖöļŹ░ ĻĘĖ ņØśņØśĻ░Ć ņ׳ļŗż. ņØ┤ļŖö ņŖżņŖżļĪ£ņØś ļ░░ņøĆņŚÉ ļīĆĒĢ£ ļæÉļĀżņøĆĻ│╝ ņ¢┤ļĀżņøĆņØä ĻĘ╣ļ│ĄĒĢśņśĆņ£╝ļ®░, ņóģĒĢ®ņĀüņØĖ ņé¼Ļ│Āļź╝ ĒĢĀ ņłś ņ׳ļŖö Ļ▓ĮĒŚśĻ│╝ Ļ░ĆļŖźņä▒ņØä ņ░ŠņĢśņ£╝ļ®░, ņ×ÉņŗĀņŚÉ ļīĆĒĢ£ ļČłņŗĀĻ│╝ ļČĆņĀĢņĀüņØĖ Ļ┤ĆņĀÉņ£╝ļĪ£ļČĆĒä░ņØś ļ│ĆĒÖöļź╝ Ļ░ĆņĀĖņÖöņ£╝ļ®░, ņ¦ĆņåŹņĀüņØĖ ņé¼Ļ│ĀņÖĆ ļģĖļĀźņØä ĒåĄĒĢ┤ ņ░ĮņØśņĀü ĒĢÖņŖĄņØ┤ Ļ░ĆļŖźĒĢśļÅäļĪØ ĒĢśņśĆļŗż. Ļ▓░Ļ│╝ņĀüņ£╝ļĪ£ ņŖżņŖżļĪ£ņØś ļé┤ļ®┤ņØś ļ│ĆĒÖöļź╝ ĒåĄĒĢ┤ ĻĄÉĻ│╝ņÖĆ ņéČĻ│╝ņØś ņŚ░Ļ▓░ ņåŹņŚÉņä£ ņ×ÉņŗĀņØä Ēæ£ĒśäĒĢśĻ│Ā ņŗ£Ļ░üĒÖöĒĢśļŖö ļ░®ļ▓ĢņØä Ēä░ļōØĒĢśĻ│Ā ņ׳ņŚłņØīņØä ņĢī ņłś ņ׳ļŗż.
ĒśäļīĆņØś ĻĄÉņ¢æĻĄÉņ£ĪņŚÉņä£ļŖö ĒĢÖļ¼ĖņØś ņ£ĄĒĢ®ņØä ĒåĄĒĢ┤ņä£ ņāłļĪ£ņÜ┤ ņ¦ĆņŗØņØä ļ¦īļōżņ¢┤Ļ░ĆĻ│Ā ņāłļĪ£ņÜ┤ ņ¦ĆņŗØņØś ĻĖ░ņ┤łļź╝ ļ¦łļĀ©ĒĢśĻĖ░ ņ£äĒĢ£ ļģĖļĀźņØä ĒĢśĻ│Ā ņ׳ļŗż. ņØ┤ņŚÉ ļö░ļØ╝ ļ╣äĒīÉņĀü ņé¼Ļ│Ā, ņóģĒĢ®ņĀüņØĖ ņé¼Ļ│Ā ļō▒ņØś ĒśĢņä▒Ļ│╝ ļ░£ĒśäņØ┤ ĻĄÉņ£ĪņŚÉņä£ ņżæņÜöĒĢ£ ļ¬®Ēæ£Ļ░Ć ļÉĀ ņłś ņ׳ļÅäļĪØ ĒĢśĻ│Ā ņ׳ļŗż. ļ│Ė ņŚ░ĻĄ¼ņØś ņłśņŚģ ņāüĒÖ®ņŚÉņä£ņØś ņśłņłĀ Ļ▓ĮĒŚśņØś ņŗ£ļÅäļŖö ĒĢÖņāØļōżņØ┤ ņŖżņŖżļĪ£ ņŻ╝ļÅäņĀüņ£╝ļĪ£ ļŗżņ¢æĒĢ£ ņ¦ĆņŗØņØä ļ░øņĢäļōżņØ┤Ļ│Ā ņé¼Ļ│Āļź╝ ĒÖĢņןĒĢśĻ│Ā ņłśļĀ┤ Ļ░ĆļŖźĒĢ£ Ļ│╝ņĀĢ ņåŹņŚÉņä£ ļ░░ņÜ┤ļŗżļŖö Ļ▓āņØś ņØśļ»Ėļź╝ ņāØĻ░üĒĢśļÅäļĪØ ĒĢśĻ│Ā, ņØ┤ ļ░░ņøĆņŚÉņä£ņØś ņä▒ņĘ©Ļ░Ć ĻĘĖļōż ņ×ÉņŗĀņØś ņ╣śņ£Āļź╝ Ļ░ĆļŖźĒĢśĻ▓ī ĒĢśļ®░, ĻĘĖļōżņØ┤ ņéČņØä ļ╣äņÜ░Ļ│Ā ņØ┤ĒĢ┤ĒĢ┤ ļéśĻ░ĆļŖöļŹ░ Ēü░ ņØśļ»Ėļź╝ Ļ░Ćņ¦ĆĻ│Ā ņ׳ļŗżļŖö ņé¼ņŗżņØä ņĢīĻ▓ī ļÉśņŚłļŗż. ĻĘĖ ņśłņłĀņØś ļ░£ĒśäņØĆ ĒĢÖņāØļōżĻ│╝ ĻĄÉņłśņ×ÉņØś ņä▒ņןņØä Ļ░ĆņĀĖņÖöļŗż. ĻĘĖļĀćĻĖ░ ļĢīļ¼ĖņŚÉ ĻĄÉņłśņ×ÉļŖö ĻĄÉņ£ĪņØ┤ ņ¢┤ļ¢ĀĒĢ£ Ļ▓āņØĖņ¦Ć ĻĘĖĻ▓āņØ┤ ņ¢┤ļ¢ĀĒĢ£ ņØśļ»Ėļź╝ Ļ░Ćņ¦ĆĻ│Ā ņ׳ļŖöņ¦ĆņŚÉ ļīĆĒĢ┤ņä£ ņāØĻ░üĒĢ┤ ļ│┤Ļ│Ā ņśłņłĀņØś ĒÖ£ņÜ®, ņśłņłĀņØś Ļ░£ļģÉĻ│╝ ņØśļ»Ė, ņśłņłĀņØ┤ ņŻ╝ļŖö Ļ░Éņä▒, Ļ│ĄĻ░É, Ēæ£Ēśä ļō▒ņØä ļŹöņÜ▒ļŹö ĒÖĢļīĆĒĢśĻ│Ā ņ░ĮņĪ░(ÕēĄķĆĀ)ņØś Ē¢ēņ£äļź╝ ĒĢśļŖö ĒøīļźŁĒĢ£ ņłśņŚģņŚÉ ļīĆĒĢ£ ņØśļ»Ėļź╝ ņāØĻ░üĒĢ┤ ļ│╝ ņłś ņ׳ņŚłņ£╝ļ®░, ņĢ×ņ£╝ļĪ£ļÅä ņØ┤ļ¤¼ĒĢ£ ņłśņŚģņØä Ļ░£ļ░£ĒĢśĻĖ░ ņ£äĒĢ£ ļģĖļĀźņØ┤ ĒĢäņÜöĒĢśļŗż.
ļ│Ė ņŚ░ĻĄ¼ņŚÉ ĒøäņåŹ ņŚ░ĻĄ¼ņØś ņĀ£ņ¢ĖņØä ĒĢśļ®┤ ļŗżņØīĻ│╝ Ļ░Öļŗż.
ņ▓½ņ¦Ė, ļ│Ė ņŚ░ĻĄ¼ļŖö ļīĆĒĢÖņāØļōżņØ┤ ņ×ÉĻĖ░ ņ×ÉņŗĀņØä ņ░ŠņĢäĻ░ĆļŖö Ļ│╝ņĀĢļ┐Éļ¦ī ņĢäļŗłļØ╝, ĻĘĖļōż ņéČņØś ņŗ£ņ×æņØ┤ņŚłļŗżĻ│Ā ĒĢĀ ņłś ņ׳ļŗż. ĒĢÖņāØļōżņØ┤ ņ×ÉĻĖ░ņĀĢņ▓┤ņä▒ņØä ņ░ŠņØä ņłś ņ׳ļÅäļĪØ ĒĢśļŖö ņśłņłĀ Ļ▓ĮĒŚś ņŚ░ĻĄ¼ļź╝ ņ¦ĆņåŹņĀüņ£╝ļĪ£ Ļ░£ļ░£ĒĢśņŚ¼ ĻĄÉņ¢æĻĄÉņ£ĪņŚÉ ņĀüņÜ®ĒĢśļŖö ļ░®ļ▓ĢņØä ņāØĻ░üĒĢ┤ ļ│┤ļŖö Ļ▓āņØ┤ ĒĢäņÜöĒĢśļŗż.
ļæśņ¦Ė, ļ│Ė ņŚ░ĻĄ¼ļŖö ņśłņłĀ ĻĖ░ļ░śņ£╝ļĪ£ ĒĢ£ ņłśņŚģņØś ņןņĀÉņØä ĻĖ░ņ¢ĄĒĢśĻ│Ā ĒĢÖņāØļōżņØ┤ ņØ┤ņä▒Ļ│╝ Ļ░Éņä▒Ļ│╝ Ļ░ÖņØ┤ ĒåĄĒĢ®ļÉśņ¢┤ ņóģĒĢ®ņĀüņØĖ ņé¼Ļ│Āļź╝ ĒĢĀ ņłś ņ׳ļŖö ņłśņŚģņØś Ļ░£ļ░£ņØä ĒĢäņÜöļĪ£ ĒĢ£ļŗż.
ņ░ĖĻ│Āļ¼ĖĒŚī
Ļ│ĀņØĆĒؼ(2020). ŌĆ£ļööņ×ÉņØĖņöĮĒé╣ ĒöäļĪ£ņäĖņŖżņŚÉņä£ņØś ņŗ£Ļ░üņĀü ņé¼Ļ│ĀņØś ņŚŁĒĢĀ - ļīĆĒĢÖņāØ ļīĆņāü ļööņ×ÉņØĖņöĮĒé╣ ņŗżņŖĄ ņżæņŗ¼ņ£╝ļĪ£ - ŌĆØ, ĒĢ£ĻĄŁļööņ×ÉņØĖĒżļ¤╝ 25(2), ĒĢ£ĻĄŁļööņ×ÉņØĖĒŖĖļĀīļō£ĒĢÖĒÜī, 49-58.
Ļ╣Ćņä▒ņøÉ, ņ£żņĀĢņ¦ä(2016). ŌĆ£ņśüĒÖöļź╝ ĒÖ£ņÜ®ĒĢ£ Ēöīļ”Įļ¤¼ļŗØ ĻĖ░ļ░śņØś ĒĢÖņĀ£Ļ░ä ņ£ĄĒĢ® ņ░ĮņØśņä▒ ĻĄÉņ¢æņłśņŚģ ĒÜ©Ļ│╝ŌĆØ, ĻĄÉņ¢æĻĄÉņ£ĪņŚ░ĻĄ¼ 10(4), ĒĢ£ĻĄŁĻĄÉņ¢æĻĄÉņ£ĪĒĢÖĒÜī, 457-486.
Ļ╣ĆņŚ░Ēؼ(2008). ŌĆ£ĒāÉĻĄ¼ļĪ£ņä£ņØś ņśłņłĀĻ▓ĮĒŚśĻ│╝ ĻĄÉņ£ĪņĀü ĒĢ©ņØś -ņĪ┤ ļōĆņØ┤ņØś ņ¦łņĀü ņé¼ņ£Āļź╝ ņżæņŗ¼ņ£╝ļĪ£ŌĆØ, ĻĄÉņ£Īņ▓ĀĒĢÖ 41, ĒĢ£ĻĄŁĻĄÉņ£Īņ▓ĀĒĢÖĒĢÖĒÜī, 63-91.
Ļ╣ĆņĀĢĒؼ(2020). ŌĆ£ļ»ĖņłĀĻĄÉņ£ĪņŚÉņä£ ņŗżņ▓£ņĀü ļ░░ņøĆņØś ņØśļ»ĖņÖĆ Ļ│╝ņĀĢŌĆØ, ļ»ĖņłĀĻĄÉņ£ĪņŚ░ĻĄ¼ļģ╝ņ┤Ø 62, ĒĢ£ĻĄŁņ┤łļō▒ļ»ĖņłĀĻĄÉņ£ĪĒĢÖĒÜī, 63-85.
ļéśĻ▒┤, ļ░ĢņżĆĒÖŹ(2013). ŌĆ£ļööņ×ÉņØĖ ĒöäļĪ£ņäĖņŖżļź╝ ĻĖ░ļ░śņ£╝ļĪ£ ĒĢśļŖö ņ░ĮņØśņĀü ļ░£ņāüņŚÉ Ļ┤ĆĒĢ£ ņŚ░ĻĄ¼ -ņ░ĮņØś ņøīĒü¼ņłŹņØä ņżæņŗ¼ņ£╝ļĪ£ŌĆØ, ņé░ņŚģļööņ×ÉņØĖĒĢÖņŚ░ĻĄ¼ 7(4), ĒĢ£ĻĄŁņØĖļŹöņŖżĒŖĖļ”¼ņ¢╝ļööņ×ÉņØĖĒĢÖĒÜī, 31-38.
ļéśĻ▒┤, ņĀäņłśņĀĢ(2015). ŌĆ£ļööņ×ÉņØĖ ņé¼Ļ│Ā ĻĖ░ļ░śņØś ņ░ĮņØśņĀü ĒöäļĪ£ņäĖņŖż ļ╣äĻĄÉļČäņäØņŚÉ Ļ┤ĆĒĢ£ ņŚ░ĻĄ¼ŌĆØ, ņé░ņŚģļööņ×ÉņØĖĒĢÖņŚ░ĻĄ¼ 9(4), ĒĢ£ĻĄŁņØĖļŹöņŖżĒŖĖļ”¼ņ¢╝ļööņ×ÉņØĖĒĢÖĒÜī, 63-72.
ļ░ĢņŻ╝Ēؼ(2016). ŌĆ£ļ»ĖņĀü Ļ▓ĮĒŚśņØś ņśłņłĀĻĄÉņ£ĪņĀü Ļ░Ćņ╣śŌĆØ, ĒĢ£ĻĄŁĻĄÉņ£ĪĒĢÖņŚ░ĻĄ¼ 22(3), ņĢłņĢöĻĄÉņ£ĪĒĢÖĒÜī, 149-167.
ļ░Ģņ¦äĒؼ, ņ×äĒÖŹļé©, ņ£żņĀĢņ¦ä(2022). ŌĆ£ņ╣╝ ļĪ£ņĀĆņŖżņØś Ļ░ÉņĀĢņŚÉ ļīĆĒĢ£ ņØ┤ĒĢ┤Ļ░Ć ņ░ĮņØśŌŗģņØĖņä▒ĻĄÉņ£ĪņŚÉ ņŻ╝ļŖö ĒĢ©ņØśŌĆØ, ņØĖļ¼Ėņé¼ĒÜī 21 13(2). ņØĖļ¼Ėņé¼ĒÜī 21, 1651-1666.
ļ░Ģņ▓ĀĒÖŹ(2011). ŌĆ£ļōĆņØ┤ņØś Ļ▓ĮĒŚśĻ░£ļģÉņŚÉ ļ╣äņČöņ¢┤ ļ│Ė ņé¼Ļ│ĀņØś ņä▒Ļ▓®: ņØ┤ņä▒ņĀü ņé¼Ļ│ĀņÖĆ ņ¦łņä▒ņĀü ņé¼Ļ│ĀņØś ĒåĄĒĢ®ņĀü ņ×æņÜ®ŌĆØ, ĻĄÉņ£Īņ▓ĀĒĢÖņŚ░ĻĄ¼ 33(1), ĒĢ£ĻĄŁĻĄÉņ£Īņ▓ĀĒĢÖĒĢÖĒÜī, 79-104.
ļ│ĆņŚ░Ļ│ä(2021). ĻĄÉņłśŌŗģĒĢÖņŖĄ ņØ┤ļĪĀņØś ņØ┤ĒĢ┤, ņä£ņÜĖ: ĒĢÖņ¦Ćņé¼.
ņÜ░ņśüņ¦ä, ņØ┤ņ×¼ĒśĖ(2018). ŌĆ£ļööņ×ÉņØĖ ņöĮĒé╣ ĻĖ░ļ░ś ļ®öņØ┤ņ╗ż ĻĄÉņ£Ī ĒöäļĪ£ĻĘĖļש Ļ░£ļ░£Ļ│╝ ņĀüņÜ®ŌĆØ, ņ░ĮņØśņĀĢļ│┤ļ¼ĖĒÖöņŚ░ĻĄ¼ 4(1), ĒĢ£ĻĄŁņ░ĮņØśņĀĢļ│┤ļ¼ĖĒÖöĒĢÖĒÜī, 35-43.
ņ£żņ×¼ĒÖŹ(2000). ŌĆ£ļīĆĒÖöņĀü ņäĖĻ│äĻ┤ĆņØś ņØĖņŗØļĪĀņĀü ĒåĀļīĆņÖĆ ĻĘĖ ĻĄÉņ£ĪĒĢÖņĀü ņØśļ»ĖŌĆØ, ņŚ░ņäĖĻĄÉņ£ĪņŚ░ĻĄ¼ 13(1), ņŚ░ņäĖļīĆĒĢÖĻĄÉ ĻĄÉņ£ĪņŚ░ĻĄ¼ņåī, 171-190.
ņ£żņĀĢņ¦ä, Ļ╣Ćļ│æļ¦ī, Ļ╣Ćņä▒ņøÉ, Ļ╣ĆņĀĢņŻ╝, Ļ╣ĆĒśĢņ×¼, ņŚäņäĖņ¦ä(2017). ņØĖņä▒ĻĄÉņ£ĪņØś ņØ┤ļĪĀĻ│╝ ņŗżņĀ£, Ļ▓ĮĻĖ░: Ļ│ĄļÅÖņ▓┤.
ņØ┤ņāüļ▓ö(2015). ŌĆ£ņŗżņĪ┤ņØś Ļ│ĀĒåĄņ£╝ļĪ£ņä£ņØś ļ¦łņØīņØś ļ│æĻ│╝ ņéČņŚÉ ļīĆĒĢ£ ļŗłņ▓┤ņØś ņŗżņĪ┤ņĀü ņé¼ļ×æŌĆØ, ļŗłņ▓┤ņŚ░ĻĄ¼ 27, ĒĢ£ĻĄŁļŗłņ▓┤ĒĢÖĒÜī, 41-87.
ņØ┤ņóģņøÉ, ņØ┤Ļ▓Įņ¦ä(2016). ŌĆ£ĒåĄĒĢ®ĻĄÉņ£ĪĻ│╝ņĀĢņŚÉ ņ׳ņ¢┤ņä£ ĒāłĻĘ╝ļīĆņĀü ņśłņłĀņ¦ĆņŗØņØś ņØśļ»ĖņÖĆ ņŚŁĒĢĀŌĆØ, ĒåĄĒĢ®ĻĄÉņ£ĪĻ│╝ņĀĢņŚ░ĻĄ¼ 10(4), ĒĢ£ĻĄŁĒåĄĒĢ®ĻĄÉņ£ĪĻ│╝ņĀĢĒĢÖĒÜī, 147-172.
ņØ┤Ēśäļ”╝, ĒÖŹņāüņÜ▒, ņ▒äņäĀĒÖö, ņØ┤ņ¦Ćļ»╝, Ļ╣Ćņł£ņśź, ņ▓£ņśüĒؼ, ņĄ£ļ»ĖņäĀ, ņØ┤ņł£ĻĖ░, ņØ┤Ē¢źņłÖ, ņĀäĻ▒┤ņØ┤, ņĀĢņłśņØĖ(2015). ņ▓Łņåīļģä ļ╣äĒ¢ēĻ│╝ ņāüļŗ┤(2ĒīÉ), ņä£ņÜĖ: ĻĄÉņ£ĪĻ│╝ĒĢÖņé¼.
ņĀĢņłśņŚ░, ņĀĢļÅäņä▒(2014). ŌĆ£ĒŖ╣ņä▒ĒÖö Ļ│Āļō▒ĒĢÖĻĄÉ ļööņ×ÉņØĖ ĻĄÉņ£ĪņŚÉņä£ ĻĘĆļé®ņĀü ņé¼Ļ│Ā ļ¬©ĒśĢĻ│╝ ņŖżņ║ĀĒŹ╝ļź╝ ņĀüņÜ®ĒĢ£ ņĢäņØ┤ļööņ¢┤ ļ░£ņāüņŚÉ Ļ┤ĆĒĢ£ ņŚ░ĻĄ¼ŌĆØ, ņé░ņŚģļööņ×ÉņØĖĒĢÖņŚ░ĻĄ¼ 8(1), ĒĢ£ĻĄŁņØĖļŹöņŖżĒŖĖļ”¼ņ¢╝ļööņ×ÉņØĖĒĢÖĒÜī, 31-40.
ņĀĢņśźĒؼ(2019). ŌĆ£ņśłņłĀ ņ▓┤ĒŚśņØä ĒåĄĒĢ£ ņØĖļ¼ĖĒĢÖņĀü ļ░░ņøĆņØś Ļ░ĆļŖźņä▒ŌĆØ, ļ»ĖņłĀĻĄÉņ£ĪņŚ░ĻĄ¼ļģ╝ņ┤Ø 56, ĒĢ£ĻĄŁņ┤łļō▒ļ»ĖņłĀĻĄÉņ£ĪĒĢÖĒÜī, 1-24.
ņĀĢņ¦äņøÉ, ņśżņ¦ĆĒ¢ź, ņĀĢņØĆĻ▓Į(2013). ŌĆ£ņØīņĢģĻĄÉĻ│╝ņŚÉņä£ņØś ņŚŁļ¤ēŌŗģņØĖņä▒ĻĄÉņ£Ī ņÜöņØĖņŚÉ Ļ┤ĆĒĢ£ ĻĄÉņé¼ņØĖņŗØ FGI ņŚ░ĻĄ¼ŌĆØ, ņśłņłĀĻĄÉņ£ĪņŚ░ĻĄ¼ 11(3), ĒĢ£ĻĄŁņśłņłĀĻĄÉņ£ĪĒĢÖĒÜī, 83-106.
ņĪ░ņŚ░ņł£(2012). ŌĆ£ŌĆśĒĢÖņāØ ņ░ĮņØśņä▒ŌĆÖņØś Ļ░£ļģÉ ĒāÉņāēŌĆØ, ņ┤łļō▒ĻĄÉņ£ĪņŚ░ĻĄ¼ 25(3), ĒĢ£ĻĄŁņ┤łļō▒ĻĄÉņ£ĪĒĢÖĒÜī, 1-26.
ņĄ£ņłÖĻĖ░(2007). ŌĆ£ņ×ÉĻĖ░ Ēæ£ĒśäņĀü ĻĖĆņō░ĻĖ░(expressive writing)ņØś ĻĄÉņ£ĪņĀü ĒĢ©ņØśŌĆØ, ņ×æļ¼ĖņŚ░ĻĄ¼ 5, ĒĢ£ĻĄŁņ×æļ¼ĖĒĢÖĒÜī, 205-239.
ņĄ£ņ¦ä, Ļ│ĮļŹĢņŻ╝(2015). ŌĆ£Ļ░ÉņĀĢĻĄÉņ£Īņ£╝ļĪ£ņä£ņØś ņśłņłĀĻĄÉņ£Ī: ņśłņłĀĻ▓ĮĒŚśņØś ĻĄÉņ£ĪņĀü Ļ░Ćņ╣ś ĒāÉņāēŌĆØ, ĻĄÉņ£Īņ▓ĀĒĢÖņŚ░ĻĄ¼ 37(1), ĒĢ£ĻĄŁĻĄÉņ£Īņ▓ĀĒĢÖĒĢÖĒÜī, 117-137.
ņĄ£Ēś£ņ¦ä(2016). ŌĆ£ņ░ĮņØśņ£ĄĒĢ®ņØä ņ£äĒĢ£ ļīĆĒĢÖņØś ņ▓┤ĒŚśĻĄÉņ£Ī ļ░®ļ▓Ģ ņŚ░ĻĄ¼ - ĻĄÉņ¢æĻĄÉņ£ĪĻ│╝ņĀĢ ņäżĻ│äļź╝ ņżæņŗ¼ņ£╝ļĪ£ŌĆØ, ļ¼ĖĒÖöņÖĆ ņ£ĄĒĢ® 38(5), ĒĢ£ĻĄŁļ¼ĖĒÖöņ£ĄĒĢ®ĒĢÖĒÜī, 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