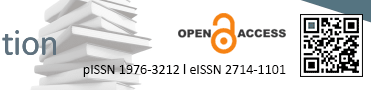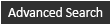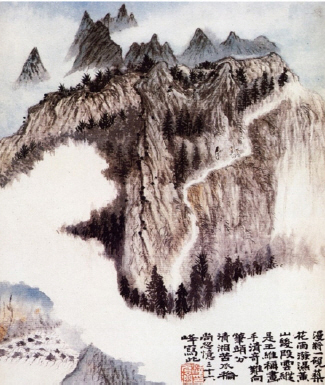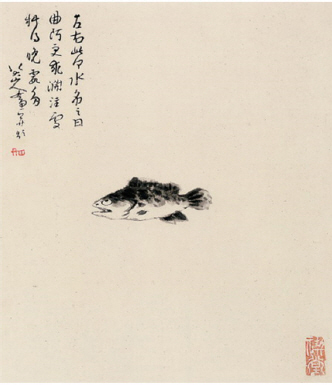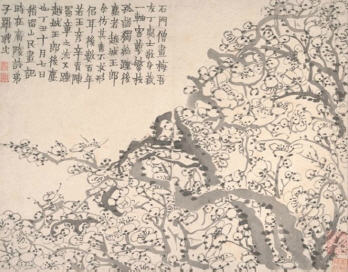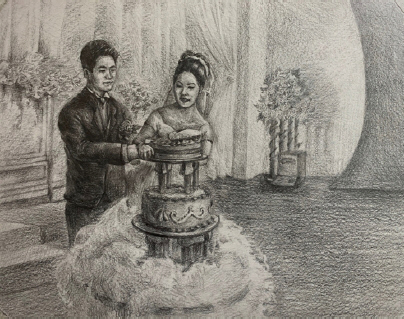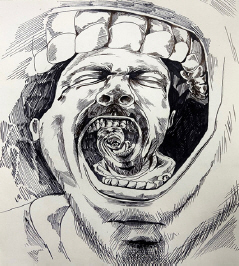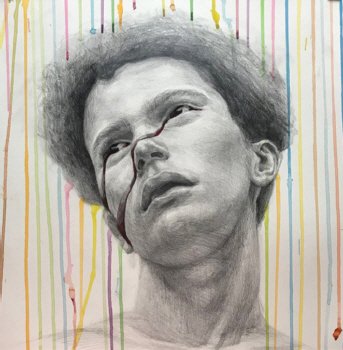|
 |
- Search
| Korean J General Edu > Volume 16(3); 2022 > Article |
|
Abstract
Abstract
Notes
1) ņ¢æņ¦Ć(Ķē»ń¤ź)ļØ╝ļŖö ņÜ®ņ¢┤ļŖö ŌĆ£ļ¦╣ņ×É(ÕŁ¤ÕŁÉ)ŌĆØņŚÉņä£ ŌĆśņ¦äņŗ¼ņāü(ńøĪÕ┐āõĖŖ)ŌĆÖņØś ņ¢æļŖź(Ķē»ĶāĮ), ņ¢æņ¦Ć(Ķē»ń¤ź)ņŚÉņä£ ļ╣äļĪ»ļÉ£ Ļ▓āņØĖļŹ░, ŌĆśņ¢æ(Ķē»)ŌĆÖņØ┤ļ×Ć ņäĀņ▓£ņĀüņ£╝ļĪ£ ĻĄ¼ļ╣äļÉ£ ņ¦ĆļŖź, ņØ┤Ļ▓āņØä ŌĆśņ¢æņ¦Ćņ¢æļŖź(Ķē»ń¤źĶē»ĶāĮ)ŌĆÖņØ┤ļØ╝Ļ│Ā Ē¢łļŗż(ńÄŗķÖĮµśÄ, ņ£Āļ¬ģņóģ, 2002: 57).ŌĆØ ņØ┤Ļ▓āņØĆ ņ¢æļ¬ģĒĢÖņØś ļÅģņ░ĮņĀüņØĖ ņé¼ņāüņØ┤ ņ¦æņĢĮļÉśņ¢┤ ņ׳ļŖö Ļ░Ćņן ņżæņÜöĒĢ£ Ļ░£ļģÉņ£╝ļĪ£ ņŗ¼ņ”ēļ”¼, ņ¦ĆĒ¢ēĒĢ®ņØ╝, ņĀĢņóī[ķØ£ÕØÉ:ņ▓£ļ”¼Ļ░Ć ņĀĢ(ń▓Š)ĒĢśĻ▓ī ļ░Øņ£╝ļ®┤ Ļ░üĻĖ░ ņé¼ļ¼╝ņØś ļ£╗ņØ┤ ņ×ÉņŚ░ ņĀĢļ░ĆĒĢśĻ│Ā ņś©ņĀäĒĢśļ®░ ļ▓łĻ▒░ļĪ£ņÜĖ ņŚ╝ļĀżĻ░Ć ņŚåļŗż, ņĀĢņóīļ▓ĢņØĆ ņŻ╝ļĪ£ ņäĀņóģ(ń”¬Õ«Ś)ņŚÉņä£ ņŗ£Ē¢ēļÉśļŖö ņłśņ¢æļ░®ļ▓ĢņØ┤ļéś ņÖĢņ¢æļ¬ģņØś ņĀĢņóīļ▓ĢņØĆ ļČłĻĄÉņŚÉņä£ ņŗ£Ē¢ēĒĢśļŖö ņóīņäĀņØ┤ ņĢäļŗłļØ╝ ņ¢┤ļööĻ╣īņ¦Ćļéś ĻĄ¼ļ░®ņŗ¼(µ▒éµöŠÕ┐ā)ĒĢśĻ│Āņ×É ĒĢśļŖöļŹ░ ņ׳ņŚłļŗż](ņĪ░ĒśäĻĘ£, 2009: 225), ņé¼ņāüļ¦łļĀ©[õ║ŗõĖŖńŻ©ķŹŖ: ļ¦łņØīņØś ļ│Ėņ▓┤Ļ░Ć ļČĆļÅÖ(õĖŹÕŗĢ)ĒĢ©ņØä ņ×ÉĻ░üĒĢ┤ņĢ╝ ĒĢ£ļŗżļŖö Ļ▓āņ£╝ļĪ£ Ē¢ēļÅÖņĀü, Ļ▓ĮĒŚśņĀü ņłśĒ¢ēņ£╝ļĪ£ņŹ© ņØ╝ņāü ņåŹņŚÉņä£ ņ×ÉņŗĀņØä Ļ░łĻ│Ā ļŗ”ņØä Ļ▓āņØä ņŻ╝ņןĒĢśņśĆļŗż](ņ£Āļ¬ģņóģ, 2002: 110-111) ļō▒ ņÖĢņ¢æļ¬ģņØ┤ ņŻ╝ņןĒĢ£ Ļ▒░ņØś ļ¬©ļōĀ ņé¼ņāüļōżņØ┤ ņČ£ĒśäĒĢśĻĖ░ ļĢīļ¼ĖņŚÉ ņ¢æņ¦ĆļØ╝ļŖö ņØśļ»ĖļŖö ņ¢æļ¬ģĒĢÖņŚÉņä£ Ļ░Ćņן ĒĢĄņŗ¼ņØ┤ ļÉ£ļŗż. ļśÉĒĢ£ ŌĆ£ņżæĻĄŁņ▓ĀĒĢÖņé¼ņŚÉņä£ ļÅäļŹĢņØĖĻ▓®ņÖäņä▒ņØś ņāüņ¦Ģņ£╝ļĪ£ņŹ© ĻĘĖ Ļ│ĄļŖź(ÕŖ¤ĶāĮ)ņØä ļ░£Ē£śĒĢ©Ļ│╝ ļÅÖņŗ£ņŚÉ ņ¢æļ¬ģņ▓ĀĒĢÖņØś ļ│Ėņ▓┤ļĪĀņĀü(µ£¼ķ½öĶ½¢ńÜä) ĻĄ¼ņĪ░ļź╝ ĒīīņĢģĒĢśļŖö ņŚ┤ņćĀņØ┤ĻĖ░ļÅä ĒĢśļŗż(Ļ╣Ćņ×¼ĻĄ¼, 1996: 43).ŌĆØ
2) ļ│Ėļ¬ģņØĆ ņÖĢņłśņØĖ(ńÄŗÕ«łõ╗ü)ņØ┤ļéś ņÖĢņ¢æļ¬ģ[ĒśĖĻ░Ć ņ¢æļ¬ģ(ķÖĮµśÄ)]ņØś ĒśĖņ╣ŁņØ┤ ļ│┤ĒÄĖņĀüņØ┤ļ»ĆļĪ£ ļ│Ė ļģ╝ļ¼ĖņŚÉņä£ļÅä ņÖĢņ¢æļ¬ģņ£╝ļĪ£ ņ╣ŁĒĢ£ļŗż. ĻĘĖņØś ņĀĆņä£ļĪ£ļŖö ŃĆÄÕé│ń┐ÆķīäŃĆÅ, ŃĆÄńÄŗķÖĮµśÄÕģ©ŃĆÅĻ░Ć ņ׳ļŗż.
3) ņ╣śņ¢æņ¦Ć(Ķć┤’ź╝ń¤ź)ļŖö ņ£ĀĻ░Ć(ÕäÆÕ«Č)ņØś ņ░Įņŗ£ņ×ÉņØĖ Ļ│Ąņ×É[ÕŁöÕŁÉ, ņČśņČö(µśźń¦ŗ), BC551-497]ņØś ŌĆ£ļģ╝ņ¢┤(’źüĶ¬×)ŌĆØņŚÉņä£ ŌĆśĻĄ░ņ×ÉļŖö ĒĢÖļ¼ĖņØä ĒĢśņŚ¼, ņØ┤ļĪ£ņŹ© ĻĘĖņØś ļÅäļź╝ ņ╣ś(Ķć┤)ĒĢ£ļŗż(ÕÉøÕŁÉÕŁĖõ╗źĶć┤ÕģČķüō)ŌĆÖ(ÕŁöÕŁÉ, ļ░Ģņ£Āļ”¼, 2005: 616)ļØ╝ļŖö ņØśļ»ĖņÖĆ ņŻ╝ņ×ÉņŻ╝(µ£▒ÕŁÉµ│©)ņŚÉņä£ņØś ŌĆśņ╣ś(Ķć┤)ļŖö ĻĘ╣(µźĄ)ŌĆÖņØ┤Ļ│Ā, ŌĆśņ¦äĻĖ░ĻĘ╣ņĢ╝(ńøĪÕģȵźĄõ╣¤)ŌĆÖ, ŌĆśņČöņ¦ĆņĢ╝(µÄ©Ķć│õ╣¤)ŌĆÖ, ŌĆśņČöĻĘ╣ņĢ╝(µÄ©µźĄõ╣¤)ŌĆÖņŚÉņä£ ļ╣äļĪ»ļÉśņŚłņØīņØä ņ¦Éņ×æĒĢĀ ņłś ņ׳ļŗż. ņÖĢņ¢æļ¬ģ ņŚŁņŗ£ Ļ░ÖņØĆ ņØśļ»ĖļĪ£ ĒĢ┤ņäØĒĢśņŚ¼ ņ╣śļź╝ ņ¦Ć(Ķć│) Ēś╣ņØĆ ĻĘ╣(µźĄ), ņ¦äņ¦Ć(ńøĪõ╣ŗ)ņØś ļ£╗ņ£╝ļĪ£ ļ│┤ņĢśĻ│Ā ņ╣śņ¢æņ¦Ć(Ķć┤’ź╝ń¤ź)ņØś ņ╣ś(Ķć┤)ļź╝ ŌĆ£ļ¦╣ņ×É(ÕŁ¤ÕŁÉ)ŌĆØņØś ŌĆśĒÖĢļīĆĒĢśņŚ¼ ņČ®ļŗ╣ĒĢ£ļŗż(µō┤ĶĆīÕģģõ╣ŗ)ŌĆÖļŖö Ļ▓āņ£╝ļĪ£ ņÜöņĢĮĒĢśņśĆļŗż(ņ£Āļ¬ģņóģ, 2002: 101-102).
4) ņÖĢņ¢æļ¬ģņØĆ ļ¦łņØīņØś ļ│Ėņ▓┤Ļ░Ć ņ▓£ļ”¼ņØ┤ļ®░ ņ¢æņ¦ĆļØ╝Ļ│Ā ļŗżņØīĻ│╝ Ļ░ÖņØ┤ ļ¬ģņŗ£ĒĢśņśĆļŗż. ŌĆ£ņ¢æņ¦Ć(Ķē»ń¤ź)ļŖö ņ▓£ļ”¼(Õż®ńÉå)ņØś ļ░ØĻ│Ā ņŖ¼ĻĖ░ļĪ£ņÜ┤ ņ¦ĆĻ░üņØ┤ļŗż. ĻĘĖļ¤¼ļ»ĆļĪ£ ņ¢æņ¦ĆļŖö Ļ│¦ ņ▓£ļ”¼ņØ┤ļŗż(Ķē»ń¤źµś»Õż®ńÉåõ╣ŗµśŁµśÄķØłĶ”║ĶÖĢ. µĢģĶē»ń¤źÕŹĮµś»Õż®ńÉå)ŌĆØ(ńÄŗķÖĮµśÄ, ńŁöµŁÉķÖĮÕ┤ćõĖĆ), ŌĆ£ņĀĆ ļ¦łņØīņØś ļ│Ėņ▓┤ļŖö Ļ│¦ ņ▓£ļ”¼ņØ┤ļŗż. ņ▓£ļ”¼ņØś ļ░ØĻ│Ā ņŖ¼ĻĖ░ļĪ£ņÜ┤ Ļ▓āņØ┤ ņ¢æņ¦Ć(Ķē»ń¤ź)ņØ┤ļŗż(Õż½Õ┐āõ╣ŗµ£¼ķ½öÕŹĮÕż®ńÉåõ╣¤. Õż®ńÉåõ╣ŗµśŁµśÄķØłĶ”║µēĆĶ¼éĶē»ń¤źõ╣¤)ŌĆØ(ńÄŗķÖĮµśÄ, ńŁöĶłÆÕ£ŗńö©), ŌĆ£ļé┤ ļ¦łņØīņØś ņ¢æņ¦ĆļŖö Ļ│¦ ņØ┤ļźĖļ░ö ņ▓£ļ”¼ņØ┤ļŗż. ļé┤ ļ¦łņØīņØś ņ¢æņ¦ĆņØś ņ▓£ļ”¼ļź╝ ņé¼ņé¼ļ¼╝ļ¼╝ņŚÉņä£ ņØ┤ļŻ©ļ®┤ ņé¼ņé¼ļ¼╝ļ¼╝ņØĆ ļ¬©ļæÉ ĻĘĖ ļ”¼(ńÉå)ļź╝ ņ¢╗Ļ▓ī ļÉ£ļŗż(ÕÉŠÕ┐āõ╣ŗĶē»ń¤ź, ÕŹĮµēĆĶ¼éÕż®ńÉåõ╣¤. Ķć┤ÕÉŠÕ┐āĶē»ń¤źõ╣ŗÕż®ńÉåµ¢╝õ║ŗõ║ŗńē®ńē®, Õēćõ║ŗõ║ŗńē®ńē®ńÜåÕŠŚÕģČńÉåń¤Ż)(ńÄŗķÖĮµśÄ, ńŁöķĪ¦µØ▒µ®ŗµøĖ).ŌĆØ
5) ŌĆ£ļé┤ņĀüņ×ÉĻ░üņØĆ ņŖżņŖżļĪ£ņŚÉ ļé┤ņ×¼ĒĢ£ ļ│ĖļלņĀü ņ×ÉņĢäļź╝ ņØ╝ņāüņØś ņØśņŗØĻ│╝ Ē¢ēļÅÖņØä ņŻ╝ņ×¼ĒĢśļŖö ņŻ╝ņ▓┤ļĪ£ņä£ ĒÖĢļ”ĮĒĢśļŖö Ļ▓āņØä ņØśļ»ĖĒĢ£ļŗż(ņØ┤ņŖ╣ņ▓Ā, 2016: 134).ŌĆØ
6) ņŗ¼ļ»ĖĻĄÉņ£ĪņØś ĻĄ¼ņ▓┤ņĀüņØĖ ļ░®ļ▓ĢļĪĀņØ┤ļéś ĒĢĄņŗ¼ņÜöņåīļŖö ņŗ¼ļ”¼ņĀü ĒśĢņä▒ņØä ĒåĄĒĢ£ ņ░ĮņØ┤ņä▒ņØś ļ░£ĒśäņØ┤ļØ╝ ĒĢĀ ņłś ņ׳ņ£╝ļ®░ ņØ┤ļŖö ļ¬©ļōĀ ĻĄÉņ£ĪņØś ļ░öĒāĢņØä ļæÉĻ│Ā ņ׳ļŖö ņĢäņŻ╝ ņżæņÜöĒĢ£ ĻĄ¼ņä▒ņÜöņåīļØ╝ ĒĢĀ ņłś ņ׳ļŗż. Ļ╣ĆļīĆņŚ┤(1997: 65)ņØĆ ņŗ¼ļ»ĖĻĄÉņ£ĪņØ┤ļ×Ć ņŗ¼ļ»ĖņĀü Ļ▓ĮĒŚśņØä ĒåĄĒĢśņŚ¼ ņŗ¼ļ»ĖņĀü Ļ░Ćņ╣ś(aesthetic value)ļź╝ ĒśĢņä▒ĒĢśĻĖ░ ņ£äĒĢ£ Ļ▓āņØĖļŹ░, Ļ░Ćņן ņ¦æņżæņĀüņ£╝ļĪ£ ņØ┤ļ¤¼ĒĢ£ Ļ▓ĮĒŚśņØ┤ ņØ┤ļŻ©ņ¢┤ņ¦ĆļŖö ļČäņĢ╝Ļ░Ć ņśłņłĀņØ┤ļ»ĆļĪ£ ņŗ¼ļ»ĖĻĄÉņ£ĪņØś ņżæņŗ¼ņØĆ ļ░öļĪ£ ņśłņłĀĻĄÉņ£ĪņØä ĒåĄĒĢ┤ņä£ ņØ┤ļŻ©ņ¢┤ņ¦äļŗżĻ│Ā ĒĢśņśĆļŗż. ļö░ļØ╝ņä£ ņśłņłĀņØ┤ļéś ļ»ĖņłĀņØś ņżæņŗ¼ņØĆ ļ»ĖņĀüĻ▓ĮĒŚśĻ│╝ ņ░ĮņØśĻ░Ć Ļ░Ćņן ņ¦æņżæņĀüņ£╝ļĪ£ ņØ┤ļŻ©ņ¢┤ņ¦ĆļŖö ļČäņĢ╝ņØ┤ļ»ĆļĪ£ ņśłņłĀĻĄÉņ£ĪņŚÉ ņ׳ņ¢┤ņä£ ņŗ¼ļ»ĖĻĄÉņ£ĪņØĆ ļČłĻ░ĆļČäņØś Ļ┤ĆĻ│äņØĖ Ļ▓āņØ┤ļŗż.
7) ļ│Ė ņłśņŚģņŚÉ ņĢ×ņä£ ĒĢÖņāØļōżņŚÉĻ▓ī ņŚ░ĻĄ¼ņŚÉ ļīĆĒĢ£ ļé┤ņÜ®ņØä ņĀäļŗ¼ĒĢśņśĆĻ│Ā ņŚ░ĻĄ¼ ņ×ÉļŻīņØś ĒÖ£ņÜ® Ļ░ĆļŖźņä▒ņŚÉ ļīĆĒĢ£ ļÅÖņØśļź╝ ĻĄ¼ĒĢśņśĆļŗż. ļśÉĒĢ£ Ļ░£ņØĖņØś ņĀĢļ│┤ĒśĖĒśĖļź╝ ņ£äĒĢ┤ ĒĢÖņāØņØś ņ×æĒÆłņäżļ¬ģ ņżæ ņ¦üņĀæņØĖņÜ®ņØś ļ¦łņ¦Ćļ¦ē ļ¼Ėļŗ©ņŚÉ ĒÖ®00ņ£╝ļĪ£ ļ¬ģĻĖ░ĒĢśņśĆļŗż. ņłśņŚģņØĆ HļīĆĒĢÖĻĄÉ ļ»ĖņłĀĻĄÉņ£ĪĻ│╝ 2020ļģä 1ĒĢÖĻĖ░(28ļ¬ģ), 2ĒĢÖĻĖ░(26ļ¬ģ) ņ┤Ø 54ļ¬ģņØä ļīĆņāüņ£╝ļĪ£ 3ņŻ╝Ļ░äņØś ņłśņŚģņ£╝ļĪ£ ņ¦äĒ¢ēĒĢśņśĆļŗż. ĒĢ£ ņŻ╝ņŚÉ 3ņŗ£Ļ░äņØś ņłśņŚģ(ņ┤Ø 9ņŗ£Ļ░ä) ņżæ 2ņŗ£Ļ░äņØĆ ņÖĢņ¢æļ¬ģņØś ņŗ¼ĒĢÖņé¼ņāüĻ│╝ ņŗ¼ņØś ļ»ĖĒĢÖņŚÉ ļīĆĒĢ£ ņØ┤ļĪĀņłśņŚģņ£╝ļĪ£ ņ¦äĒ¢ēĒĢśņśĆĻ│Ā, 5ņŗ£Ļ░äņØĆ ņŗżĻĖ░ņłśņŚģņ£╝ļĪ£ ņ¦äĒ¢ēĒĢśņśĆļŗż. ĻĘĖļ”¼Ļ│Ā 2ņŗ£Ļ░äņØĆ Ļ░üņ×ÉņØś ņ×æĒÆłņØä ļ░£Ēæ£ĒĢśļ®░ Ļ░ÉņāüĻ│╝ ĒåĀļĪĀ(ĒśĖĒÅēĻ│╝ ļ╣äĒÅē)ņØä ĒåĄĒĢśņŚ¼ ņä£ļĪ£ ņåīĒåĄĒĢśļŖö ņŗ£Ļ░äņØä Ļ░ĆņĪīļŗż. ļśÉĒĢ£ ļ░£Ēæ£ņ×ÉĻ░Ć Ēæ£ĒśäņØśļÅäņŚÉ ļö░ļØ╝ ļ¬®Ēæ£ņŚÉ ļÅäļŗ¼ĒĢśņśĆļŖöņ¦Ć ĒÖöņŚ░Ļ▓ĮņśüņØ┤ļéś ņĪ░ĒśĢļ░®ļ▓ĢņŚÉ ļīĆĒĢ£ ņĢäņē¼ņÜ┤ ļČĆļČäņØä Ēö╝ļō£ļ░▒ ĒĢśņśĆļŗż.
8) ŌĆ£Ķü¢õ║║µĢÄõ║║õĖŗµś»ń«ćµØ¤Õé│ÕüÜõĖĆĶł¼ ÕŬՔéńŗéĶĆģõŠ┐ÕŠ×ńŗéĶÖĢµłÉÕ░▒õ╗¢ńŗĘĶĆģõŠ┐ÕŠ×ńŗĘĶÖĢµłÉÕ░▒õ╗¢õ║║õ╣ŗµēŹµ░ŻÕ”éõĮĢÕÉīÕŠŚŌĆØ(ńÄŗķÖĮµśÄ, ÕŹĘõĖŗ)
9) ņäØļÅäļŖö ņ▓Łņ┤ł(µśÄµ£½µĘĖÕłØ)ņØś Ēś╝ļ×Ć ņåŹņŚÉņä£ ļ¬ģ ņÖĢņĪ░ņØś ņóģņŗżņØ┤ņŚłļŹś ņŻ╝ĒśĢĻ░Ć(µ£▒õ║©Õśē)ņØś ņןņ×ÉļĪ£ Ēā£ņ¢┤ļéś Ļ░ÖņØĆ ņóģņŗżņØ┤ļ®┤ņä£ ĒÖ®ņĀ£ļź╝ ņ░Ėņ╣ŁĒ¢łļŹś ļŗ╣ņÖĢ ņŻ╝ņ£©Ļ▒┤ņØś ĻĄ░ļīĆņŚÉ ņØśĒĢ┤ ņ£Āļ”░ļŗ╣ĒĢśĻ│Ā ļÅäļźÖļŗ╣Ē¢łļŗż. ņĀä Ļ░ĆņĪ▒ņØ┤ ļ¬░ņé┤ļÉśļŖö ņ░ĖĒś╣ĒĢ£ ĒśäņןņØś ļÆżļĪ£ ņäØļÅäļŖö ļ¼┤ņ░ĮņØś ĒĢ£ ņĀłņŚÉ ļ¦ĪĻ▓©ņĀĖ ņŖ╣ļĀżļĪ£ ņ×ÉļØ╝ļ®┤ņä£ ļé┤ļ®┤ņØś ļČäļģĖņÖĆ ļ╣äņĢĀ ļō▒ņØä ĒÖöĻ▓Įņ£╝ļĪ£ Ēæ£ņČ£ĒĢ£ļŗż. ĻĘĖļŖö ŌĆ£ļé©ļČüņóģ(ÕŹŚÕīŚÕ«Ś)ņØś ņóģĒīī(Õ«Śµ┤Š)ļéś ņé¼ņÖĢ(ÕøøńÄŗ) ļō▒ņØś ņĀĢĒåĄĒīī(µŁŻńĄ▒µ┤Š)ļź╝ ļČĆņĀĢĒĢśĻ│Ā ļīĆļÅäļ¼┤ļ¼Ė(Õż¦ķüōńäĪķ¢Ć)ņØ┤ļØ╝ļŖö ņ×ÉņĢäņØś Ļ░£ņä▒ņŚÉ ļīĆĒĢ£ ņ×ÉĻ░ü(Ķć¬Ķ”║)ņØä ļČäļ¬ģĒ׳ ĒĢśļŖö ĒĢ£ĒÄĖ, ĻĘĖļ”╝ņØ┤ļ×Ć ņØ╝ĒÜŹ(õĖĆÕŖā)ņØś ĻĘ╝ļ│ĖņøÉļ”¼ņŚÉ ļö░ļØ╝ ņ×ÉņŚ░Ļ│╝ ņ×ÉņĢäĻ░Ć ĒĢäļ¼ĄņØ╝ņ▓┤(ńŁåÕó©õĖĆķ½ö)ņØś ņØĖņś©Ēś╝ļÅł(ńĄ¬ńĖĢµĘʵ▓ī)ņØś ņāüĒā£ļĪ£ Ēæ£ĒśäļÉśļŖö Ļ▓āņØ┤ļØ╝ļŖö ņ▓Āļ”¼ņĀü(Õō▓ńÉåńÜä)ņØĖ ĒÜīĒÖöņØ┤ļģÉņØä ņ×ģļĪĀĒĢ©ņ£╝ļĪ£ņŹ© ņ▓Łņ┤łņØś Ļ░£ņä▒ņŻ╝ņØś(µĆ¬) ļ»ĖĒĢÖņØä ņØ┤ļĪĀņĀüņ£╝ļĪ£ ņĀĢļ”ĮĒĢśņśĆļŗż(ĶæøĶĘ», Õ¦£Õ»¼µżŹ, 1989: 420).ŌĆØ
10) ļ¬ģņÖĢņŗżņØś ĒøäņśłņśĆļŹś ĒīöļīĆņé░ņØĖņØĆ ļ¬ģņØ┤ ļ¼┤ļäłņ¦ä Ēøä ņŖ╣ļĀżĻ░Ć ļÉśņŚłĻ│Ā, ņĀĢņŗĀņĀüņ£╝ļĪ£ ļ░®ĒÖ®ĒĢśļ®░ ĻĘĖļ”╝ņŚÉ ņĀĆĒĢŁņĀĢņŗĀĻ│╝ ļ╣äļČäĻ░ĢĻ░£(µé▓µåżµģʵģ©)Ļ░Ć ņ¢╝ļŻ®ņ¦ä ļīĆļŗ┤ĒĢśĻ│Ā ņ×Éņ£ĀļĪ£ņÜ┤ ĒÆŹĻ▓®ņ£╝ļĪ£ Ēæ£ņČ£ĒĢśņśĆļŗż(ļ░ĢņØĆĒÖö, 2001).
11) Ļ╣ĆļåŹņØĆ ņ×Éņ£ĀļČäļ░®ĒĢ£ ņ¢æņŻ╝ĒīöĻ┤┤(µÅÜÕĘ×Õģ½µĆ¬)ņżæ ĒĢ£ ņé¼ļ×īņØ┤ļŗż. ņ¢æņŻ╝ĒīöĻ┤┤ļŖö Ļ▓ĮņĀ£ņØś ņżæņŗ¼ņ¦ĆņØ┤ņ×É ļīĆņÜ┤ĒĢśņØś ņÜöņČ®ņ¦ĆņśĆļŹś ņ¢æņŻ╝ņ¦Ćļ░®ņŚÉņä£ ņāłļĪ£ņÜ┤ ĒÖöĒÆŹņØ┤ ĒśĢņä▒ļÉśņŚłļŖöļŹ░ ņØ┤ļōżņØä ļīĆĒæ£ĒĢśļŖö ĒÖöĻ░ĆļōżņØä ņØ╝ņ╗¼ņ¢┤ ņ¢æņŻ╝ĒīöĻ┤┤ļØ╝ ņ¦Ćņ╣ŁĒĢśņśĆļŗż. ĒīöĻ┤┤ļŖö ĻĄ¼ņ▓┤ņĀüņ£╝ļĪ£ ļ¬ģĒÖĢĒĢśņ¦Ć ņĢŖņ£╝ļéś ĻĘĖ ņżæ ŌĆ£ņĀĢņäŁ(ķäŁńć« ), ņØ┤ņäĀ(µØÄķ▒ō), ĻĖłļåŹ(ķćæĶŠ▓), ļéśļ╣Ö(ńŠģĶüś), ņØ┤ļ░®ņØæ(µØĵ¢╣Ķå║), ĒÖ®ņŗĀ(ķ╗āµä╝), Ļ│Āņāü(ķ½śń┐ö), ņÖĢņé¼ņŗĀ(µ▒¬ÕŻ½µä╝)ŌĆØņØ┤ ņ׳ļŗż. ĻĘĖļ¤¼ļéś Ļ╝Ł ņØ┤ļōż(8ļ¬ģ)ļ¦īņØä ņ¦Ćņ╣ŁĒĢśļŖö Ļ▓āņØ┤ ņĢäļŗłļØ╝ ņ¢æņŻ╝ņŚÉņä£ ĒÖ£ļÅÖĒĢ£ Ļ░£ņä▒Ēīī ĒÖöĻ░ĆļōżņØ┤ ņØ┤ņŚÉ ĒżĒĢ©ļÉ£ļŗż. ņØ┤ļōżņØś ĒÖöĒÆŹņØĆ ņżæĻĄŁļ¼ĖņØĖĒÖö(Õ»½µäÅńĢĄ)ņØś ņĀäĒśĢņĀüņØĖ ĒŖ╣ņ¦ĢņØä ļ│┤ņŚ¼ņŻ╝ļ®░, ņ▓ŁļīĆ ļ¦ÉņŚÉņä£ ĻĘ╝ĒÖöņŚÉ ņØ┤ļź┤ĻĖ░Ļ╣īņ¦Ć ļ¦ÄņØĆ ĒÖöĻ░ĆļōżņŚÉĻ▓ī ņ¦ĆļīĆĒĢ£ ņśüĒ¢źļĀźņØä Ē¢ēņé¼ĒĢ£ļŗż(ńÄŗĶĆĆÕ║Ł, ÕÉ│µ░ĖõĖē, 2007: 197).
ņ░ĖĻ│Āļ¼ĖĒŚī
- TOOLS
-
METRICS

-
- 0 Crossref
- 1,383 View
- 19 Download
- Related articles in Korean J General Edu
-
A Study on Communication and Writing in the New Media Era2015 March;9(1)